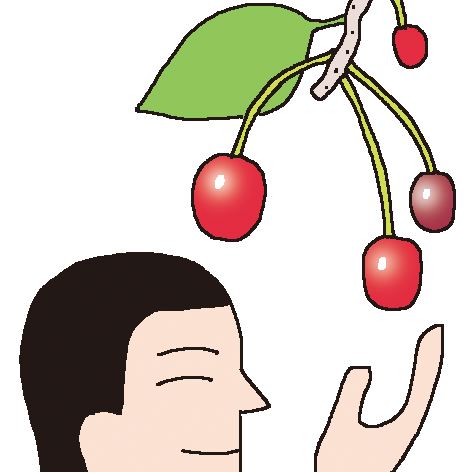
지난 주말을 화천 산골짜기에서 보냈다. 초행길인데도 산으로 에워싸인 풍경이 고향과 닮아 낯설지 않았다. 물소리와 새소리에 취한 채 맑고 시원한 공기를 잔뜩 들이켰다. 버찌와 오디를 실컷 따먹은 기쁨도 컸다. 까맣게 익은 산뽕 오디는 달짝지근했고, 한 움큼씩 우물거린 버찌는 잠깐 쌉쌀하다가 이내 입안에 달콤한 맛이 번졌다. 버찌는 실로 오랜만이었다. 서울로 전학해 새로 사귄 친구들과 남산에서 버찌를 따던 게 45년 전이다. 그 뒤로는 잔류 농약이 겁나서 입에 대지 않았다.
▦ 약을 친 적이 없다는 벚나무에서 안심하고 버찌를 따먹자니, 체리 생각이 났다. 버찌는 ‘벚나무 열매’를 가리키는 말로 한자어 앵실(櫻實)이나 영어의 ‘체리(Cherry)’와 정확히 대응한다. 종류는 달라도 어차피 벚나무의 열매이긴 마찬가지인데도, 관상용 벚나무의 자잘한 버찌와 구분해 과일용 버찌는 따로 체리라고 부른다. 과일로서의 효용을 잣대로, 나은 것은 영어로 부르려는 감각이 수상하다. 굳이 가르려면, 왕벚나무를 비롯한 관상용 벚나무 열매는 버찌, 과일용 ‘양벚나무’ 열매는‘양버찌’가 낫겠다.
▦ 인기 절정의 과일인 체리는 따기 좋게 나무 키를 줄이고, 열매의 크기와 당도를 끌어올리려는 부단한 품종개량의 결과다. 개화기에 멀리서 보면 배나무로 착각하기 쉽다. 키가 작고 옆으로 넓게 퍼진 데다 하얀 벚꽃이 파란 잎새와 함께 핀다. 은근한 분홍빛이 감도는 꽃이 먼저 화들짝 피었다가 한꺼번에 질 무렵에야 잎이 싹트는 관상용 벚나무와는 꽤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 관상용 벚나무 또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축으로 숱한 개량이 이뤄졌다.
▦ 한동안 미국산 독무대였던 국내 체리 시장에서 국내산 체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워낙 적은 양이지만 대구와 충북 음성, 경기 화성 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굵기는 미국산만 못해도 맛이 뛰어난 일본산 ‘사토니시키(佐藤錦ㆍ좌등금)’를 으뜸으로 치는 재배농가가 많다. 일본의 주산지인 야마가타(山形)현 전체 체리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품종이다. 그러고 보면 ‘양버찌’도 어색하다. 체리는 그냥 버찌라고 하고, 관상용 벚나무 열매는 ‘개버찌’라고 부르는 게 나을까.
황영식 논설실장 yshw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