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처럼 복숭아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은 요즘이 제일 일손이 딸릴 때다. 열매를 솎고 봉지를 씌우는 작업은 꽤나 세심한 일인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식구들만으로는 어림이 없어서 품을 사는데 내가 사는 곳은 과수원이 많은 지역이고 어느 과수원이든 같은 시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사람 얻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마을은 아직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요즘 웬만한 농촌은 그들의 손이 아니면 농사가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우리 마을도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르지 않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품삯을 받고 일을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다. 어렵사리 이웃 마을까지 청을 넣어 여섯 명의 일손을 구했는데 한 사람만 빼고 모두 일흔이 훌쩍 넘은 할머니들이다. 따가운 햇살 아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중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은 대개 농촌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십상이다. 나는 해마다 이 분들과 일을 하며 귀동냥으로 듣는 이야기에 늘 솔깃하다.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서라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데 서로서로 대강은 알고 있을 내력들을 되풀이한다. 일종의 민중구술이라고도 하겠는데 연세가 있어서 살아온 내력이 굽이굽이 아흔아홉 구비다. 소설가라는 직업은 언제나 남들이 살아온 이야기에 귀를 쫑긋거려야 하므로 나는 적당히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이야기에 장단을 맞춘다.
올해도 소설로 옮겨 볼만한 거리를 몇 개 건졌다. 전쟁 때 아버지를 보도연맹 학살사건으로 잃은 어느 할머니 이야기는 개인적인 관심사인 근현대사의 생생한 증언이었고 난봉꾼이던 남편 이야기를 거침없이 들려준 할머니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겠다. 끊이지 않고 시앗을 두었다던 난봉꾼 남편은 이미 오래 전에 세상을 떴지만 그이는 그 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그 때는 증말 바드득 이를 갈고 죽어버리고 싶더라니께.”라고 했다. 듣자마자 나는 아연한 기분이 되었다. 그 자연스러운 구어는 내가 사랑해 마지않는 어느 시 구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바로 소월의 ‘원앙침’이라는 시의 첫 구절이 아닌가 말이다.
한글조차 읽지 못한다는 그이가 소월의 시를 읽었을 리는 만무하니까 결국 소월은 민중들이 관용어로 쓰던 말을 시어로 옮겼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부부가 나란히 베는 베개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는 시의 첫 구절은 대표적인 반어적 표현이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바드득 이를 갈고 죽겠다는 것은 결국 독하게 살겠다는 뜻인 것이다. 시뿐 아니라 구어로 들려준 노인의 삶 역시 난봉꾼보다 오래 살아남아서 그의 흉을 보지만 그 어조에는 세상 떠난 남편에 대한 일말의 그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촌부의 넋두리에서 오랜만에 소월의 시를 떠올린 것은 좋은 일이었는데 나의 연상은 엉뚱한 데로 나아간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이미지 연상이라고 하겠는데 우리의 대통령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이다. 자신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행태가 ‘바드득 이를 갈고’와 연결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할 때나 메르스 사태 국면에서 지자체 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발, 심지어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당의 지도부를 대하는 태도 등등을 보며 나는 그보다 더 적확한 문학적 표현을 찾지 못하겠다.
한이 맺히면 복수의 감정이 생기고 소월의 시처럼 야멸친 표현도 나오는 것인데 이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의 민족 운운은 이미 낡았고 어디에도 들이댈 만한 자가 아니다. 다만 요즘 그런 맺힌 마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취업 절벽으로 내몰린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암담하기조차 하다. 젊었을 때의 고생 정도가 아닌 ‘바드득 이를 가는’ 한이 될까 두렵다. 때로 아름다운 소월의 시 한 편을 읽는 여유쯤은 있어야 살만한 세상이 아닐까.
최용탁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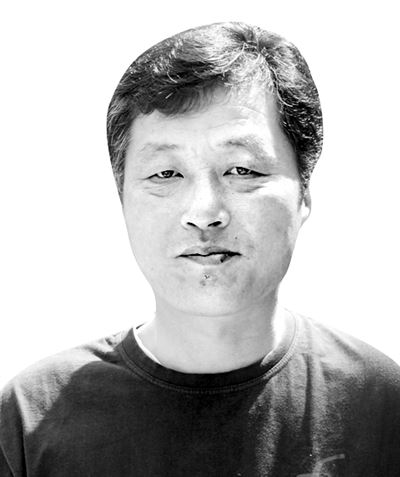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