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부는 모래바람’
일본 남성이 조선 여인 구출
청을 조선 삼키려는 오랑캐로,
일본은 조선 구원할 마법사로
‘조선’
망국민 애처롭게 바라보는 '나'
일본 제국 위상에는 자긍심
조선 풍습 언어 등 생생한 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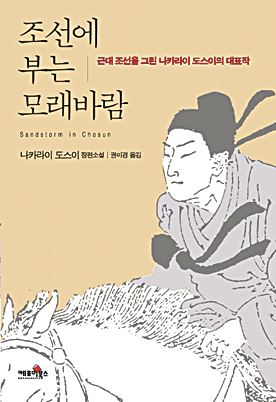

근대 조선을 일본인의 시각으로 그린 소설 ‘조선에 부는 모래바람’(케포이북스)과 ‘조선’(소명출판)이 동시에 출간됐다. 당대에 나온 대표적 조선 관련 소설들로,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과 조선인의 모습을 가늠하는 동시에 일제의 조선 침략 당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나카라이 도스이의 ‘조선에 부는 모래바람’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1880년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배경으로 한다. 1891년 10월 1일부터 1892년 4월 4일까지 ‘도쿄아사히신문’에 연재했을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어 1895년 속편이 연재되기도 했다.
소설의 내용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구칠 이야기다. 용감한 일본인 남성이 조선 여인을 구출하는 것으로 시작해 종국에는 청국, 노국 등 열강의 각축전 속에서 일본이 조선을 구한다는 단순한 줄거리로, 저자는 미개한 조선인이 일본을 왜놈으로 인식해 마음을 닫고 있지만 조선을 구원(근대화)해 줄 이는 결국 일본뿐이라는 주장을 틈틈이 설파한다. 청국은 조선을 삼키려는 더러운 오랑캐의 나라, 조선은 전쟁이 나면 마법사를 부르면 된다고 말하는 한심한 나라로 그려진다. ‘조선에 부는 모래바람’이 당시 일본에서 끌었던 인기를 생각하면 일본의 침략사관에 이 소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8세부터 부산에서 생활한 작가는 조선 문화에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회 소설 끝에 조선의 정치?지리?역사?풍습에 대한 설명을 붙여 일본인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일례로 임진왜란을 다룬 ‘임진록’을 언급하며 “책에서는 일본인을 가리켜 왜적이라 칭한다. 일본인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 왜놈이라는 욕설을 자주 들을 것이다”라고 쓴다. 소설을 번역한 권미경 일문학 박사는 “일본의 제국주의 정신을 그대로 독자에게 고취시킨 소설의 좋은 예”라며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해 문학의 폭력성, 권력성을 재고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다카하마 교시의 ‘조선’은 문학이라고 부를만한 요소들이 좀 더 눈에 띈다. 한일합방 후 식민지 조선을 그린 첫 일본 소설로, 1911년 조선 유람을 다녀온 하이쿠 시인 다카하마 교시가 7월부터 ‘오사카마이니치신문’과 ‘도쿄니치니치신문’에 동시 연재한 것이다.
작가는 분신으로 보이는 비주류 문학가 ‘나’의 시선을 통해 망국의 풍경을 씁쓸한 심경으로 관조한다. ‘나’가 만난 조선인 기생 소담은 밤마다 요릿집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춤과 노래를 팔지만 그의 앨범에는 안중근 의사의 흐릿한 사진이 꽂혀 있다. 합방 전 ‘배일당(拜日黨)’ 지사였던 홍원선이라는 자는 고문으로 이빨이 몽땅 뽑힌 채 일본인들의 음담패설을 기생에게 통역해주는 역할을 한다. 처음 부산에 도착해 조선인 소년에게 짐삯을 덜 주려는 일본인을 본 ‘나’는 “내 동포의 이런 경멸할 만한 행동에 나는 내 일처럼 부끄러웠다”고 말한다.
그러나 망국민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나’도 조선반도를 발판 삼아 북으로 뻗어나가는 일본 제국의 위상에는 자긍심을 느낀다. 소설 속 일본인들이 신천지 만주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일제의 팽창정책과 구도상 일치한다.
교시는 소설 앞부분에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대장으로부터 책에 대한 감사 표시를 받은 사실을 쓰며 “병합 당시 조선에 있었던 내선인의 상태와 국위가 북천하는 기운을 그리고, 또한 조선의 대륙적 풍광을 그려보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점이, 어쩌면 식민 정책의 면에서 유효한 일서(一書)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적었다.
지배국 시민의 입장이지만 일관되게 중립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조선’은 최소한 기록 문학으로서의 가치라도 확보한다. 실제로 책에는 당시 조선의 풍습과 건물, 풍경, 도구, 언어가 풍부하게 묘사돼 있다. 작품을 번역한 김영식 작가는 ‘조선’을 여타의 “저열한 식민지 여행기”들과 구분하며 “풍경과 등장인물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함께 저자의 철학을 담은 작품으로, 편협하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은 흥미로운 소설”이라고 평가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