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국민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다음과 같은 ‘어록’을 스페인어 원문으로 인용했다. “추억이 있는 이에게 회상은 쉬운 것이며,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Recordar es facil para el que tiene memoria, olvidar es dificil para quien tiene corazon)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한 파병국인 콜롬비아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선택한 문장이었다. 국내 언론에는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 망각은 어렵다”는 번역으로 소개되었다. 대한민국의 수반으로서 상대편 국가의 원수에게 표할 수 있는 당연한 예의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박 대통령의 이 인용 헌사는 빠르게 잊힐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망각되기 전에 이 문장과 안팎으로 연관된 두 가지 문맥을 환기하고 싶다.
하나의 맥락은 우리 바깥에 있다. 그것은 19세기에만 8차례의 내전을 치르고 약 20만명이 죽어간 콜롬비아 민중들의 처참한 역사다. 그런 역사의 추억과 기억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성은 ‘가르시아 마르케스’다)의 대표작 ‘백년의 고독’(1967)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1928년 12월 6일 산타 마르타 근교 시에나가 마을에서 대대적으로 자행된 학살극이 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한 ‘기억의 투쟁’이야말로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평생 동안 문학적 화두로 삼은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근대사에서는 제주 4ㆍ3을 떠올릴 수도 있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그 문장이 형제가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한국전쟁과 외국군대의 파병이라는 맥락에 흡수될 때 의미의 기묘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그토록 지속적으로 ‘기억의 투쟁’을 작품으로 다룬 것은 동족상잔의 한국전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조국의 비극적 내전을 잊어서는 끔찍한 폭력이 반복되리라는 작가적 신념 때문이었다. 실제로 그는 공산주의계 자유당원 신분으로 1954년 12월에 3편의 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것은 귀국한 자국 참전용사들의 실태에 관한 글로, 당시 고메스 군부독재에 대한 고발 성격이 강한 기고문이었다.

다른 하나의 맥락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은 먼저 간 아이들을 ‘가슴’에조차 묻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이들이 보냈을 통한과 통곡의 한 해를 보통 시민들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피 말리는 기다림 끝에 주검으로 돌아온 피붙이 앞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송구스럽게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 초현실적인 상황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엄연한 현실이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가슴이 있는 이에게 망각은 어렵다.” 유가족과 시민의 분향마저 봉쇄한 채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낯선 땅 콜롬비아에서 대한민국 수반이 인용한 이 문장은 거의 부조리 드라마의 난해한 대사처럼 읽힌다. 너무도 난해해서 코믹한 느낌까지 들 정도다.
애도가 불가능하기에 망각도 불가능한, 정상적인 ‘가슴’을 가지고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마저 버거워진 세월호의 유가족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참경(慘景)에 슬픔과 공분을 느끼는 수많은 시민에게 박 대통령의 이 인용 대사는 차라리 처음 접하는 외국어처럼 들릴 것이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날아온 대통령의 이 기이한 말이 광화문 한복판에 세워진 저 차벽을 가리키는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다.
유희석 전남대 영어교육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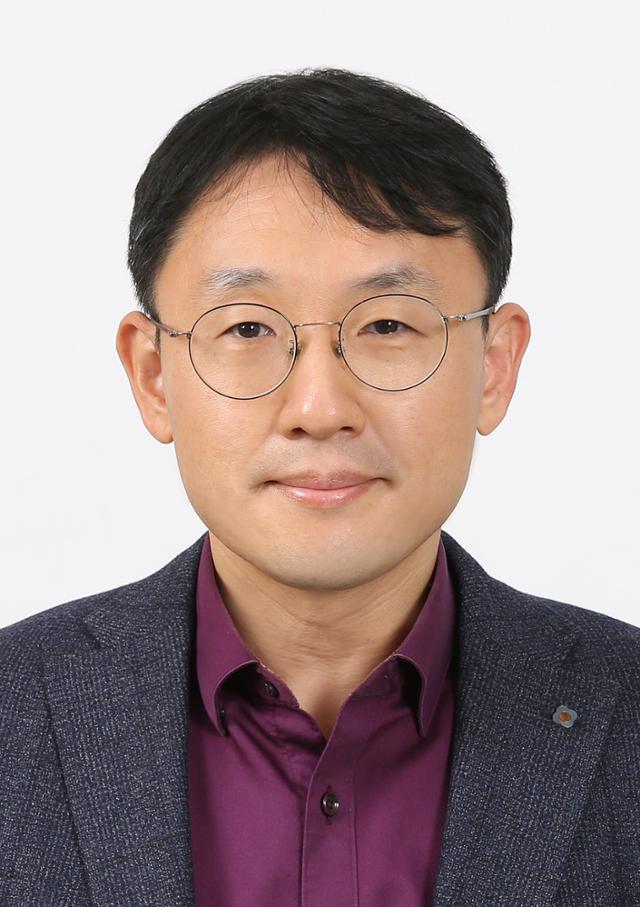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