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람 9년 만에 두번째 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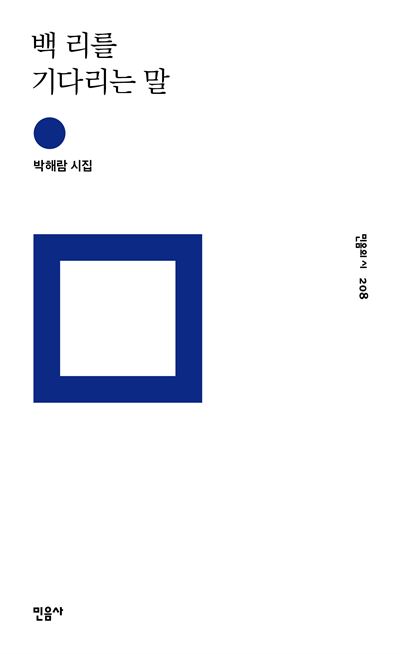
“나무의 자살은 / 그 목관(木管) 속에 미세한 길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고 / 음은 미세한 고통이고 / 날개에 분가루가 있는 것들에게는 소리가 없듯 / 자살한 나무로 만든 악기에는 / 죽은 것들의 후렴을 잡아 둘 수 있는 목(木)의 관(棺)이 있다” (‘자살하는 악기’ 중)
나무는 고통에 미쳐 자살했을 것이다. 목관(木管)이 크고 깊어질수록 스스로 거대한 목관(木棺)이 되는 환각이 자주 일어났을 것이다. 자살한 나무로 만든 악기에서는 그래서 죽음의 소리가 흘러나온다. 망자를 불러 일으키고 산 자를 관으로 끌어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박해람 시인의 시집 ‘백 리를 기다리는 말’(민음사)이 출간됐다. 2006년 ‘낡은 침대의 배후가 되어 가는 사내’ 이후 9년 만의 시집이다. 첫 시집도 8년 만에 나온 것을 보면 여간 느린 속도가 아니다. 긴 시간 동안 시인은 알 수 없는 비애로 내내 앓았나 보다. 만개하는 봄과 자연을 노래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시집은 그 찬란함의 반대편, 짙게 깔린 죽음과 눈물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모든 눈물은 소용돌이를 거쳐 나온다. / 너무 추운 철에 핀 슬픔 / 다 마르면 뚝, 하고 떨어지는 / 가장 먼저 흘리는 / 꽃이라는 봄날의 눈물” (‘봄날, 꽃이라는 눈물’ 중)
시인은 죽음을 외면해 삶의 찬란함을 부풀리는 대신 빛나는 것들 아래 굳이 죽음의 검은 종이를 깔고 보잘것없는 광량(光量)의 실체 앞에 울기를 택한다. 생에 심취한 이들에겐 맥 빠지는 소리이겠으나 죽음에 한 발이라도 디뎌본 적 있는 이에겐 자살한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처럼 뿌리칠 수 없는 매혹이다.
피안에 뿌리 박고 그려낸 봄의 풍경은 이채롭다. 꽃은 나무의 내부에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밖을 내다보고, 나무의 옹이는 눈 뜨고 죽은 시체의 얼굴 같아 말 걸 엄두가 안 난다. 겨우내 죽음에 시달리던 벚꽃나무는 봄을 맞아 벚꽃을 찢어 날리지만 거기 적힌 주소는 수취불명이다. “인간과 자연이 기이하게 한 몸이 되는 이종교배의 현장”이라는 이영광 시인의 말처럼, 주체와 객체가 뒤섞이고 관찰자와 피관찰자가 체위를 바꾸는 시인의 세계는 현란하다 못해 관능적이다.
시인과 함께 고통에 거나하게 취해 있다 보면 문득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비애를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라 쳐도, 이유 없는 눈물엔 부끄러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궁금하기는 시인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벽의 저쪽은 얼마나 밝은 곳이기에, / 매번 그림자를 거슬러 주는지 / 늘 바람이 붙어 있는 저 나뭇가지는 누가 그리는 것이며 / 그림자 없는 생은 왜 없는지 / 언제부터 나는 어둠의 계원(係員)이었는지 / 그 많던 색은 다 어디로 갔는지”
문득 사라진 색의 행방을 찾아 일어난 시인은 얼마 안 있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여기에도 색이 있다. 곱게 핀 꽃의 형형색색 대신 그림자로 핀 꽃의 죽음 같은 흑색이다. 하물며 수많은 생을 버리고 얻어낸 죽음이라면.
“넘어져서 울던 어둠이 무릎에 환한 피를 흘리고 있다. / 내 꽃은 다만 수많은 색을 버리고 나서야 저처럼 한 송이 어둠으로 흔들린다.”(‘괴로운 어둠’ 중)
황수현기자 so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