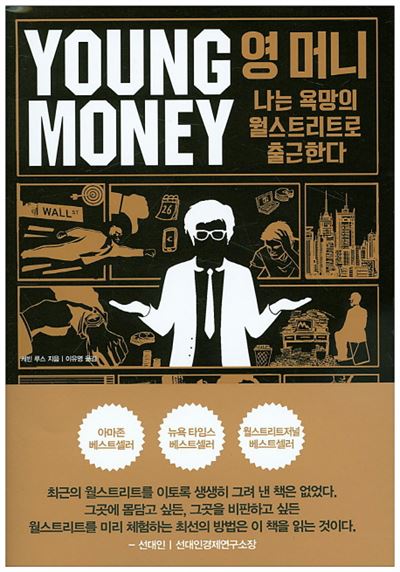
저자가 대학 졸업 뒤 한 친구의 집 저녁파티에 초대를 받는다. 자리를 함께 한 지인이 막 금융업계에 취직했다고 말을 꺼내니 초대한 부모가 “무슨 회사니?”라고 묻는다. “그냥 시내에 있어요”라며 답을 피하려던 지인은 결국 얼굴이 빨개진 채 회사 이름을 내뱉는다. “저기 골드…만…삭스요.” 대화의 주제는 곧 바뀌었으나 지인은 파티가 끝날 때까지 어색한 표정을 지우지 못한다.
월가는 대학생들에게 선망의 지역이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부와 성공의 상징이었다. 2008년부터 원망의 대상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됐고 탐욕의 도가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분노는 ‘월가 점령 운동’으로 표출됐다. 저자의 지인이 막 입사한 회사의 이름을 쉬 밝히지 못하고 끝내 불편한 마음으로 파티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금융위기로 세계적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사라졌다. 명문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상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에 팔렸다. 월가로서는 치욕의 나날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월가는 과연 바뀌었는가?
‘영 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1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은 그대로이다. 어느 금융인은 출근길에 차에 치이면 몇일 동안 회사를 빠질 수 있을까 공상에 빠진다고도 털어놓았다. 돈을 향한 부나방 같은 행태도 크게 변치 않았다. 중견사원이 신입사원에게 해주는 조언이 이렇다. “여긴 세상을 구하는 데가 아니야.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곳이거든.” 남성 호르몬 냄새가 물씬 풍기는 조직문화도 바뀌지 않았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미국 금융업계 여성 종사자 수는 2.6% 줄어든 반면 남성 종사자 수는 9.6% 증가한 수치가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책은 금융위기 직후 입사한 8명의 신입 사원들의 사연을 통해 월가의 참 모습을 전한다. 8명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출신과 인종과 성별이 다르고 다니는 회사도 다르다. 다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렵게 취직해 돈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과는 닮았다. 8명의 월가에서의 일상이 모자이크를 이루며 월가의 실체를 가늠케 한다.
몇 가지 변화는 있었다. 예전처럼 보너스가 많지도 않고 ‘스트리퍼의 엉덩이에 코카인을 길게 뿌려 놓고 흡입하는 보스’도 자취를 감췄다. 한 신입 애널리스트는 술집에서 저자에게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다. “작년에 1년차 보너스로 세후 대략 2만달러를 받았거든. 이건 정말 모욕적인 금액이라고. 난 정말 1년 내내 똥줄 빠지게 일했는데 고작 2만달러라니, 이게 말이 돼?”
저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기고해온 프리랜서 작가로 3년 동안 수십 명의 금융인을 인터뷰해 월가를 심층 취재했다. 신입사원들이 즐겨 찾는 술집을 찾아 고뇌를 엿들었고, 그들이 다니는 학원에 등록해 업무 행태도 파악했다. “99%의 분노”를 표출했던 점령 운동 당시 “우리는 1%”라는 글을 창문에 내붙였던 월가, 이곳을 향해 달려온 이들의 미생 인생이 그려진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