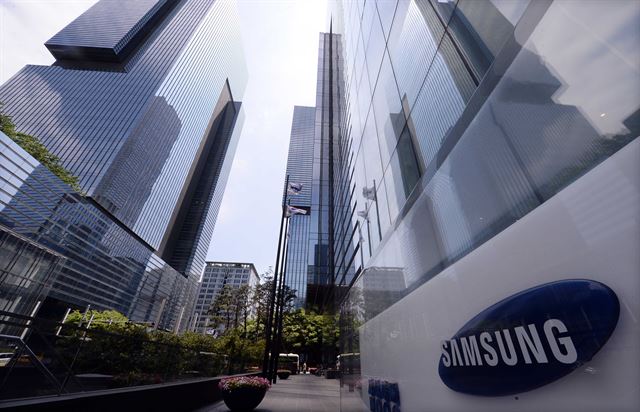
몇 년 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국제영화제를 찾았을 때다. 현지 유명 문화주간지의 발행인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그는 삼성을 예찬했다. “이렇게 뛰어난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의 정체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기술력에 대한 상찬은 한국영화에 대한 경외로 이어졌다. 평소 품고 있던 질문인 듯 그는 다짜고짜 물었다. “왜 삼성은 영화를 안 만드나? 이런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가 우수한 한국영화 인력과 만나면 할리우드에 대적할 영화를 만들 수 있을텐데…” 1997년 IMF 구제금융과 정부 압박에 의한 대기업 구조조정 등 복잡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능숙하게 전할 수는 없어 “영화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간단히 답했다. 의외라는 듯 그의 눈동자는 커졌다. ‘삼성이 실패를?’ ‘그렇다고 재도전은 안 하나?’라는 의문이 담긴 듯했다.
얼마 전 취재를 하다 20년 전 신문을 뒤적였다. 삼성영상사업단이 출범했고 제일제당이 미국 SKG(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애니메이션 제작사 제프리 카첸버그, 음반프로듀서 데이비드 게펜이 공동 설립한 콘텐츠 회사)와 손잡고 영상사업에 뛰어든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영상산업이 미래 먹거리’라는 단언이 상식으로 통하던 시절이었다. 대우와 선경(SK)도 VCR과 비디오테이프를 팔기 위해 의도치 않게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던 때다.
대기업이 앞다투어 영화에 투자할 만도 했다. 일본 전자회사 소니가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 콜럼비아픽처스를, 마쓰시타가 유니버설픽처스를 각각 인수해 화제를 뿌리던 시절이었다. 삼성전자도 한때 할리우드 영화사 오라이온픽처스에 눈독을 들이기도 했다. 전자기기와 콘텐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삼성전자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삼성영상사업단의 행보에 눈길이 모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삼성영상사업단은 환란 뒤 해체됐다. 마지막으로 투자한 작품은 아이러니하게도 강제규 감독의 ‘쉬리’였다. 당시 한국영화 최고 흥행기록을 새로 쓴 대작이었다. 돈을 벌 가능성을 보일 때쯤 사업을 접은 셈이다.
애플이 신상품 애플워치를 발표했다. 지난 10일 열린 상품 소개 행사에서 ‘똑똑한 시계’보다 애플과 미국 유료영화전문채널HBO의 제휴에 눈길이 더 갔다. 애플기기 사용자는 한달에 14.99달러만 내면 HBO의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가 정보통신기기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였다. 애플에 눌리고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에 받치는 삼성전자가 더 위기에 처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시장 공략은 당분간 어려움을 겪겠다고 직감했다.
만약 삼성영상사업단이 존속해 영화사업 등 콘텐츠 개발을 계속하고 할리우드까지 진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삼성이 영화판까지 쥐락펴락한다는 거센 비판이 있을 만도 하나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을까? 한류 콘텐츠를 장착한 스마트폰이라면 적어도 동아시아 시장에서 판로를 더 넓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릇이 제아무리 예쁘고 쓰임새가 많아도 담을 음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풍성한 음식도 제대로 된 그릇이 있어야 참 맛을 즐길 수 있다. 소니의 총수 오가 노리오는 콜럼비아픽처스를 인수하던 시절 이렇게 말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콘텐츠)는 자동차의 두 바퀴나 마찬가지다”라고. 노리오의 단언과 달리 소니는 애플이 주도한 ‘스마트 혁명’을 따라잡지 못하고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소비 변화를 읽지 못한 하드웨어 탓에 소니픽처스의 영화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젠 소프트웨어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침체에 빠지는 정보통신기기 회사가 나올지 모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르기 마련이다.
라제기 엔터테인먼트팀장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