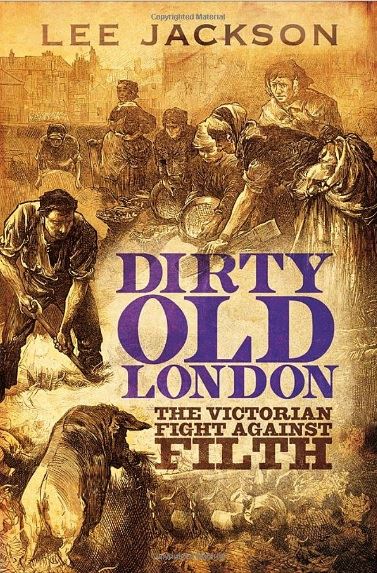
18세기 중엽 시작된 산업혁명의 중심지 영국 런던은 19세기 초 100만명에 근접했던 인구가 1851년 268만명, 1901년 658만명으로 급팽창했다.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가 “세계가 정신이 번쩍 들만큼 놀랍다”고 했을 정도였다.
그 이면엔 급격한 산업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한 각종 오염이 큰 문제였다. 오수 저장소는 흘러 넘치고, 공동묘지는 코를 찌르는 시신들로 터져나갔다. 거리는 유독한 흑니(혐기성 환경에서 형성되는 황화수소와 황화철로 인해 흑색을 띠는 진흙질 퇴적물)가 곳곳에 쌓였고, 썩은 쓰레기가 골목 곳곳을 막았다. 시민들은 노후한 건물에서 살며 매연에 오염된 공기를 호흡했다. 중국 대사가 “런던은 너무 더럽다”고 경멸하며 “수 세기 동안 도시 인프라가 거의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역사학자 리 잭슨이 최근 펴낸 책 ‘더럽고 낡은 런던(Dirty Old London)’은 ‘빅토리아 시대 오물과의 사투’라는 부제처럼,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 당시 런던이 직면했던 도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
저자는 “산업혁명 당시 런던이 굉장히 혐오스러운 도시였다”고 평가했다. 쓰레기 수거가 예다. 당시 쓰레기는 돈이 됐다. 음식과 고기의 내장은 비료로 팔리고, 리넨 등 헝겊은 제지업체에 넘겨졌다. 깨진 그릇과 굴 껍데기는 도로 바닥에 까는 경골재로, 고철은 자동차 몸체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 심지어 죽은 고양이도 모피 상인에게 팔렸다. 그래서 당시 거리를 청결하게 할 책임이 있던 런던 교회 제의실은 민간업자에 무보수로 쓰레기 수거를 맡겨도 아무 탈 없이 잘 처리됐다.
그러나 쓰레기가 폭증하면서 청소 수요가 급증해 교회 제의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런던 외곽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1876년 화이트채플에 건설된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거였다. 소각로는 전력도 생산해 시민들에 큰 도움이 됐다. 저자는 “런던은 아직도 쓰레기의 20%가량을 소각해 에너지로 전환한다”며 “빅토리아 시대의 일부 해결책은 오늘날 보다 낫다”고 언급했다.
주요 운송수단인 말도 골치거리였다. 약 30만 마리가 오가며 매일 길바닥에 쏟아지는 분뇨가 1,000톤 가량이었다. 분뇨가 방치되면 말과 사람이 미끄러지고, 악취가 진동했다. 19세기 초 화장실이 도입되면서 오수저장소는 거리로 흘러 넘치기도 했다. 1849년 런던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0%인 3,000가구가 만성적인 악취에 시달렸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콜레라도 빈번히 발생했다.
청결캠페인을 이끌었던 에드윈 채드윅은 비위생적인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라며 상수도 공급 및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런던의 새로운 하수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극소수 부유층만 목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손과 얼굴만 씻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공중목욕탕과 세탁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명물이 됐고, 넘치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공원 묘지가 조성됐다.
런던의 상징처럼 된 스모그도 심각했다. 1873년 짙은 스모그가 5일간 깔려 스모그 사망자가 2배로 늘고, 동물원의 코뿔소가 쓰러지기도 했다. 많은 스모그 완화 법안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풀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매연이 자욱한 런던을 싫어한 건 아니었다. 화가 클로드 모네는 “연기 없는 런던은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자는 “런던은 일종의 실험대상이 돼 급속도로 팽창하는 도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 생생히 보여준다”며 “건물 하수구부터 대기오염까지 오늘날 대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