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문학잡지 '파리 리뷰'
60년간 인터뷰한 세계적 작가 중 한국인이 좋아하는 36인
‘작가란 무엇인가’ 2, 3권 출간

세계적인 소설가들의 인터뷰집 ‘작가란 무엇인가’(다른) 2,3권이 출간됐다. 지난해 1월 나온 1권에 이어 이번에는 올더스 헉슬리,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조이스 캐럴 오츠, 도리스 레싱,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귄터 그라스, 토니 모리슨, 주제 사라마구, 살만 루슈디, 스티븐 킹, 오에 겐자부로, 앨리스 먼로, 트루먼 커포티, 커트 보네거트, 어슐러 K. 르 귄, 줄리언 반스, 잭 케루악, 프리모 레비, 수전 손택, 돈 드릴로, 존 치버, 가즈오 이시구로, 프랑수아즈 사강의 인터뷰가 실렸다.
단 한 사람도 ‘등등’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쟁쟁한 작가들을 인터뷰한 곳은 뉴욕의 문학잡지‘파리 리뷰’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문학잡지’라 평한 파리 리뷰는 1953년 창간 이래 60년 간 명망 있는 소설가 250명을 인터뷰했다. 한국의 도서출판 다른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중 한국인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 36인을 선별, 그 인터뷰들을 책으로 묶어 지난해 1권을 출간한 뒤 이번에 2, 3권을 또 냈다.
최소 1년, 길게는 10년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된 인터뷰는 작가들의 소소한 습관과 성격, 말투부터 문학과 예술, 사회와 정치에 대한 생각까지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귄터 그라스는 절대로 밤에 글을 쓰지 않는다. 밤에는 너무 쉽게 써지기 때문에 그 글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토니 모리슨도 빛이 필요한 작가다. 그는 어두울 때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동이 터오길 기다렸다가 글을 쓴다. “작가들은 모두 그들이 접촉하려는 공간, 전달하려는 공간, 이 신비한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간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저에게는 빛이 그 이행의 신호입니다.”
‘롤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인터뷰는 위대하고 고약한 예술가의 전형을 보여준다. 인터뷰어의 허튼 단어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질문을 조각조각 분쇄하는 그는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와 에즈라 파운드 같은 다른 작가들을 공격하는 데도 거침이 없다. “일반적으로 인정 받는 많은 작가들은 제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텅 빈 무덤에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책은 모조품에 불과하고, 제 독서 취미와 관련되는 한, 완전히 보잘것없는 비실재라고나 할까요.”
예술성과 비사회성의 필연적 동맹을 재확인할 때쯤 ‘한밤의 아이들’의 작가 살만 루슈디가 이를 부인한다. 그는 “쉽고 명료하게 쓰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다. “이야기와 문학이 분리된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불필요해요. 이야기는 단순하거나 일차원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차원적일 경우에는 가장 명료하고 매력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지요.”
문학과의 오랜 ‘연애’에서 작가들이 느끼는 희열과 고통은 인터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다. 문학의 집중적인 세례를 받은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부름’에 답한다. 라틴 문학의 거장 보르헤스는 사고로 머리를 다친 뒤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까 봐 두려워 떨었던 기억을 털어 놓는다. “‘어쩌면 다시는 글을 쓸 수 없을지 몰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해본 적이 없던 걸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편소설을 써보는 일은 내 능력이 끝났다는 최후의 압도적인 타격을 대비하는 전 단계였습니다.”
반면 문학의 축복을 오만하게 깔아보는 트루먼 커포티의 자세는, 자신의 소설과 너무나 닮아 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집필 과정에서 어떤 격려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 커포티는 한 마디로 답한다. “작품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격려는 상상할 수 없는데요. 저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글이 아니면 결코 쓰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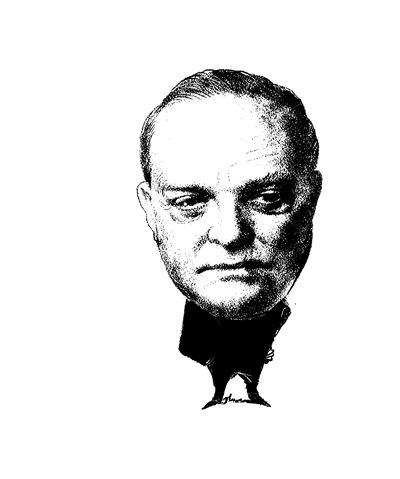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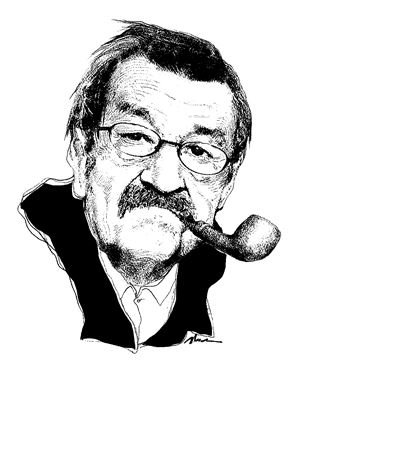


황수현기자 so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