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일 년의 마지막 날이다. 내일 보신각엔 이른 오후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속에서 이미 양의 해는 시작됐다. 소망과 덕담을 나누는 사람들의 뒤편으로 갑오년 푸른 말이 떠날 채비를 한다.
하지만 “떠나는 해의 치맛자락”이란 좌절스러운 기억이 엄습하는 순간이다. 올 해 우리 사회가 겪었던 좌절들은 개인의 후회 안에 담아두기엔 너무 깊고 넓었다. 우리에게 갑오년은 쓸쓸히 퇴장하는 늙은 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쁜 숨을 내쉬며 “미친듯이 내달리는 전장의 말”과 같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인용’했다.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면 참람하기 그지없다. “미국놈들하고 붙는 민족사의 대결전기에서 우리 동지부대가 선방에 서자”고 했다는 이석기의 발언을 대한민국의 사회계약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는 1944년 1월 “조선반도만을 위한 사소한 것에 끙끙대는 상태를 멈추고” “대동아의 성전에 참가”하자는 말을 주고 받은 이광수와 최남선에 대해 민족공동체를 포기한 것으로 비난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는 방식이다. 판결의 법리와 합리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나, 이 논의가 우리 사회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다. 소위 종북세력에 대한 고발이나 사적 폭력이 기다렸다는듯 이어진다. 55년 전 “김일성 만세”와 자유 사이의 엄청난 괴리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던 김수영의 밤으로부터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SNS를 통해 세계와 하나가 됐지만, 우리의 자유는 전세계 페북 친구들이 누리는 자유와 엄연히 다르다.
11월 30일, 서울시는 이틀 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가 채택한 인권헌장 최종안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애초에 전원 합의가 조건이었다는 서울시의 입장 뒤에는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 종교적 신념을 갖고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분란은 선진국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미국 켄터키주의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는 창조론을 신봉하는 사람만 고용하려 했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들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테마파크 측은 자신들은 종교단체이며, 교회가 신자들만을 고용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론자들만을 고용하는 건 자연스런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켄터키 주정부는 차별적 고용의 부당함을 들어 테마파크에 대한 세금혜택을 중단했다. 테마파크가 영리기관이기 때문이었다.
동성애에 대한 일말의 소극적 용인도 허락할 수 없다는 한국개신교의 자세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보다 훨씬 급진적이다. 교회의 법을 교회공동체 밖에서까지 관철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세금이라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계약마저도 교회연합회 앞에선 무력하다. 교회의 법을 신자가 아닌 시민들의 삶에까지 관철시키려 하고, 사회 전체가 약속한 세금은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 통진당에게 적용됐던 준엄한 헌법정신은 왜 눈을 감는 것일까.
4월 16일. 아이들이 탄 배가 침몰했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랬건만, 영정 앞에서 정치적인 난투극이 벌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유능함을 선전하며 권력을 잡은 이들에겐 사건이 정치화되는 것이 그나마 책임을 더는 데 유리했을 것이다. 생각과 언어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정치 세력에게 소통과 이해조정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 게으른 자들은 습관 같은 투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이제 가족과 시민은 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이를 대표하는 어떤 정치 세력도 이 같은 비극적 안전 사고 앞에선 별 차이가 없다. 언젠가는 우리도 유능한 공공시스템을 갖게 되겠지만, 그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뿌리내린 다음에라야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제야에도 지나간 꿈을 떠나 보내지 못한 찰스 램과 결코 멈추지 않을 전쟁터에서 새해를 맞이한 토머스 하디를 읽으며 이미자를 부른다. “그 누가 알아 주나 기맥힌 내사랑을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사회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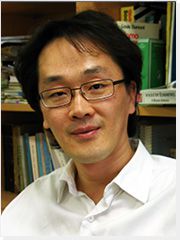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