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느쪽서도 환영 못 받아
美 금융위기 후 자국민 우선...유턴 늘었지만 국내서 냉대
툭 하면 이직에 특수 사라져
기업들 선호 이젠 옛말로 "낯선 조직문화 적응 못하고 영어만 잘할 뿐 역량에 의문"

# “미국에서 잘나간다는 대학 출신들을 뽑아 놨더니 3년 만에 1명만 남고 모두 퇴사했다.” 국내 최고 금융사 중 하나인 S사는 평년 5,6명 수준인 조기유학생 고용을 2011년에 3배 늘려 15명을 선발했다. 글로벌 경영에 무게가 실리던 때였다. 절반이 하버드 컬럼비아 코넬 등 동부 명문대를 나왔고, 나머지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학 출신들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은 1명 뿐이다. 대부분은 입사 1년 만에 그만두었다. 2년을 버틴 컬럼비아대 출신은 뉴욕의 헤지펀드 업계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지만 팀만 4번 옮기다 결국 퇴사했다. 대다수가 있는 집 자제들인 이들은 퇴사 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준비하거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낯선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때문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 싫으면 다른 직장을 얻는 풍토 역시 이들의 이직률을 높였다. S사 측은 “해외파들이 조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중간에 떠나면서 지금은 유학파를 거의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 세계적인 컨설팅업체의 A법인은 작년부터 유학파가 아닌 순수 국내파에게 눈을 돌렸다. 헤드헌팅 업체에게 웬만한 국내 대학을 나와 업계에서 나름 실력을 인정받은 국내파의 알선을 의뢰하고 있다. 과거 A법인은 미국 MBA(경영전문대학원) 출신만을 고집했었다. 헤드헌팅업체 커리어케어의 이현승 이사는 “유학파는 비록 똑똑하지만 한국 기업과 문화,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고객(기업)의 심금을 울리는 컨설팅 전략을 내놓지 못한다는 게 A법인의 자체 분석”이라고 전했다. 프로젝트 수주 가격이 낮아지는 등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유학파로는 헤쳐나갈 수 없게 되자 국내 사정에 밝은 국내파가 인기를 끄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던 조기 유학파들이 외국과 한국 어느 쪽에서도 환영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온 박모(30)씨는 “금융위기 이후 현지 금융권이나 IT 업체 일자리가 막혀 유학생 대부분이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션스쿨을 졸업한 인모(30)씨도 “현지 취업은 회사에서 신분보증을 꺼려해 어렵고, 금융위기 이후 아예 자국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어 외국인이 설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도 만만치 않다. 2006년 호주로 이민을 가 현지에서 대학을 나온 최모(24)씨는 직장을 구하러 최근 한국에 돌아왔다가 낙담만 키웠다. 그는 “외국대학을 나왔고, 영어는 할 수 있으니 취업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CJ등 30여 개 기업에 원서를 넣었지만 한 군데도 서류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씨는 “차라리 한국 대학을 나왔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미국의 한 대학 금융학과를 졸업한 김모(29)씨는 다행히 국내 취업에 성공했지만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일찌감치 한국에서 취업을 하기로 마음 먹은 김씨는 마지막 학기에 SK텔레콤, 동부화재 등 40~50군데 국내 기업에 원서를 넣었는데 서류전형 통과는 10군데도 되지 않았다. 그것도 면접 때마다 “왜 굳이 유학간 미국에서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에 돌아온 거죠? 취업에 실패해 한국에 온 건 아닙니까”와 같은 질문에 자존심이 많이 구겨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예전에는 ‘영어 잘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왔구나’라고 했는데, 이젠 유학파에 대한 태도가 바뀐 걸 실감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금 회계법인에서 평사원으로 일하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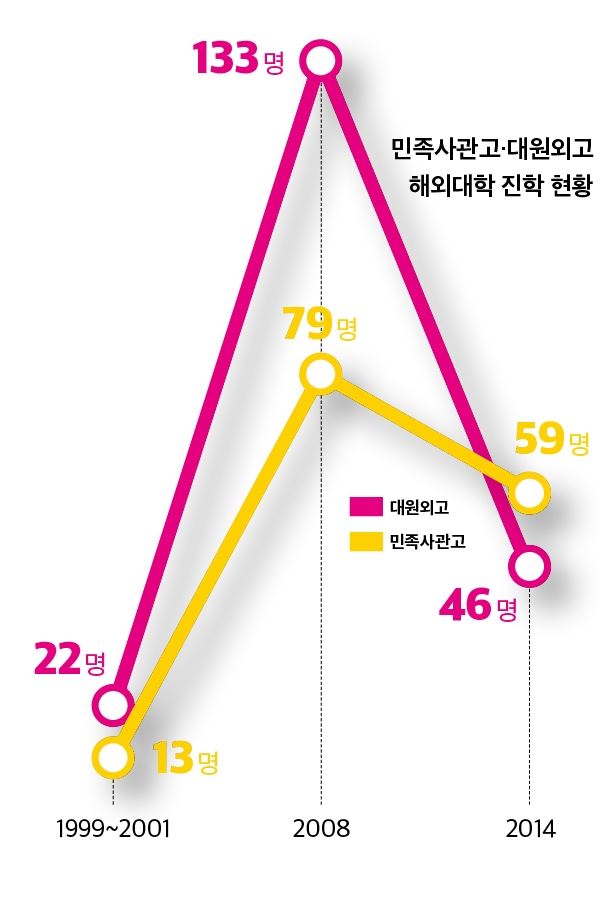
유학파 채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은 유학파 역량에 대한 검증이 비판적으로 끝난 게 무엇보다 큰 이유다. 유학컨설팅 업체 다산의 김수복 교육기획팀장은 “2000년대 중반 조기유학생들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맞물려 대거 채용됐으나,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영어만 잘할 뿐 일은 잘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개인능력과 함께 낯선 한국 조직문화에 버티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평가를 부추긴다. 이현승 이사는 “유학파들은 조직에서 본인의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에서 MBA을 따고 왔다고 하면 너도나도 끌어가던 국내 기업들조차 유학파를 꺼리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유학파에 대한 희소성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유학파를 대거 데려다 쓸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조기유학자에 대한 채용흐름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데, 삼성은 스펙만 화려하기 보다 실력을 갖춘 취업생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채용방식을 근 20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다시 국내파를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삼성이 한번 움직이면 LG와 SK가 따라가고, 2년쯤 뒤에는 롯데처럼 가장 보수적인 기업까지 따라 움직인다. 유학파 특수가 사라진 채용 트렌드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