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어구이(red herring)’라 불리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 일요일 저녁 ‘닭치고’를 보고 싶은 딸은 침대를 가리키는 아빠에게 왜 자기는 시원한 방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자야 하는 거냐고 되묻는다. 여기서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응한다면 아빠는 이 9살 소녀의 청어구이에 당한 것이다. 토끼를 쫓고 있는 사냥개 뒤에서 구운 청어 냄새를 피우면 사냥개는 원래 목표를 잊고 주인에게 돌아온다. 이처럼 환절기 감기를 경고하느라 늦은 취침 시간이라는 본래 주제를 잊은 아빠 뒤에서 닭치고가 시작했다. 시청 후 유유히 자신의 이층 침대로 올라가는 딸을 보면서 아빠는 사냥개는 커녕 30초 전 일도 잊어버리는 ‘꽉끼오’가 된 느낌이다. 그런데 이 느낌이 낯설지 않다. 신문, 방송을 보면서 아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어구이 냄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팔레스타인 출신인 스티븐 살라이타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연구하는 인류학자이다. 올 여름 그는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으로부터 종신 교수직을 제안 받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점증하던 시기였고, 살라이타는 가끔 이 분쟁이 초래한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 격렬한 트윗을 쓰곤 했다. 문제는 그의 이스라엘 비판 트윗으로부터 유대인 단체들이 ‘반유대주의’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일리노이 대학이 살라이타에 대한 교수직 제안을 철회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 사건은 대학에서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하지만 살라이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동안, 원래 그가 주목했던 500여명의 어린이들의 죽음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 한 트윗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을 하마스의 잘못과 연결시키는 것이야 말로 청어구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들의 무고한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반유대주의라는 청어구이에 묻혀 버렸다.
우리에겐 1,000개의 바람이 된 300여명의 아이들이 있다. 물 위로 배의 끄트머리라도 보일 땐 이 비극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이 살아 있었다.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은 사고를 당해야만 했을까? 이 물음 앞에 사회 전체가 삼엄하기 그지없자 정부조차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공식 발표를 고치고 또 고쳤다. 그 때 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믿었다. 노란 리본에 서툰 글씨를 써 내려가던 딸 아이의 손끝만큼 간절했다.
선거가 끝나자 청어구이가 시작됐다. 여당이 야당의원의 발언을 빌미 삼아 세월호 국정조사를 중단한 것이 시작이었다.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민생과 경제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추석이 지나니 국민이 세월호 문제에 피로함을 느끼고 있다며, 사건의 큰 줄기는 밝혀지지 않았냐는 말을 슬쩍 끼워 넣는다. 사고 원인을 재판중인 선장과 죽은 선주로부터 찾으라는 말이다. 청어 냄새에 이끌린 이들이 광화문의 세월호 가족들을 둘러쌌다. 이를 한국판 우익의 출현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 또한 청어 냄새에 현혹된 것이다. 여기에 느닷없이 A조롱과 B조롱은 둘 다 조롱이므로 A와 B는 같다는 유사 형식논리가 가세했다. 청어 냄새에 취해 청어를 굽는 지경이다.
소설 ‘공무도하’에서 해망 앞바다 뱀섬은 공습폭격훈련장이다. 해안가 주민들은 죽어가는 가축과 늘어나는 이혼, 자살을 보면서 정부에 보상을 요구한다. 작가는 평균 20자 남짓한 단문들로 민관군 그리고 언론이 결국 아무 해결도 하지 않는 과정을 7쪽에 걸쳐 써내려갔다. 작가는 이 같은 사건 기술을 그 어떤 정치적, 윤리적 주장으로 연결짓지 않는다. 나 같은 어리보기는 책 말미 ‘작가의 말’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뿐이다. 작가는 자신과 “이 세계 사이에 얽힌 모든 관계를 혐오한다. 그 관계의 윤리성과 필연성을 불신한다”고 썼다.
그가 버스를 몰고 팽목항을 찾았다. 혹자는 입장이 바뀌었냐고 묻는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자욱한 청어구이 냄새를 생각하면, 그가 지금껏 ‘맑게 소외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윤리성과 필연성을 찾아볼 수 없는 계파에 매몰된 야당을 보면 확신이 더 짙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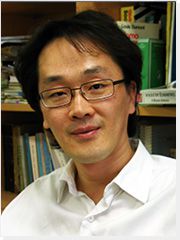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사회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