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 일리치 지음ㆍ허택 옮김
느린걸음ㆍ145쪽ㆍ1만2,000원
노동과 소비의 끝없는 반복을 강요, 가격표 없는 거래는 무시하는 사회
비판 없이 따르는 타성적 인간들에 '공인된 노동자'에서 벗어나라 충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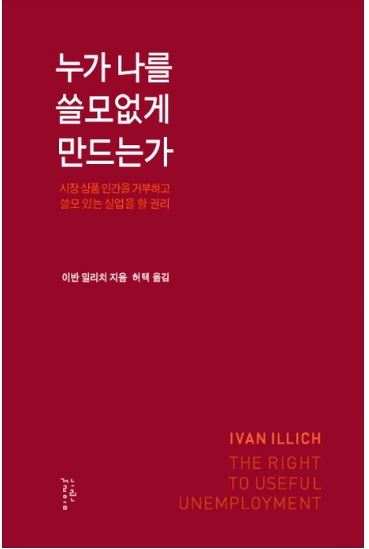
“상품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죄악이거나, 또는 두 가지 다일 수 있다. 소비를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생산과잉은 소비중심사회로 귀결됐다. 현대인은 물리적인 상품만이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보험 등 무형의 무언가를 매일 구매한다. 이 같은 시스템이 공고해질수록 이를 관리하는 전문가의 입지는 넓어진다. 반면 ‘가치의 창조’를 뜻하던 기존 노동의 의미는 사회적 관계를 뜻하는 직업으로 그 의미가 축소된다. 그래서 “무직(無職)은 자신과 이웃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한 자유라기보다, 슬픈 게으름이 되었다.”
‘학교 없는 사회’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의 저자 이반 일리치의 저서 ‘누가 나를 쓸모 없게 만드는가’는 냉철한 시각으로 현대인의 타성을 곱씹는다. 예를 들어 산모는 예전에 자택에서 스스로 아이를 낳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산부인과를 찾지 않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이 같은 변화의 근본 이유는 기술개발 때문이 아니라 “가격표가 붙지 않은 거래는 모조리 무시하는” 사회구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일상에서 끌어낸 관찰과 통찰은 수도 없이 많다. 자습과 자학이 더 보편적이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 누구나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동네 일에 관여하는 활동적인 여성은 ‘노동’하는 여성과 차별된다. 구직과 소비를 강요하는 사회구조가 현대인의 삶을 획일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에는 “한편에서는 모두가 직장을 구하는 게 꿈이지만, 한편에서는 모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게 꿈”인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저자는 이 역설의 근원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찾는다. 20세기를 “인간을 불구로 만든 전문가의 시대”라고 단언한 저자는 정부관료, 교육자, 의사, 과학자 등 서비스 제공자들의 반사회적 기능을 고발한다. 예를 들어 정부관료는 ‘위기’와 ‘긴축경제’라는 미명하에 제트기 대신 버스를 더 많이 만들자고 주장한다. 소위 ‘사회적 상품’을 더 많이 만들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상품’의 제조는 예전에 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직장인을 양산하는 구조로 귀착된다. 주 40시간으로 줄어든 노동시간은 현대인의 여가시간을 보장해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해 직장 노동자의 절대량을 늘린다. “직장인이 돼라”고 강요하는 사회에서 급여를 주는 직장을 벗어나 일 하는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조롱거리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평생을 학생으로, 환자로, 소비자로 살도록 전문가(시스템 관리자)와 공모한 사람은 바로 평범한 현대인 자신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전문가가 공인해준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역시 현대인의 자급자립에서 찾는다. 시장의존 사회의 언저리에 공동체를 만들고, 전통적 도구를 이용해 필요한 것을 만드는 등 과거로부터 이어져왔지만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사회조직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원제 ‘쓸모 있는 실업을 할 권리’의 방법론이다.
‘20세기 가장 탁월한 사상가’로 불리는 저자답게 1978년에 쓴 책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오늘날의 문제점을 관통하고 있다. 140쪽이라는 짧은 분량 속에 방대한 사상과 주장을 응축한 솜씨도 일품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