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방식은 출혈경쟁 가속, 정부가 고정가 보장해야 수익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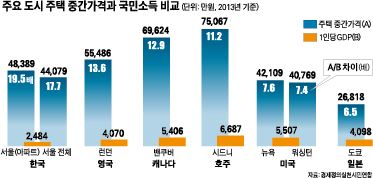
“100~200㎾ 이하 소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만이라도 고정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판매를 보장해줘야 해요. 그래야 시민발전이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민발전이 출범 1년여 만에 심각한 경영난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지난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박진희 교수는 “현행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는 조합이 많아질수록 입찰가격이 낮아져 결국 제 살을 깎아먹는 구조”라며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합리화는 정부 지원으로 시민발전에 제 자리를 잡은 뒤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의무할당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개입찰을 통해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출혈경쟁이 심해 시민발전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고사할 수 있다. 반면 FIT는 조합 등 발전사업자가 태양광ㆍ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장기 판매할 수 있게 정부가 보장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김세영 사무국장은 “태양광 발전 전기를 고정가격으로 장기 판매를 할 수 있으면 이익률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해 추가 투자자를 모으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 등 20명이 201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소형 발전사업자에 한해 장기판매를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기후에너지팀 처장은 “보전 비용은 올해 3조원 이상 걷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FIT를 운영하면서 총 1조1,410억원을 발전단가 보전 등에 지원했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소형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면 많은 재정이 없어도 유지가 가능하다.
또는 전력판매 공개입찰 시장을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규모 조합형 사업자들은 입찰시장에서 대형 발전사업자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의 대다수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입찰가격(1,000㎾h당 11만원3,000원)보다 높은 13만원을 써내 올해 4월 공개입찰에서 떨어졌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