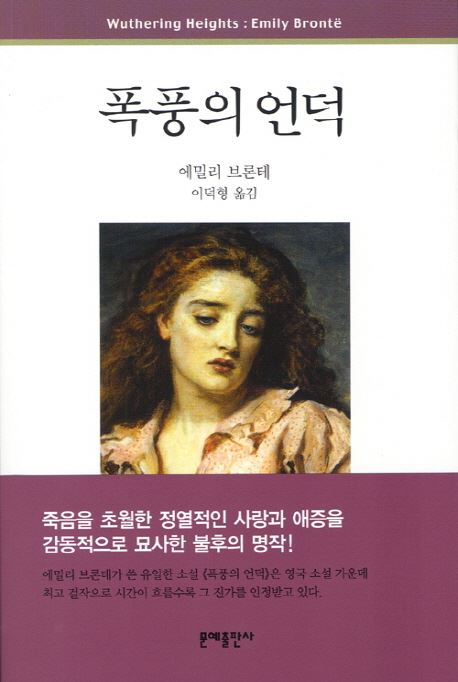
취향이 비슷했던 누나는 ‘푹풍의 언덕’을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제인에어’가 더 좋았다. 중학교 때 이 두 소설을 함께 읽고 내용을 비교했던 것은 순전히 저자가 자매 사이였기 때문이다.
그때 ‘제인에어’가 더 재미있었던 것은 내가 ‘폭풍의 언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매사 진지하지 못했던 중학생이었기에 그저 눈으로만 글자를 읽었을 뿐 소설이 담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나 불 같은 사랑 따위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회 생활을 시작할 때 만난 내 처 역시 ‘폭풍의 언덕’을 더 좋아했다. 소설의 우열을 가리는 게 문화적인 행동 같지는 않지만 나도, 누나도 그랬던 것처럼 내 처 역시 자매 저자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비교했던 것 같다.
내 처는 히스클리프나 캐서린 같은 인물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폭풍의 언덕’을 특히 높게 평가했다. 히스클리프는 집요하고 냉정하면서도 가끔 신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영악하고 교묘한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동정심을 자극하니 미워할 수만도 없다. 인간의 다면인격 혹은 다면감정을 히스클리프만큼 잘 보여주는 캐릭터도 드물 것이다. 또 다른 주인공 캐서린은 사랑을 갈구하고 그 때문에 세속의 이해에 개의치 않는 격정적인 여인이다. 요즘은 영화와 드라마에 극단적인 주인공이 많아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그리 강렬한 존재가 아니지만, 소설이 씌어진 1800년대 중반에는 이런 인물의 창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깝다고 여긴 두 여성의 공통된 평가에 ‘폭풍의 언덕’을 다시 읽었다.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유작인 ‘폭풍의 언덕’은 서로를 원하는 사랑의 감정과, 적대심 또는 복수 심리를 음울한 분위기 속에서 전한다. 주제만큼이나 그 전개가 역동적이어서 읽는 내내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린다.
‘폭풍의 언덕’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드는 것은 공간 배경이다. ‘폭풍의 언덕’이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이 소설 특유의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읽은 독자는 대부분 배경이 되는 장소를 찾아가고 싶어한다.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생겼다.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에 있는 하워스라는 마을이었다.
마을에는 에밀리 브론테가 가족과 함께 지낸 사제관과, 언니 샤롯 브론테가 한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건물과, 브론테 가문의 친척들이 숨진 뒤 묻혀있는 묘소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좁고 어두운 골목과 낡고 침침한 건물이 요크셔 특유의 거친 날씨와 섞여서인지 마을은 언뜻 가난하고 척박해 보였다. 마을 역에는 석탄 가루가 쌓여 있어 한국의 쇠락한 탄광촌을 떠올리게 했다. 고풍스럽기는 하나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폭풍이라도 몰아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유스호스텔에서 하룻밤을 지낸 것도 마을을 더욱 삭막하게 했다.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곳 옆으로는 넓은 벌판이 펼쳐진다. 근처에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이름 또한 히스클리프다. 벌판의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바람에서 나온 것 같다. 침침한 집에서 책을 읽다가 벌판으로 달려 나와 뛰어 놀았을 브론테 자매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한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을 생각하면서 한참 동안 그곳에 서있었다. 그때 유난히 거센 바람이 불어왔는데 상상의 여운과 겹쳐서인지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이 사랑을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리는 듯 했다.
박광희 문화부장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