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도 반대하는 게 자네인가?” 1980년대 후반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은 현대중공업 임원들을 거느리고 조선소를 한 바퀴 돌았다. 이어 한 곳을 지목하며 계열사 공장을 지어야 하니 부지를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이 때 40대 초반 엔지니어 출신 상무 한 사람이 “세계 최고 조선소로 크는데 꼭 필요한 공간이어서 안됩니다”고 반대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며 그러기를 무려 세 차례. 정 회장은 단단히 화가 났지만, 그 때마다 정연한 논리로 맞서는 이 사람 때문에 물러서야 했다. 정 회장은 그 후 막내 동생인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이 조선소(한라중공업)를 차리고 도움을 청하자, 이 사람을 ‘믿을 맨’으로 추천했다.
▦ 울산 허허벌판에 조선소를 세운 정 회장의 무모한 도전은 한국 제조업사에 빛나는 봉우리다. 1971년 배를 만든 경험이 전혀 없으면서도 당시 500원권에 그려진 거북선을 내보이며 영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스에서 배를 수주한 배짱은 하나의 신화가 됐다. 그 신화를 이어 받아 세계 최고 조선소를 만든 전문 경영인 가운데 대표적 인사가 정 회장 앞에서 거침 없이 노(NO)를 외친 최길선 전 사장이다.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나와 1972년 현대중공업 창설 멤버로 입사, 12년 만에 임원에 올랐고, 현대삼호중공업(옛 한라중공업)ㆍ현대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 사장을 모두 지냈다. 2005~2009년 다시 현대중공업 사장을 맡아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25배로 끌어올렸다.
▦ 비결이 뭘까. 그는 “오뎅 국물도 인부들과 스스럼 없이 나눠 마시던 정 회장처럼 늘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소통한 덕분”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다. 80년대 현장에 배치된 공고 출신들이 사무직이 되려고 안달하자, 아예 중졸 출신만으로 대상자를 뽑는 등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세계적인 기능인력을 키워냈다. 2000년대엔 역발상으로 세계 최초로 도크가 아닌 육상에서 배를 만드는 건조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다.
▦ 현대중공업이 올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영업손실을 내자, 구원투수로 최길선 전 사장을 불러들였다. 퇴임 5년 만이다. 그는 당시 자신이 사장 자리를 물려준 입사 3년 후배 밑에서 조선ㆍ해양ㆍ플랜트 부문 사장을 맡아 위기탈출을 지휘한다. 업계 최고의 현장 전문가로 꼽히는 그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다시 정주영 신화를 이어가기 기대한다.
박진용 논설위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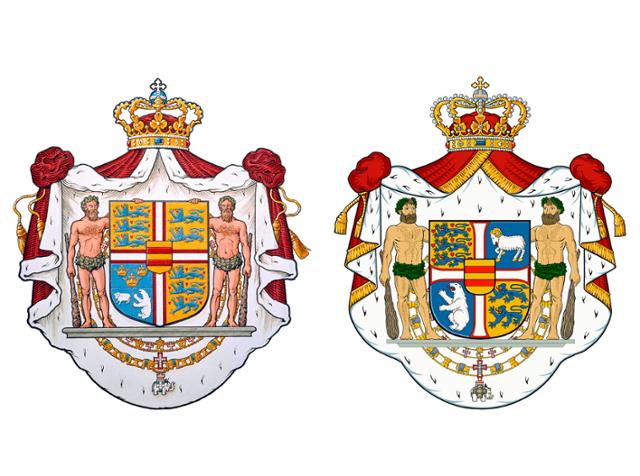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