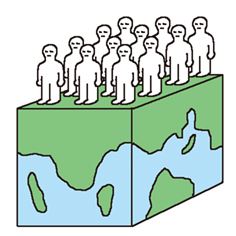
토머스 맬서스(1766~1834)가 인구론을 발표할 당시 영국의 도시인구는 급증하고 있었다. 2차 엔클로저 운동으로 농지를 잃은 농민들이 산업혁명 초기 공장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렸다. 도시노동자의 삶은 비참했다. 중노동과 더러운 환경, 턱없이 적은 임금에 찌들어 타락과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도시인구 폭증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극의 확산이 인구와 식량의 불균형, 나아가 인구 증가와 자원 고갈에 대한 맬서스의 문제의식을 자극했는지 모른다. 맬서스는 ‘빈곤과 악덕의 근원은 과잉인구’라는 주장을 폈다.
▦ 맬서스는 그러나 이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그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 문제를 음울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그의 예측과 달리 19세기까지 인구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했고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약적 증산으로 전반적 식량 위기도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 경제학자 베르너 좀바르트(1863~1941)는 정신과학으로서의 인류학에서 인구론을 두고 “세계의 문헌 중 가장 멍청한 책”으로 꼽기까지 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맬서스는 틀리지 않았다. 인구론 초고가 나온 1798년 약 8억 명이던 세계인구는 산업혁명을 겪으면서도 1850년 11억7,000만 명으로 느는 데 그쳤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20세기 들어 세계인구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927년 20억 명에서 1974년 40억 명으로 늘어났다. 곱절이 되는 데 50년이 안 걸렸다. 그 뒤로 10년마다 10억 명씩 늘어나 현재 73억 명에 이르렀다. 20세기 중반 이후 환경문제, 에너지를 포함한 자원문제가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것도 결국 인구급증 때문이다.
▦ 그러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캐나다 경제학자 윌리엄 리스가 ‘생태발자국’ 개념을 활용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전 인류가 현재 영국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20억 명,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이라면 180억 명까지다. 더 이상의 인구증가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계는 인구문제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최근 유엔은 세계 도시인구만 2045년에 60억 명을 넘을 것으로 경고했지만,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는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우려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인구정책이다.
장인철 논설위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