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 위해 모든 걸 소진한 주인공,
특권에 눈먼 사람들과 비교하니 가슴먹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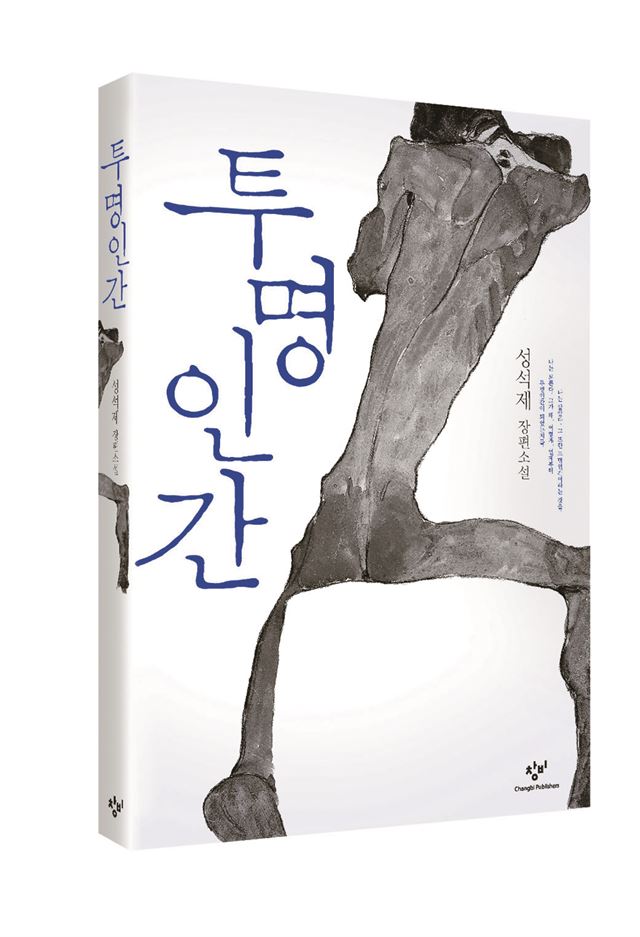
또 시신이 사라졌다. 마포대교에서 누군가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달려온 수상구조요원은 “시체가 사라진 게 올해 들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다리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각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투덜댄다. 강물이 밀어온 것은 옷과 모자뿐. 그는 어디로 갔을까.
소설가 성석제의 장편 ‘투명인간’은 보이지 않는, 아니 보이지 않게 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1950년대 산골 벽촌에서 태어나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이 돼본 적 없는 김만수란 인물이 주인공이다. 큰 머리와 가느다란 사지를 달고 태어난 그에게 조부모는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냐고 혀를 차고, 학교에서는 촌지는커녕 도시락도 못 가져온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든다. ‘자연도태, 등신 같은 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란 조롱이 그를 따라다니지만 만수는 늘 웃는다. 근면과 희생만이 그의 표어이자 삶의 보람인 듯 하다.
명문대가 출세가도를 보장하는 시대에서도 만수는 열외다. 자신은 아이큐가 100이라며 머리 좋은 동생들을 뒷바라지한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노동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구사대로 찍혀 멸시 당한다. “나는 회사도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잘 되는 쪽으로 좋아졌으면 해서…” 노동자의 권리에 경도된 직장 동료에게 노조 설립을 만류하는 만수는 생각도 자존심도 없는 ‘자본가의 개’일 뿐이다.
끝도 없는 희생의 요구와 무시 속에서 만수가 단 한 번이라도 “왜?”라는 질문을 떠올렸다면 그의 삶이 나아졌을까.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됐을까. 그러나 그는 끝내 묻지 않는다. 그 시간에 패인 곳을 메우고, 부러진 것을 싸매고, 갈라진 것을 붙이고, 굶주린 것들을 채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투명인간이 된다.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또 다른 투명인간과 마주친다. 투명인간이 생각만큼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야기는 서른 명이 넘는 만수 주변인들의 입을 통해 전개된다. 격동의 근현대사를 휘청대며 건너는 만수에게 무려 서른 여 대의 카메라를 들이대며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_투명인간은 어떤 인간상을 가리키나. 사회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무능력자인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말할 때의 의미에 가깝다. 존재감이 없는, 외모나 능력 모두 별 볼 일 없는 약자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소진해서 닳아 없어져 버린 사람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결국엔 보이지 않게 된 인간이다.”
_작가가 만수라는 인물을 마냥 옹호하지 않는 것 같다.
“당연히 아니다.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균 이하의 인물이다. 남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주변에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악한 질서와 나쁜 관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들.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속내를 밝히고 싶었다. 체념한 것인지, 분노를 감춘 것인지, 이 소설을 통해 이해해 보고 싶었다.”
_그래서 관찰의 결론은 무엇인가.
“나의 판단은 알리고 싶지 않다.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독자의 판단에 맡길 뿐이다. 다만 소설을 쓰면서 터진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된 적이 많았다. 소설을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째인데 그 동안 세상이 변한 것이라면 빈부격차가 커지고 신자유주의가 강화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직하지 않은 질서가 영속화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최근의 사태가 터졌고 절망감을 느꼈다. 자기 이익, 특권에 눈이 먼 사람들 속에서 만수를 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같은 또래라 더 그랬을 수 있겠다.”
_소설 속에 한국 근현대사 100년이 다 녹아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일어난 사건은 없다. 이 시기가 비어 있는 이유는 뭔가.
“쓰지 않고 내버려 둔 거다. 현실의 시간과 소설의 시간에는 10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 사건이 있고 10년 정도 지나야 소설적으로 발효가 된다는 뜻이다. 이후의 작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직 이번 소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황수현기자 soo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