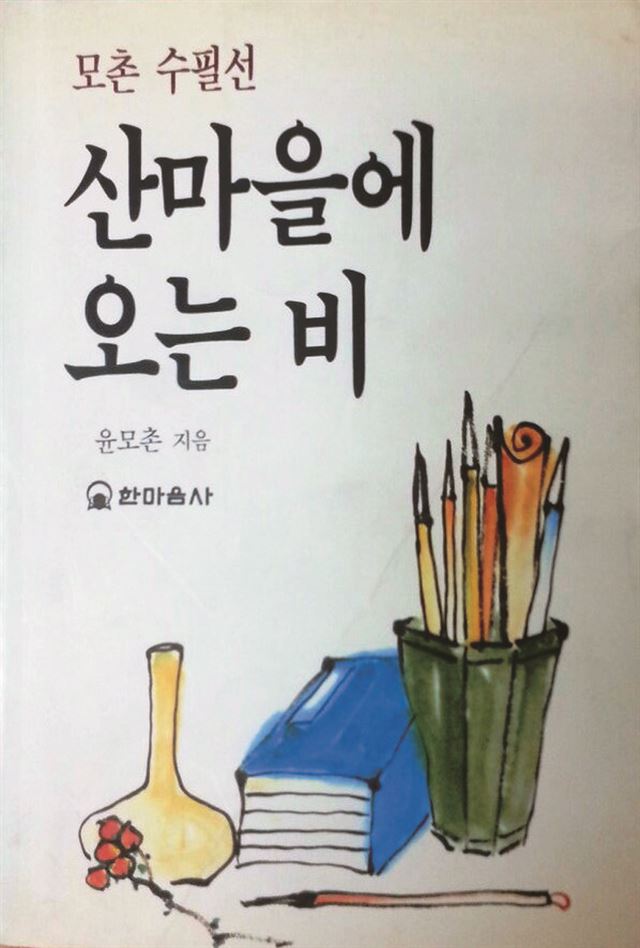
한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에세이 부문을 찾아보니 요즘 많이 사서 읽는 에세이는 인생에 교훈 주는 이야기가 다수인 것 같다. 교과서에까지 작품이 수록돼 한국을 대표하는 수필가로 누구나 퍼뜩 이름을 떠올리는 이양하나 피천득의 작품과는 종류가 다른, 넓은 범주의 자기계발서 같은 책들이라는 인상이 든다.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을 수필이라고 하니 이런 책들도 수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왠지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남는다. 그런 위화감을 불식해 줄 수필은 동인지 같은 데서도 만나는 세상이 된 것도 같다.
엊그제 책장에 꽂힌 <산마을에 오는 비> 책등에서 윤모촌이라는 수필가의 이름을 발견했다. 윤모촌은 1923년 경기 연천에서 태어나 2005년 작고한 수필가다. 윤모촌은 이양하나 피천득 만한 명성을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국내 수필문학계에 남긴 족적이 결코 작지 않다. 그의 수필은 망향(연천 고향이 지금은 이북땅인 듯 하다)의 정서를 뿌리에 두고 갖은 일상사와 추억을 솔직담백한 문장에 담아낸다. 상 차림에 비유하면 정갈하게 무친 나물 몇 가지를 올린 보리비빔밥 같다.
1995년 이 책을 내며 윤모촌은 서문에서 여러 수필론이 있지만 ‘내 글에는 허구-거짓이 끼지 않았음을 밝혀둔다’며 그것이 자신의 ‘수필 본질에 대한 신념’이자 ‘양심’이라고 말했다. 수필은 ‘인격적 삶의 실체’라고 한 작가의 믿음이야말로 언뜻 별날 것 없어 보이는 그의 글을 읽고 나면 유별나게 느끼도록 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다시 읽고 싶은 책’으로 이 책을 고른 것은 요즘은 흔하게 만나기 힘든 수필 문장을 맛보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의 작품 중 문장을 몇 가지 골라 소개한다.
50대 중반에 신춘문예 등단의 기쁨을 안겨 준 ‘오음실(梧陰室)주인’은 그의 가난한 집 마당에 청하지도 않았는데 날아와 뿌리 내린 오동나무 처지를 자신의 부인에 빗댄 글이다. 작품 중에 부부의 이런 대화가 나온다. “오동나무 팔자가 당신 같소. 하필이면 왜 내 집에 와 뿌리를 내렸을까.” “그러게 말이오. 오동나무도 기박한 팔자인가 보오. 허지만 오동나무는 그늘을 만들어 남을 즐겁게 해주지, 우리는 뭐요.” “남에게 덕을 베풀지는 못해도 해는 끼치지 않고 분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한가한 마음’의 문장들은 산문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녁을 마친 뒤 불을 켜지 않은 채 혼자 거실에 나앉아, 낮에 들고온 풋콩가지를 들고 까기 시작하였다. 시계추 소리만이 들리고, 대문 밖 저만치의 아수라(阿修羅)가 여울져 들어오는 어둠 속에, 풋콩냄새가 배토롬하게 풍긴다. 고향의 냄새이다. 모깃불 연기를 맡으며, 부채질을 하는 여름밤 촌정(村情)이 아쉬워지면서 손끝으로 콩 꼬투리를 더듬어 책장을 넘기듯 한가로움에 젖어 본다.…마음속에 펼쳐지는 여백을 느끼며 해방ㆍ분단ㆍ전쟁 그리고 병고-지나온 길을 거슬로 올라가, 허망 같은 것을 조금 느끼기도 한다.’
‘내가 접동새 울음을 처음 들은 것은, 자유당 정권의 협잡배들에 의해 부정선거가 저질러지던 시절이다’로 시작하는 ‘접동새’는 ‘교사의 신분으로 입바른 소리를 했다 해서 충북 산골로 쫓겨났을 때였다’는 자신의 문장 같은 그의 삶의 편린도 소개된다. ‘때로는 영창가에 와서 우는 것이었으나, 초저녁에 오지 않으면 새벽녘에 왔다. 새벽에 오지 않으면 한밤중에 왔다. 울면 울어서 깬 잠을 설쳐야 했고, 그치면 그쳐서 울기를 기다려 눈을 붙이지 못하였다.…육친과 헤어진 아픔이 골수로 스몄다. 재밌는 것은 접동새 울음을 듣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이나 안사람이, 그놈의 비절(悲絶)한 목청을 알 리가 없다.’
책에 허세욱 전 고려대 교수의 작품 비평을 겸한 윤모촌 인물평이 있다. ‘아주 범상한 옷을 입고 아주 보통 사람의 시시한 일로 낙을 삼고 그걸 감사’하면서 사는 그를 ‘수졸하는 샌님’이라고 평하는 허 교수는 ‘아침 저녁으로 세한도를 우러르며, 눈 녹은 양지에 참새 두어 마리가 몸을 비비듯, 그는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끝내 추운 하늘에 묏부리를 드러내고 있는 의기와 약간의 오기를 버리지 않은 채’라고 글을 마친다.
한마음사에서 나온 이 책은 지금은 절판되어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 실린 작품의 대부분은 좋은수필사에서 낸 ‘현대수필가 100인선’ 중 윤모촌 편인 ‘실락원’에 담겨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