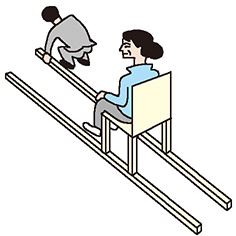
박근혜 대통령과 지근(至近)거리에 있는 ‘친박계’가 힘을 잃고 있다.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이 잇달아 탈락하더니 국회의장 자리도 맥없이 비박계로 넘겨 줬다. 그러다 보니 당 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에서도 친박계 후보군이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청원, 이인제 의원 등 당 대표를 노리는 주요 출마 예상자들이 비박계인 김무성 의원에 맞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을 에워싼 측근 그룹은 항상 동지적 연대감을 기반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다. 김영삼정부의 상도동계, 김대중정부의 동교동계, 노무현정부의 친노계, 이명박정부의 친이계가 그들이다. 이들 가신 그룹은 한결같이 정권 초반 당ㆍ정ㆍ청의 요직을 맡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다 대통령 임기 말에 이르러 서서히 사분오열되거나 변두리로 밀려났다. 상도동계와 친노계는 정권 교체에 따라, 동교동계와 친이계는 당 내부 다른 계파에게 밀려 몰락했다.
▦ 하지만 지금처럼 정권 출범 1년여 만에 가신 그룹이 여권 내부에서 외면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친박계는 야권의 친노계와 비교될 만큼 결속력이 상당한 것으로 유명하다. 18대 총선에서 당의 주류인 친이계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한 당시 한나라당 인사들이 탈당해 ‘친박연대’라는 당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그 정도로 끈끈했던 친박계에게 이처럼 빨리 위기가 찾아온 데에는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 이전 가신 그룹도 두드러진 후계자는 없었지만, 몇몇 최측근들이 2인자나 중간보스 역할을 자임하면서 나름대로 조직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1인 중심인 친박계의 경우 이 같은 중간 고리가 없다 보니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구성원 전체가 동요하면서 결속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 그룹이 지금처럼 너무 빨리 분화 조짐을 보이는 것도 원만한 국정 운영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힘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염영남 논설위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