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문제, 노후불안, 가정해체 등 7개 영역의 위험요인 중 국민이 가장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는 순위에서 실업·빈곤 등이 2위로 선정됐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자신에게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뜻이다. 이러한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자신에게 경제적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기본적인 생계의 해결이나 중산층으로의 복귀를 든든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은 IMF 시절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정부는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포괄적인 혜택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그 틀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사회가 다원화하면서 보편적 보육,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회서비스 등 생애주기나, 생활영역, 처한 상황에 맞게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나눠지고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복지제도가 영역별로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렇다면, 지금 고민해야 할 문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합해 개별 수요자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환경 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우선 각 영역별 복지제도를 발전시키면서도 서로 간 연계를 강화해 궁극적으론 저소득층의 보호와 자립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또, 지원이 절실함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급자 선정과 지원은 국민 중간 정도의 소득인 중위소득과 연계해 국민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선정기준과 지원수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보다 가난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한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지원 대상이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늘어나고, 주거급여 현실화 등으로 평균 급여액도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민의 3~4%에 국한된 문제여서 관심을 받지 못한 채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개편안과는 상관없는 다른 이유로 관심을 끌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비가 그만큼 깎여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수급자는 2인 가구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한다. 게다가 한 가구당 평균 61만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 혜택까지 추가되면 노인부부 가구는 135만원의 실질소득이 발생한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보다 더 가난함에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117만명과 기초수급자와 가정 형편이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차상위 계층 68만명은 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기초수급자보다 실질소득이 더 낮다.
따라서,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제도의 테두리 내에 들어온 수급자를 보호할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하다. 맞춤형급여체계 개편은 이 두 전략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이다. 전체 빈곤층의 큰 틀을 놓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돼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용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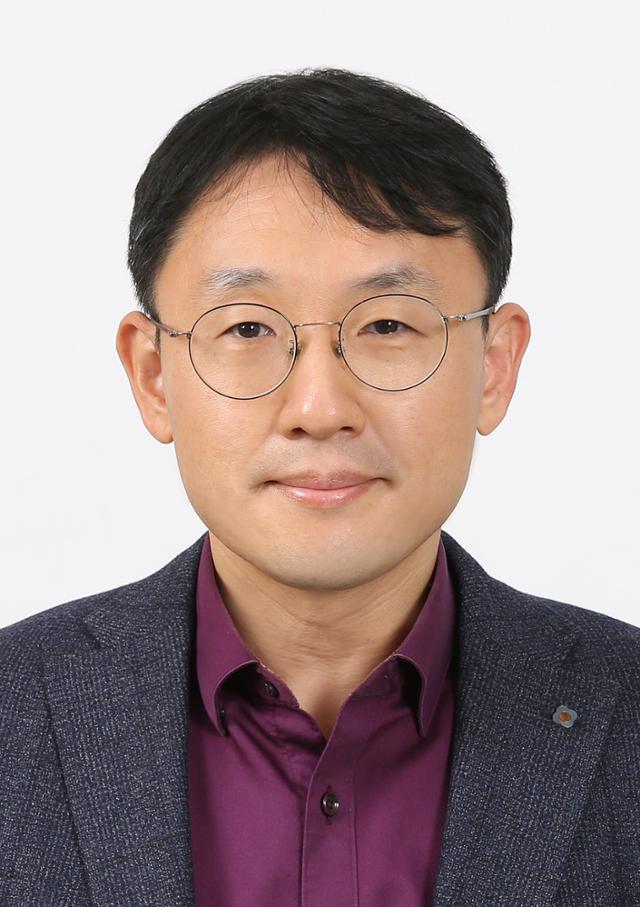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