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우리는 광장에 모여 아직 보내지 못한 이름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있었다. 어쩌면 한 번이라도 마주쳤을지 모르는 기억을, 다 같이 더듬어 보고 있었다. 노란 리본이 바람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다. 타오르는 촛불을 보며, 우리는 뜨거운 무언가를 속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아니, 이미 뜨거워진 가슴을 서로 부대끼고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했다.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을, 얼굴을, 손발을 주물러가며 빌어보고 있었다.
커다란 마이크가 우리의 귓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잊지 말아 주세요. 마이크보다 더 큰 내가 자꾸 작아지고 있었다.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온 몸이 귀가 되어 듣고 있었다. 더운 피가 손끝을 돌아 다시 심장에 올 때까지 내 심장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었다. 이토록 뜨거워진 것이 어떤 것인지 짚어보고 있었다. 사람이어서, 사람 생각을 하는 내가 거기 있었다. 나는 ‘우리’가 되어 있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우리에게 넘실대고 있었다. 잊지 않을게. 소리 내어 부를수록, 우리는 기울어지고 있었다. 기울어지는 시간에서, 멍처럼 검은 얼굴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꽤 오랫동안 공감이 없는 세상에 살았다. 정작 나 자신의 편조차 되지 못했던 시간들. 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부분’도 아니었고, 나 혼자 ‘전체’였다. 내 속을 비행하는 일이 어떠한 밤하늘보다도 어두웠다.
서울로 혼자 이사를 와서 대학교에 다녔다. 방 한 칸은 혼자 살기에 충분했다. 여러 핑계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오랜만에 안산에 갔었다. 26살이 된 지금까지 나의 집이자 고향인 안산. 안산을 떠나 서울로 이사 오던 날을 떠올렸다. 타지로 와서는 타인이 되었다. 그 뒤로 나는 계속 타인이었다. 대학생이라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건 공동체라기보다는 일종의 자격이었다. 나는 개개인으로서의 대학생이었다.
친구의 아는 동생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죽었다고 했다. 나에게 멀었던 남의 얘기가 친구를 타고 나에게 와서, 우리의 얘기가 되었다. 나의 얘기가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남의 일은 신경 쓰지 않으며 살았다. 어찌 보면 많은 세대가 그러했다. 남이 되는 일은 경쟁을 하는 일이었다. 마음을 나누지 않는, 나눌 수 없는 세대. 젊은 세대라고만 묶을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 모두가 개인이었고 둔감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산은 흐렸다. 날씨처럼, 구름이 끼고 가끔 벼락같이 서러워지곤 했다. 모든 사람들은 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우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아직도, 말하지 못한 이름들의 퉁퉁 부은 손을 알고 있었다.
분향소에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 여기저기에 보이는 노란 리본,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씩 들고 있는 촛불. 누구도 나에게 촛불을 주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촛불 하나를 켜서 들고 있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꿈을 꾸었던 어린 동생들을 떠올렸다. 공감하지 못했던 시간에서 나는 천천히 안산으로 가고 있었다. 아니, 오고 있었다.
애타게 아들 이름을 부르던 어떤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한다.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모를, 이를테면 하나의 세상이 무너지던 그 소리를 기억한다. 뉴스에서, SNS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는 발을 굴렀어야 했다. 누군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더라도, 화내고 슬퍼했어야 했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조차 내 이름인 것처럼, 나는 수많은 부모의 아들이 돼야 했었다.
공감이 없는 세상에서 살던 내가 든 촛불이 아직은 위태위태하다. 어쩌면, 아직도 가슴 속에서 촛불 하나 꺼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위태위태하다. 끝까지 밝혀줄게. 우리는 소리 질렀고,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다시 우리를 차가운 세상에 질러댔고, 우리는 뜨거웠다. 거듭 뜨거워졌다.
그리하여, 반성한다.
나만 숨 가쁘게 울지 않았던 사람이라서 미안하다. 촛불이 타오른다. ‘우리’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일 수 있다면.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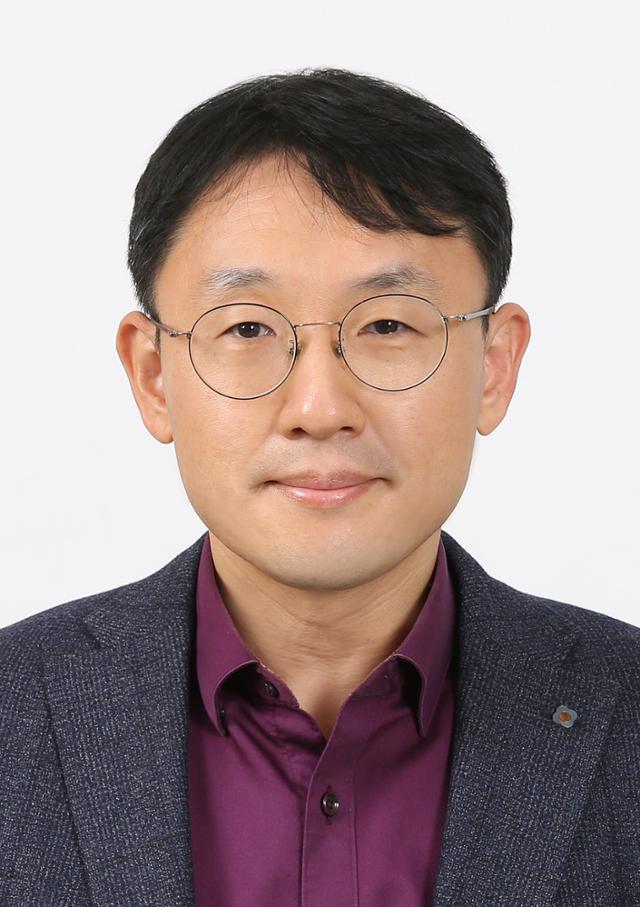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