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영세상인들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보호기간 3년이 지난 후 1회에 한 해 3년간 재지정이 가능해 올해 재생타이어, 냉각탑, 블랙박스 등 82개 품목이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일부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지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적합업종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부정적 의견들을 확산시키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적합업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설득력을 가지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3년 전으로 돌아가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주장처럼 적합업종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산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이나 할 법한 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확산했다.
대ㆍ중소기업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사업영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수평적 경쟁 관계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역동적인 기업생태계를 이뤄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거나 사업 이양을 추진했더라면 오늘날처럼 사태가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는 더 이상 자율에 의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3년 전의 상황을 망각한 채 적합업종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일부 주장처럼 적합업종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인지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ㆍ중소기업 관계는 본질적으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대기업들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기존 기업과의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대체로 중소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는 업종은 진입 장벽이 낮아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손쉽게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고용시장의 완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업 분야로 덩치 큰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경제이며 대기업의 역할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가 전혀 다른 기업군들이 시장논리로 경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대기업들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소비자 뒤에 숨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연초부터 일부 독과점 대기업들이 원가 상승률 이상으로 제품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비판하에 앞서 입점 업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행부터 시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업종을 부정하는 논리 속에는 대기업이 하면 모든 것이 정당하다는 선입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담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 당장 적합업종을 폐지한다면 대기업들이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에서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도입하게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을 대기업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적합업종 등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거두고 대ㆍ중소기업 간 경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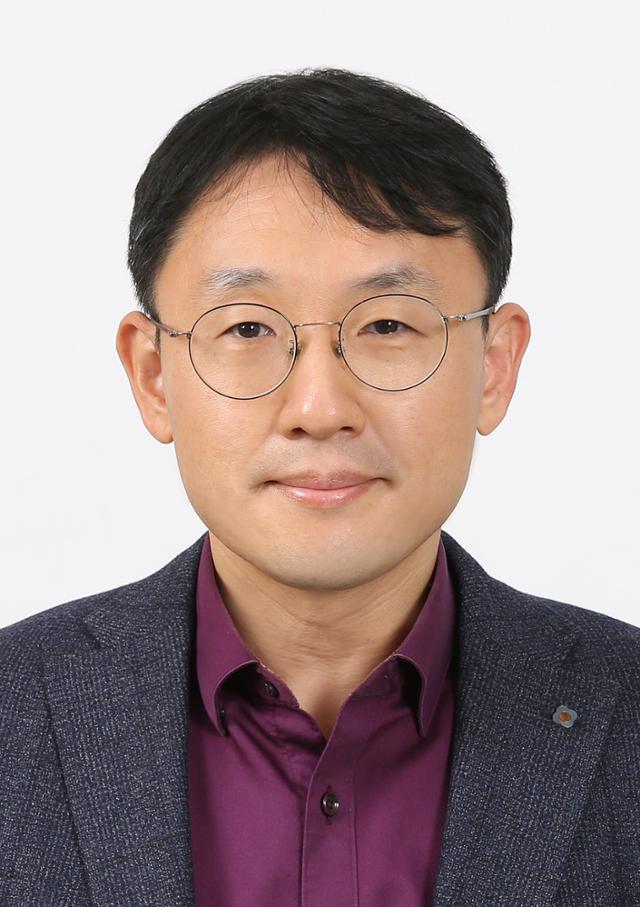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