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5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의 지방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3조 원가량의 교육교부금을 떼내 대학 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학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안’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약 11조2,000억 원 규모다(2023년 기준). 교육부의 기존 대학지원 예산 8조 원과 국세분 교육세 3조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을 합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당초 20.79%로 정해져 있는 내국세 비율을 조정해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부금을 축소한 뒤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려 했으나 이 비율은 건드리지 않고 교육세만 이관하기로 했다. 2000년과 비교하면 올해 학령인구(6~17세)는 34% 감소했고 교부금은 4배나 증가한 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0.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예산 배분구조의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무엇보다 보통교육인 초중고 교육 예산 투자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 예산 투자를 형식논리로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과밀학급 해소,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8%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뚜렷해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초중고 교육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이날 “교육을 눈앞의 경제논리가 아닌 백년지대계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특별회계 신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돼야 가능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졸속적인 법안 심사가 아니라 초중고 예산 대학 전용의 부작용은 없을 것인지, 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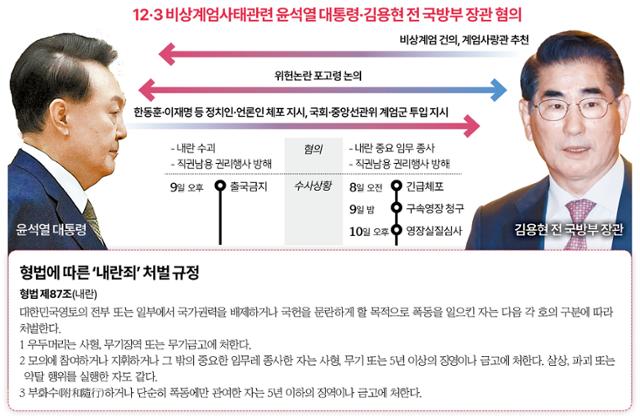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