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K-무형유산 페스티벌에서 샘도내기'팀의 봉산탈춤. 연합뉴스
자고 일어나면 세계 곳곳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숨 막히게 한다. 대면을 잃어버린 ‘거리 두기’의 불안한 날들의 끝은 있을지, 우리의 어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어제가 까마득해지고 있다. 수백 년 동안 강가 작은 마을에서 살아온, 동네 어른들도 별의별 일을 다 겪고 살았지만, 이런 일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못한 일이라며 불안한 얼굴들을 감추지 못한다.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같이 먹고 일하면서 놀았다. 거짓말 안하고, 도둑질 안하고, 막말 안하며 살았다. 가난하다고 못 산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 알았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일과 놀이의 일상을 우리는 마을 ‘공동체’ 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인류사적인 말은 실은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졌다. 그 마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근본 ‘이념’은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였다.
얼마 전 시골집에서 가까운 전주 무형문화재 공연을 보러 갔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 의자에 드문드문 앉은 관객들을 보며, 나는 슬펐다. 그러나 거리 두기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거리를 두고 객석을 다 채웠다.
무대에서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2020무형유산 예능풍류방(레지던시)’에 참여하는 전승자들이 모여 연구한 성과물로 판소리 심청가와 강릉단오제의 무속 굿을 결합한 공연이 올랐다. 기존의 심청가 판소리 공연 형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초연임에도, 창과 굿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열연은 무대와 객석을 하나로 묶어 내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이 극이 모닥불 타오르는 마당으로 나가면 관객과 배우들이 한 몸이 되어 마당을 들썩이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은 말 그대로 무형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과 현대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살판’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대미문이라는 말이 실감 나는 위기 시대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다. 근디, 살다가 보면 뭔 수가 난다” ‘뭔’ 수의 실마리 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까.
죽었는데도 살아나 봉사의 눈을 뜨게 한 심청, 칼 쓴 춘향을 해방시킨 사랑 전도사 이도령, 깊은 바닷속에서 간을 지켜 낸 별주부의 꾀, 경제 권력의 기득권 심술을 이겨낸 박타령 속에는 인간을 지켜 내려는 민중의 염원과 변화와 혁신의 끊이지 않은 숨결이 살아 있다. 전통이 역사일 때, 전통은 끊임없이 우리 핏줄속의 적(?)과 맞선 백혈구가 되어 강물로 흐를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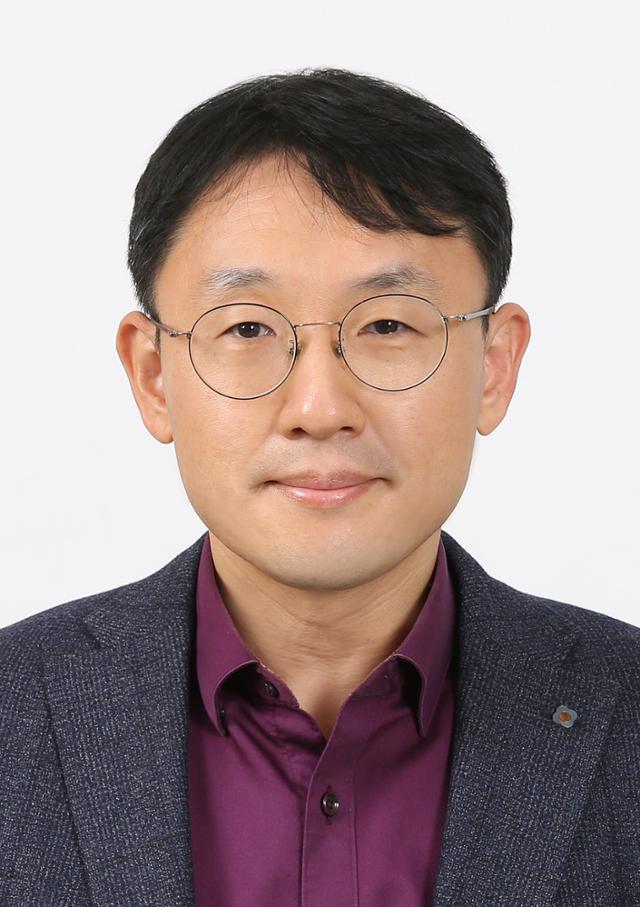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