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다시 본다, 고전]<21>잉게보르크 바흐만 ‘삼십세’
![[저작권 한국일보]삽화 박구원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19/12/12/201912121259068859_3.jpg)
서른 무렵, 나는 초조했다. 훌륭한 이들은 서른 이전에 이름을 알리고 요절해 전설이 된다는데. 나는 요절을 바라기엔 지나치게 튼튼했고, 입신양명은 요원해 보였다. 소설가 필립 로스는 나이 서른을 “더 이상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면서도 아직은 노화로 나빠지고 있는 것도 아닌” 때라고 정의했다. 시인 최승자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고 썼다.
이들을 본받아 나 역시 뭐라도 기록해야 할 것 같아, 우선 ‘서른’이란 제목을 붙이고 시를 썼다. “가만히 방바닥에 앉아/기차가 왼쪽 귀로 들어와 오른쪽 귀로 나갈 때까지/ 무사히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써놓아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때 바흐만(1926-1973)의 소설집 ‘삼십세’를 만났다.
표제작 ‘삼십세’는 만 29세의 생일날에서 만 30세의 생일날까지, 주인공이 겪는 1년 동안의 시간, 심경의 변화와 고뇌를 담아낸 소설이다. 인간이 20대에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격렬한 감정에 치우치고, 사랑에 매달리며, 위험을 겁내지 않는 이유는 자신에게 (아직) 반해있기 때문이다. 자기혐오에 빠져있는 20대조차, 실은 스스로에게 반해있다. 자기혐오란 자신에 대한 가치 기준을 높이 둔 자들이 빠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훌륭해야 마땅할’ 나, ‘사랑 받아야 마땅할’ 나와 현실의 나 사이. 이 간극에서 자기혐오가 생긴다.
“그는 지금 이미 자신의 별에 반해있지 않다.” (12쪽)
이 문장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그’에게 과거는 추억이 아니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대상이다. ‘그’를 둘러싼 시간조차 이전과 다르게 흐른다. 지금껏 타인들과 어울리느라 낭비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그’는 생각을 수정한다.
“이제 와서 그는 시간을 이용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자기편으로 구부려놓고는 시간의 향내를 맡았다. 그는 시간을 즐기게 된 것이다. 시간의 맛은 순수하고 좋았다. 그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싶었다.” (25쪽)

삼십세
잉게보르크 바흐만 지음ㆍ차경아 옮김
문예출판사 발행ㆍ246쪽ㆍ1만원
시간을 “자기 편으로 구부려” 놓고, “자신에게만” 몰입이 가능한 나이. 바흐만에게 서른은 그런 나이다. 서른 이후의 인간은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며 열중하는 가운데, 세상을 재인식한다. 이 복잡한 인식의 재정비 속에서, ‘서른’은 이정표처럼 서있다. 산 자라면 누구나 지나야 하는 이정표. 이 이정표 앞에서 취하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가, 삶의 색과 결을 정할지 모른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는 문장으로 유명한 바흐만은 시인, 소설가, 극작가, 철학자다. 이 책은 소설이지만 산문 같고, 산문이지만 시 같으며, 때로 철학서로도 읽힌다. 작가는 독자가 페이지를 쉽게 지나도록 두지 않는다. 주인공의 생각 속에서 배회하게 하고, 서사 따위는 알 바 아니라는 듯 갑자기 시적 몽상에 깊이 빠지기도 한다. 이야기를 수시로 지체하며,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을 조명한다. ‘그’의 생각은 자의적이고, 밀도가 높고, 때로 난해하다. 서른을 코앞에 둔 주인공이 “함정에 빠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금빛의 9월, 타인이 나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환상을 털어내 버린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구름이 저처럼 흐르는 것이라면 나는 대체 누구일까!”(20쪽)
이어서 곳곳에 이런 문장들이 툭툭 놓여있다.
“조숙한 완성은 있을 수 없다. 때아닌 종말도. 마음을 뒤흔드는 비극도.”(54쪽)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문제이다.”(56쪽)
서른을 맞이하는 인간은 미숙과 성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존재다. 서른뿐이랴. 물리적 시간에 따라 꼬박꼬박 매겨지는 나이와, ‘나이를 모르는 자아’ 사이에서, 인간은 끝내 고투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서른을 코앞에 둔 인간의 불안한 마음과 혼란을 치열하게 그린 명작이다.
박연준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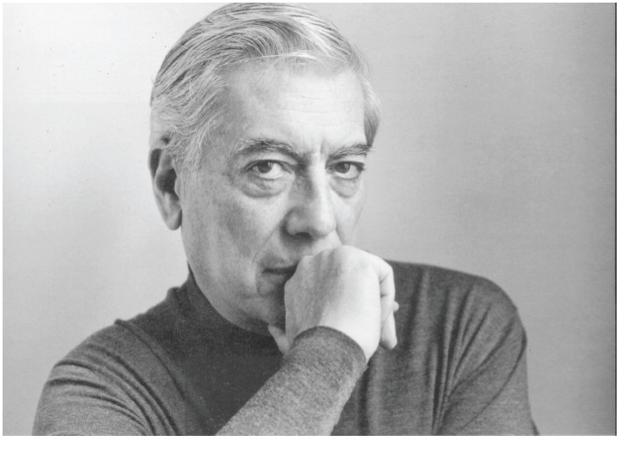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