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트리아 주거복지의 상징 ‘카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는 빈에서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다. 1930년대에 이미 세탁기가 구비된 공동 세탁 시설이 있었고 의료 시설과 식료품점, 회의실과 도서관을 갖췄다. 단지 내 시설에서 아이들의 저녁을 챙겨주기 때문에 부모의 퇴근 후 시간은 한결 여유로웠다. 집이 크다고 할 순 없지만 3, 4인 가족에게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지 그릇 수까지 계산에 넣은 여성 건축가의 섬세한 손길 덕분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꿈의 주택은 1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거뜬히 제 기능을 한다.
과거 세대의 앞선 주거 정책 덕분에 빈에서는 집이 없는 시민은 누구나 공공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진 만큼 소비 여력도 넉넉하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 실현된 오스트리아 빈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부동의 1위다.
우리는 형편이 좋지 않다. 2013년 말에야 공공 임대주택이 100만 가구를 넘겼다. 정부가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했던 1972년 이후 4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5년 동안 공공 임대주택 70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 주택 105만2,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2022년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공공임대 200만호 시대를 열고 임대주택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9%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 속에서 집값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낮은 이자로 많은 빚을 내어 집을 사들이고 임대료를 올리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장 논리 속에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해 스스로 개체수를 줄이는 전대미문의 일이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집값 하락, 임대수입 감소의 목소리가 임대주택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를 압도한다.
필자 역시 어른이 2명만 들어가도 숨이 막히는 작은 방에 월평균 60만원을 지불하며 자취하는 아들을 두고 있다. 등록금에 별도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정부 계획대로 대학생들에게 23만원 수준의 기숙사를 지어준다면 많은 부모와 청년들이 허리를 펼 수 있다.
또한 2022년까지 혼인기간 7년 이내, 연 평균소득 7,000만원 이하 모든 신혼부부 지원을 목표로 공적 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자녀는 보다 수월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부모는 결혼 지원 비용을 노후 대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듯 절박한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의 무관심 등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겹다.
‘우리 아파트 옆에 빈민아파트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가격 폭락, 불량 우범지역화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서울 모 지역에는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우다. 오히려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들어선 지역은 버스노선 신설과 기반시설 확충, 젊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이 생겼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인 지금도 베란다에서 잠을 청하는 어린이가 있고, 집이 아닌 곳에서 사람이 사는 현실은 여전하다. 연말이면 또다시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몰리겠지만 정작 절실한 것은 내 집 앞 임대주택, 기숙사를 따뜻하게 품는 일이다.
과거 세대의 앞선 주거 정책 덕분에 집장만 부담을 벗은 나라의 국민들은 훨씬 나은 삶을 산다. 내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일상을 누리도록 하자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당히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주거 정책을 제대로 펼칠 의지가 충만하며,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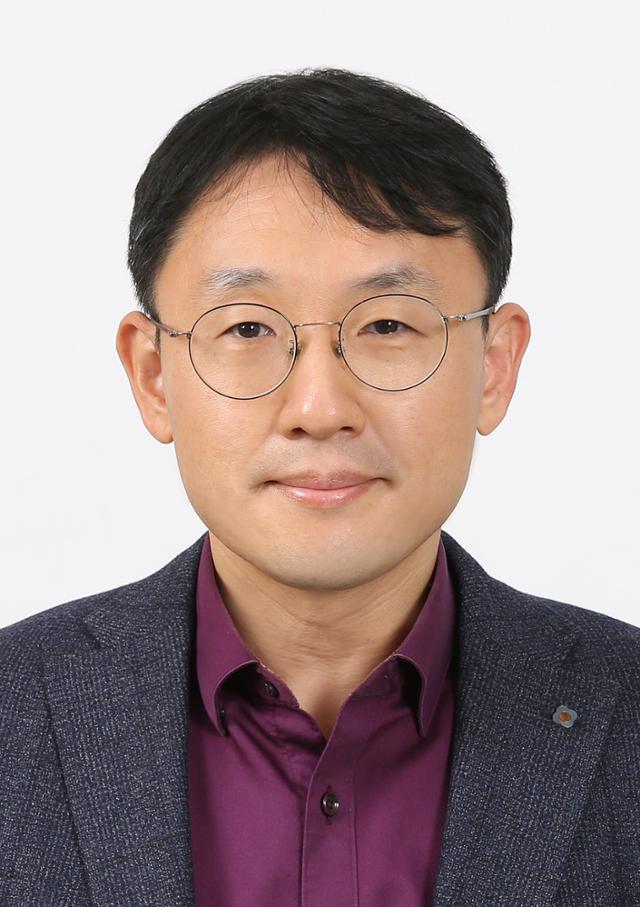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