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픽, 책 ‘근대 장애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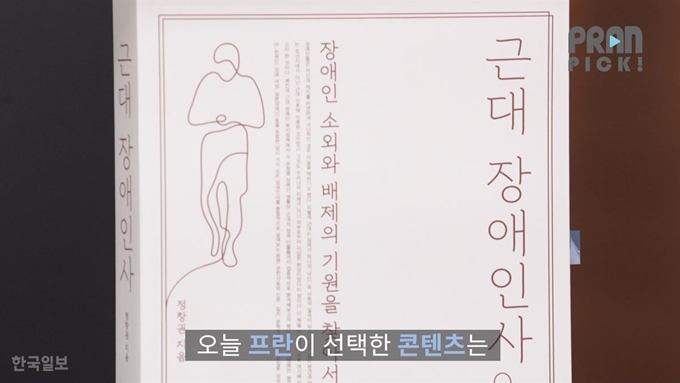
조선 시대, 개화기, 일제강점기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거시사에 갇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장애인사’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프란이 선택한 콘텐츠는 소외의 시작에 주목한 책 ‘근대 장애인사’이다.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서 고위 공직자 장애인 관료들이 언제나 한두 명씩은 있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가. 북유럽 어느 나라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600년 전 우리나라, 조선 시대 이야기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인 고위 공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자립할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의 탈시설 운동이 이제야 확산되는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삶은 언제부터, 왜 소외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을까?

‘근대 장애인사’는 저자가 흔히 ‘근대’라 불리는 시기 장애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책이 주목한 건 특히 일제 강점기이다. 장애를 ‘고치기 어려운 병’ 정도로 여겼던 조선 시대와 달리 일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불구자’라는 단어가 생긴다. ‘후구샤’라는 근대의 일본어에서 온 이 말은 ‘~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다. 장애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은 이때부터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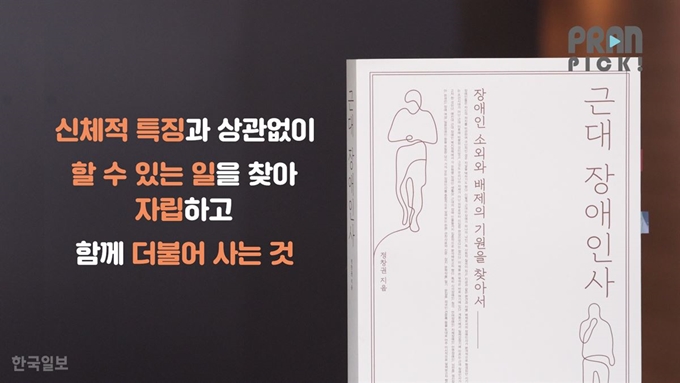
일제가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자는 우생학이 들어오면서 장애는 정상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한다. 저자는 “역사가 때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오늘날과 같은 편견과 차별, 배제로서의 장애인 역사는 불과 100여년 밖에 안 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신체적 특징과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립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거야말로 되찾아야 할 ‘건강한 전통’이 아닐까?

오늘의 프란 코멘트, “의외로 가까이 있었던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박고은 PD rhdms@hankookilbo.com
전혜원 인턴 PD
한설이 PD ssolly@hankookilbo.com
현유리 PD yulssluy@hankookilbo.com
정선아 인턴 PD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