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17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이전하라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권고를 문화체육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문화계 원로들이 나서서 극력 반대하고 있지만 ‘쇠귀에 경읽기’이다.
당초 민속박물관은 서울 용산에 건립될 계획이었다. 지난 17년간 네 명의 대통령과 열두 명의 문화부 장관을 거치면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투자 타당성 조사와 2011년 국가건축위원회의 대통령 보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문체부가 민속박물관 용산 부지에 한국문학관을 짓겠다며 민속박물관을 세종시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전 사유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1만5,000평의 부지가 필요한데 서울에는 그런 부지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약 1,500억 원의 이전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속박물관의 운명을 이렇게 졸속으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비문화적인 발상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에 대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도 없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행복도시관리청이 나선 것도 적절치 않다.
민속박물관 세종행의 가장 큰 문제는 세종시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문화의 동토라는 것이다. 교모도 세종 박물관단지(4만5,815㎡)는 서울의 후보지역인 송현동(3만644㎡), 용산 가족공원(3만 4,431㎡)보다 약 3,000평 클 뿐이다.
민속박물관은 5,000년 역사의 거울이고 수도 서울을 보여주는 문화의 상징이다. 굳이 옮긴다면 세종시에 분관형태로 두면 된다. 수도권에서 뿌리째 뽑아 보내겠다는 것은 안 된다. 연간 300만 명의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서울 소재 국립민속박물관을 2,4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서 30만 명의 세종시에 옮겨다 놓겠다는 발상은 헌법의 국민문화권 신장, 국민행복 추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외국인 순수 관람객 150만명에게 민속박물관을 대신할 생활문화의 속살을 어디에서 보라고 할 것인가?
서울의 핵심지역에서 지하 5층, 지상 12층의 건축설계 공간을 활용하면 세종보다 30배 이상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상 그것도 줄일 수 있다. 민속박물관은 이미 파주에 대형 통합수장고를 세울 계획이므로 본관 건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대폭 축소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파주 통합수장고와 행정도시의 긴 이동거리는 박물관 운영과 유물 안전에서 비합리적이다.
세종시에는 앞으로 5개 국립박물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구 30만의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박물관을 둘 이유가 있을까? 관람객이 찾지 않고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증발된 박물관은 문화의 무덤이다. 용산 이전이 어렵다면 서울의 송현동 부지도 좋다. 마침 서울시도 이에 관심이 크다고 하니 검토해주길 바란다.
최근 정세균 조경태 의원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의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국민행복을 지켜주는 함성이다. 서울과 한국의 역사문화의 콘텐츠 보고로서 국립민속박물관의 최적지는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와 용산의 문화부 국유지라는 지적은 적절했다.
문재인 정부가 문화계 원로들의 탄식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속박물관 정책을 이제라도 재검토하고 2019년 가을에 꽃비처럼 국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종철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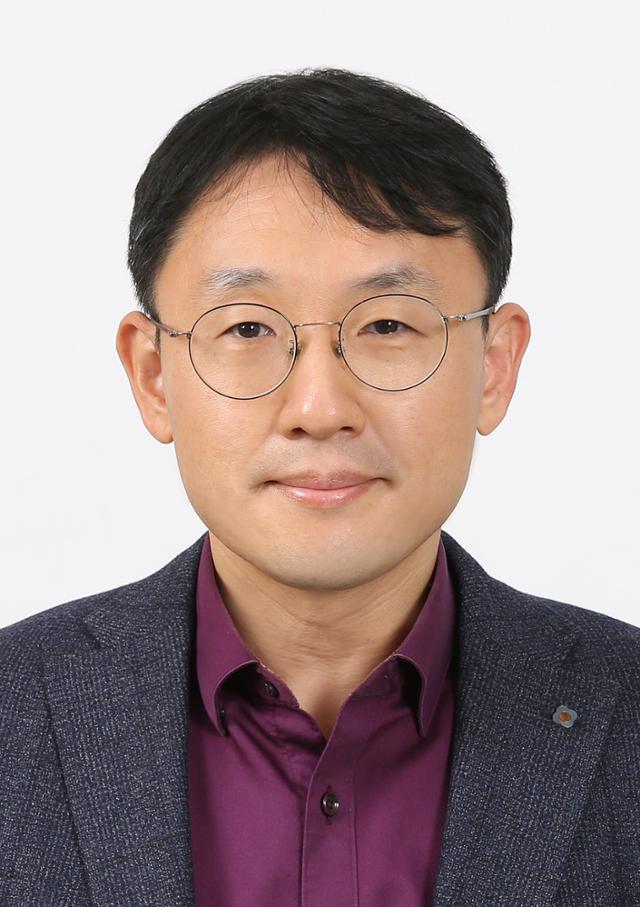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