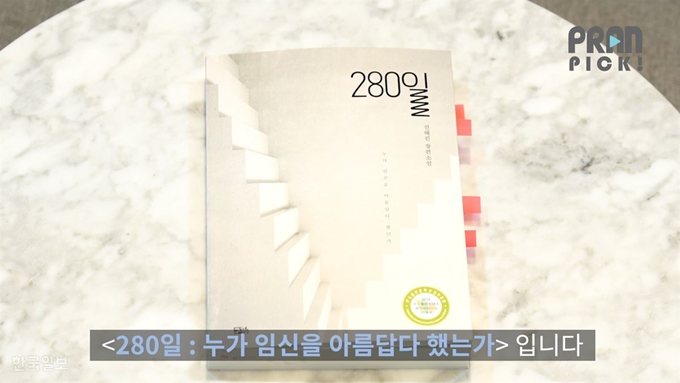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런데 임산부에게도 정말 그럴까. 책 ‘280일 : 누가 임신을 아름답다 했는가’는 한국 사회에서 임신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을 담고 있다.

책의 등장인물은 또래 4명의 여성이다. 강력계를 희망하는 형사 지원, 꽤 성공한 1인 기업가인 은주, 대기업 과장인 선경, 프리랜서 작가인 재희. 30대 중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네 친구들은 비슷한 시기 임신과 출산을 겪게 된다. 아이가 생긴 이유도,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임신을 한 뒤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엄마가 됐다는 감동보다 사회적 약자가 됐다는 자각이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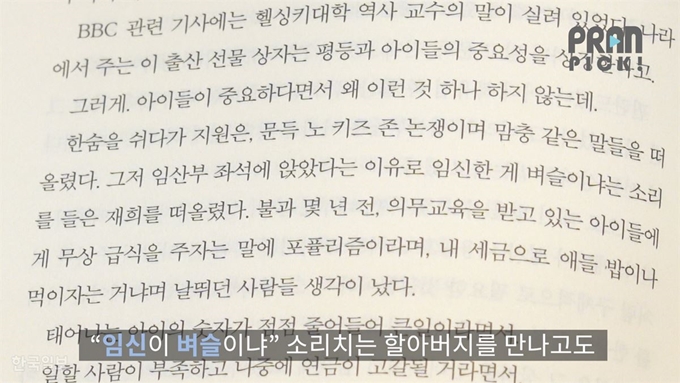
체력 하면 남 부러울 것 없었던 지원이 임신 후기에 접어들수록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재희는 임산부 좌석에 앉았다가 “임신이 벼슬이냐” 소리치는 할아버지를 만나고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야근도 마다 않고 일하다가 두 번이나 유산하고, 아홉 번째 시험관 시술에서야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베트남 파견과 사표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는 선경도 있다. “나도 임신해서 놀고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소리치는 부장의 한 마디에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때려 친 선경을 누가 감히 욕할 수 있을까.

이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와 닿는 건 아직도 직장에 임신 사실을 말하기 전에 망설일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미안하고 감사해야 하는 게 임산부의 삶이기 때문이다. 지켜야 할 생명을 품고 있어 무례와 폭력에 바로 맞대응 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들의 몫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소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들 네 사람은 그래도 ‘좋은 케이스’에 속한다는 거다. “4명 다 병원이 가까이 있는 수도권에 살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정보 접근성도 좋아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죠.” 소설은 배냇저고리를 훔치다 붙잡힌 20대 싱글맘이나 낙태를 도와달라고 찾아온 재희의 학생을 통해 임신이 여성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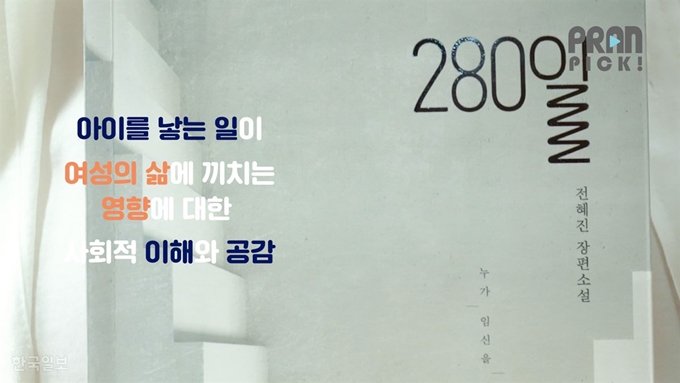
여기까지만 보면 임신과 출산에 대해 삐딱한 이야기만 가득한 듯 보이지만 소설이 말하려는 건 ‘비출산’이 아니다. 오히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건 아이를 낳아도 인생이 망가지거나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 그 필수적 전제이고, 그러려면 아이를 낳는 일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말하기도 입 아픈 당연한 사실일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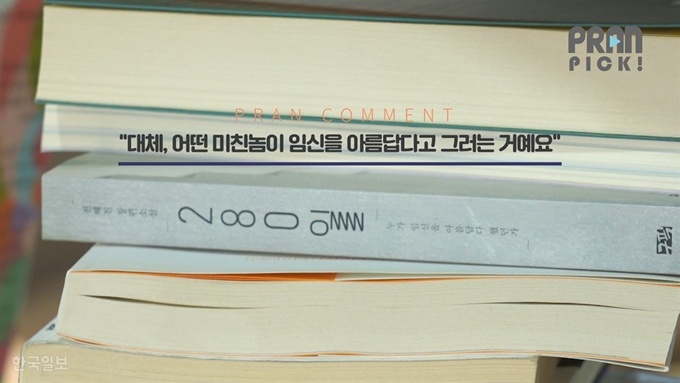
이 소설을 소개하는 한마디. 오늘의 프란 코멘트는 소설 끝자락, 무사히 아이를 낳은 재희의 탄식이다. “대체, 어떤 미친놈이 임신을 아름답다고 그러는 거예요.”
박고은 PD rhdms@hankookilbo.com
전혜원 인턴 PD
한설이 PD ssolly@hankookilbo.com
현유리 PD yulsslu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