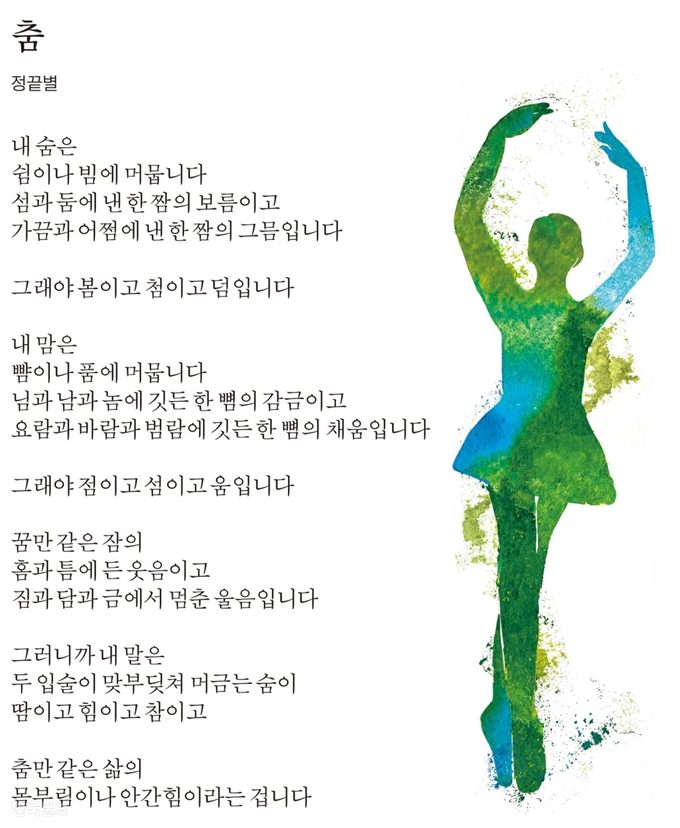
뜻 생각 안하고 읽기만 해도, 말맛이 참 좋은 시예요. 울렁울렁 넘어가는 맛이, 딱딱 들어맞는 합이, 저절로 끄덕여지는 고갯짓이 생겨요.
레고 같은 시예요. 어떻게 끼워도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고도의 계산을 장착한 블록들이기 때문이죠. 우선 한 자 요술이에요. 숨 쉼 빔 섬 둠 짬 봄 첨 덤 맘 뺨 품 님 남 놈 뼘 점 움 꿈 잠 홈 틈 짐 담 금 말 땀 힘 참 춤 삶. 다음 두 자 요술이에요. 보름 그믐 가끔 어쩜 웃음 울음 요람 바람 범람 감금 채움 입술. 세 자는 딱 둘이에요. 몸부림 안간힘. 연을 따라, 의미를 따라, 라임을 따라, 자유자재 레고가 가능한 것은 시인이 이미 여러 자리의 조립을 해봤기 때문이죠.
세 번째에서 역전하는 리듬이죠. 봄이고 첨인 내 숨은 덤이라네요. 내 맘은 점이고 섬이어서 거기서 움이 튼다네요. 보름과 그믐을 겪어, 님과 남과 놈을 겪어, 요람과 바람과 범람이 한통속임을 알게 되었고, 두 입술이 맞부딪쳐 머금는 땀나는 숨이 참이라는 분별에 닿았다네요.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로 나팔처럼 퍼지는 이 시에서 요즘의 제가 고르고 싶은 한 단어는 덤이에요. 덤이니 춤이다, 이 방향을 지지해요. 안간힘을 몸부림을 숨으로 가진 삶이 춤이 안 된다면, 덤을 마땅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가끔과 어쩜의 보름과 그믐을 오가지 못한 채 채움과 감금을 헷갈리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덤은 가진 것 위에 이유 없이 더 얹어지는 것. 받으면 우선은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 정이면 귀엽고 커지면 부당한 것. ‘더’보다는 ‘덜’, 거기에 삶이 춤이 되는 지혜가 들어있다, 저는 오늘 제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지요.
이원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