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갖고 싶은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1947년 미국의 한 연구진이 3~7세 흑인 아동들 앞에 백인 인형 2개와 유색인(갈색) 인형 2개를 번갈아 놓았다. 그리고 이 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착한 인형은? 나빠 보이는 인형은? 예쁜 색의 인형은?” 역설적이게도 흑인 아이들 대부분이 백인 인형을 선호했다. 67%가 백인 인형을 갖고 놀고 싶다고 답했고, 59%가 백인 인형이 착하다고 꼽았으며, 60%가 백인 인형의 색깔이 예쁘다고 했다. 백인 인형이 나빠 보인다는 대답은 17%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자신과 닮은 인형은 어느 것인가요?” 몇몇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한 아이는 유색인 인형을 자신과 닮았다고 꼽으며 “제가 얼굴이 타서 엉망이 되었어요”하고 변명을 하기도 했다.
‘인형 실험’은 구조적 차별이 때로는 자기 정체성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편견을 내면화시킨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인권 문제를 연구해 온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의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이처럼 자연스럽게 뿌리 내린 차별적 언어와 행동, 의식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적한 책이다.
저자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상당수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다가 뒤늦게 이 단어가 비하의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충고를 얻은 저자 스스로의 경험이 계기가 됐다. 적잖게 충격을 받은 저자는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모욕적 표현을 수집했다. 저자는 “한국인 다 됐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같은, 어찌 보면 너무나 선량한 말들이 이주민을, 장애인을 향했을 때 얼마나 모욕적일 수 있는지를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깨달았다. 전자엔 아무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결국은 한국인은 될 수 없다는 전제가, 후자엔 장애인의 현재 삶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평가적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논리도 저자의 관심 대상이다. 드라마 ‘미생’(2014)에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값싼 명절 선물을 받는 것,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사원증 목줄 색깔이 다른 것 같은 차별 상황에 대해 내심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이는 곧 사회의 ‘맹목적 능력주의’와도 연결된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작 능력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온갖 관문을 뚫고 정규직이 된 사람과 훨씬 적은 노력으로 쉽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저자는 우리가 생애에 걸쳐 애쓰고 연마해야 할 내용을 ‘차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에서 ‘차별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 구조적 차별은 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마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사회를 굳혀버린 탓에 노력의 시작점을 달리 해야 한단 뜻이다. “내가 모르고 한 차별에 대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방어보다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경청해야만 보이지 않은 불평등을 감지하고 싸울 수 있다.” 저자가 보내는 실천적 조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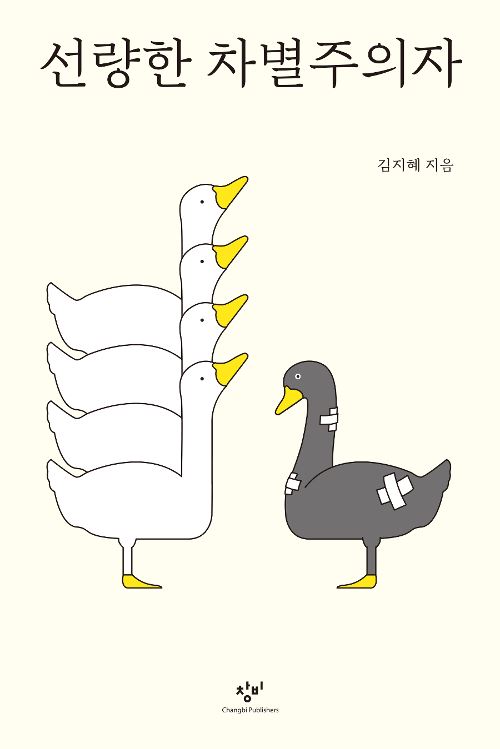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창비 발행ㆍ244쪽ㆍ1만5,000원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