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33조는 노동3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헌법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많은 법제도와 구조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하위법인 노동관계법에서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많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파업권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들, 노동부의 편향적인 행정해석과 법집행, 노동조합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바라보는 검찰 공안부와 같은 통제기구의 존재,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사회의 인식과 언론환경이 그것들이다. 그 중 공공부문에 존재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사실상 파업권을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사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파업을 하더라도 어떤 업무들은 유지를 하면서 파업을 하라는 것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단되었을 때 사용자가 압박을 느낄만한 업무는 모두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유지해야 하는 비율은 노동위원회에서 정하는데, 지금 각 사업별 유지율을 보면 60%에서 100%까지도 정해지고 있다. 어떤 업무를 하는 부서에 노동자가 10명이라면 6명에서 심지어 10명 모두가 파업에 참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파업 기간 중 사용자가 누군가를 채용하거나, 도급을 주어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파업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노조법은 외부 인력의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외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10명이 있는 부서에서 유지율이 80%라면 8명은 남고 2명만 파업에 참가할 수 있는데, 사용자는 2명의 빈자리를 1명까지는 대체근로로 채울 수가 있게 된다. 결국 이중, 삼중으로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파업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사용자는 굳이 성실히 교섭에 나설 필요성을 못 느낀다.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 타결이 될 사안도 파업까지 가게 된다. 파업에 들어가서도 장기화를 부른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왔다. 쟁의권 제한이 인정되는 필수적 서비스는 ‘그 정지가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부문’에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필수적 서비스도 100%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을 유지하면 족하며, 그 유지비율 또한 우리처럼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간 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다.
노동자들에게도 파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해야 하며 혹여 있을지 모르는 불법 시비에 휘말리면 손해배상과 징계, 심한 경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파업을 권리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악 정도로 치부하는 곳은 후진적 사회다. ILO는 노조, 사용자, 정부라는 3자로 구성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가 아닌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이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늘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권두섭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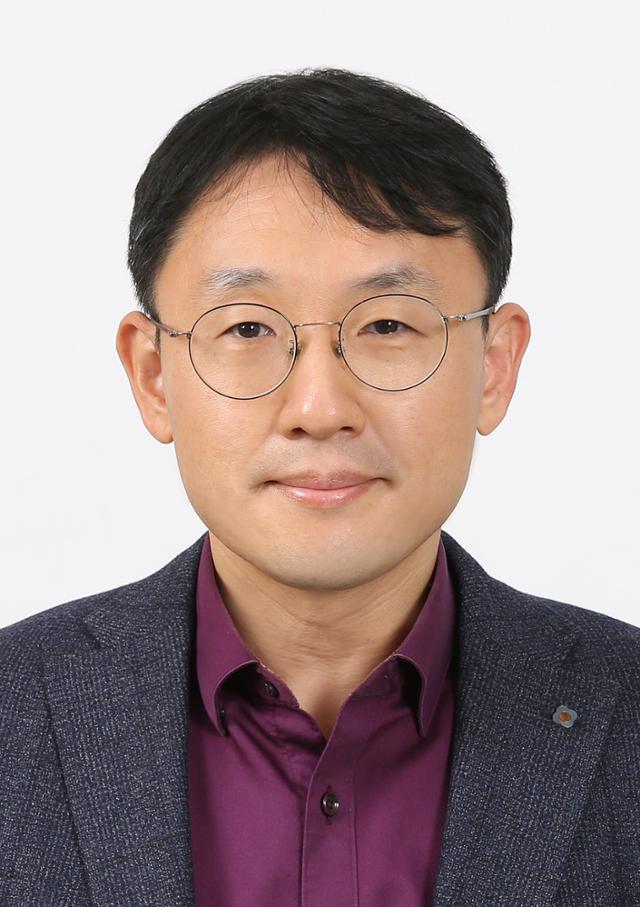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