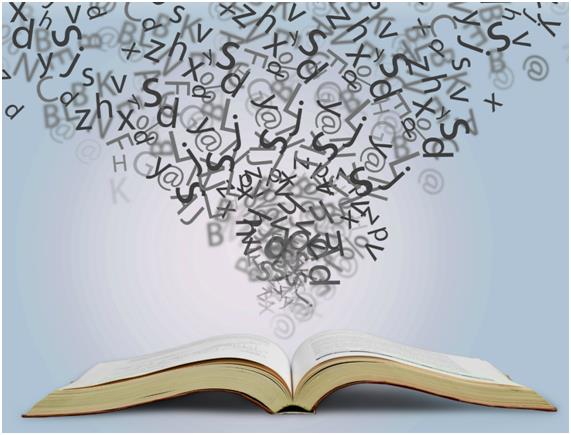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문서를 저장할 때 누르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 휴대전화에서 통화할 때 누르는 송수화기 모양의 아이콘,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요즘 아이들에게는 모두 그 실체가 낯설다는 점이다. 디스켓도 전화 송수화기도 직접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는 그저 화면 속 아이콘일 뿐이다.
1930년대 쓰인 한용운의 소설 ‘흑풍(黑風)’에는 ‘교군꾼은 인정 없이 교군을 메고 나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교군’은 ‘가마’ 혹은 ‘가마꾼’이란 뜻이다. ‘가마’가 사라지니 ‘교군’이라는 말 역시 낯선 말이 되었다. 쓰인지 채 100년이 안 된 소설인데도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제법 보였던 국어 시간이 떠오른다.
이번엔 미래로 가보자. “아빠는 놀토 때 아침부터 나가 놀았어.”라고 하자 아들이 “아빠, 놀토가 뭐야?”하고 묻는다. 무려 주 6일 학교를 가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격주 토요일만 등교하게 되자, 등교하지 않고 노는 토요일을 ‘놀토’라 불렀다는 사실은 “주 5일도 너무 많아!”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미래의 어린이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 있다.
그 당시 익숙하고 당연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낯설어진다. 앞에서 언급한 말들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낯선 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전은 이런 말들까지 담아 쌓아 가는 기록의 매체이다.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이어도 사전에서 완전히 빼 버릴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종이책 형태였던 예전의 사전에는 지면의 제한이 있어 무엇을 싣고 뺄지 고민했지만, 요즘의 웹 사전에는 고민 없이 거의 모든 것을 담아둘 수 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면, 지금은 낯선 말도 사전에 담아 두고 찾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유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