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펼쳐 보기 두려운 고전을 다시 조근조근 얘기해 봅니다. 작가들이 인정하는 산문가, 박연준 시인이 격주 금요일 <한국일보>에 글을 씁니다.
<2> J.D. 샐린저 ‘호밀밭의 파수꾼’

20대 내내 세상이 어려웠다. 어리숙한 주제에 세상을 바꾸려 들었다. 자주 투덜대며(무엇이 옳은지 주창하며!), 우울한 눈빛으로 봄날을 낭비했다. 속을 숨기지 못해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처세에 능하지 못해 늘 불이익을 당했다. 누가 ‘생의 가치’를 물으면 눈을 바로 뜨고 “순수를 지키는 일”이라고 대답해, 상대를 질리게 했다! 굶어 죽어도 ‘순수와 진실’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깝죽거렸다.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한 일은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해 읽는 거였다. 그렇다. 나는 많고 많은 ‘홀든 콜필드 추종자’ 중 하나였다. 암살자 채프먼이 존 레논을 총으로 쏜 뒤 자리에 주저앉아 읽은 책으로 더 유명한 ‘호밀밭의 파수꾼’. 소설가 필립 로스 또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15권의 소설’ 중 하나로 ‘호밀밭의 파수꾼’을 뽑은 바 있다.

좋은 소설은 캐릭터로 영생을 꿈꾼다. 작가는 죽어도 캐릭터는 오랫동안 살아남는다. 195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 나왔을 때 세계는 이 문제적 캐릭터에 놀랐다.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콜필드는 어른들의 속물근성에 진저리치고, 위선과 거짓으로 얼룩진 세상에 염증을 느낀다. 독자들은 ‘콜필드식 말투’에 열광했다. 과장, 유머, 탄식, 비꼬는 말투는 콜필드의 전매특허다. 속어(俗語)와 구어(口語)로 가득 찬 문체는 신선하다. 보통 부사와 형용사를 남용한 글을 나쁘다고 하는데, 콜필드는 그야말로 부사와 형용사를 남발하는 캐릭터다. ‘정말’ ‘굉장히’ ‘엄청난’이 무시로 튀어나온다. 그는 늘 툴툴거리지만 결국 세상의 잣대에선 방관자이자 낙오자다. 적응을 못해 퇴학을 네 번이나 당한 문제아다. 좋아하는 것이라곤 죽은 동생 앨리, 작문 숙제, “낡은 밀짚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성금을 모으던” 두 명의 수녀, 아직 순수함을 간직한 아이들 정도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어린애들만 수천 명이 있을 뿐 주위에 어른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옆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재빨리 붙잡아주는 거야.” (229~230쪽)
좋아하는 것을 단 한 가지만 말해보라는 여동생 피비의 물음에 콜필드는 어렵게 대답한다. 콜필드는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백 배는 많아 투덜대는 인물이다. 사실 그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많아서다. 너무 많아서. 투덜댄다는 것은 세상에 바라는 게 있다는 뜻이다. 이상(理想)을 품은 자, ‘지금,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자란 뜻이다. 작가 샐린저를 좋아한다면 홀든이 작가의 분신임을 알 것이다. 오두막을 짓고 숲 속에 숨어 살고 싶다는 홀든의 염원은 실제로 은둔 작가로 살다 죽은 샐린저의 존재 방식과 결이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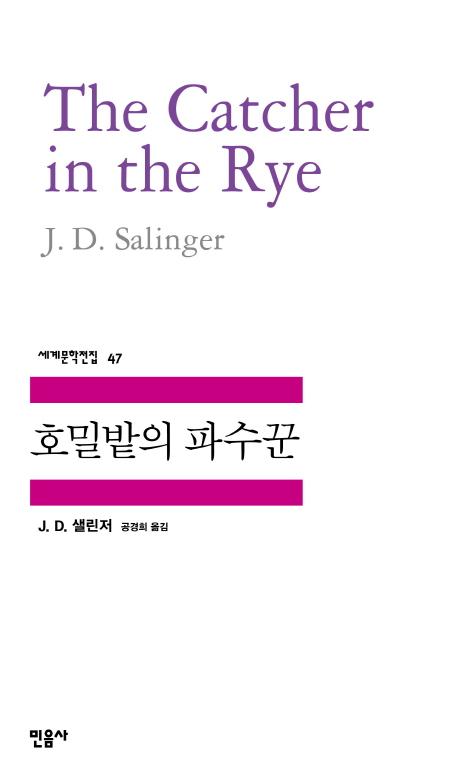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지음 공경희 옮김
민음사 발행•286쪽•8,000원
이 책은 성장 소설이지만 ‘성장’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 걸 찾으려면 다른 책을 읽어야 한다. 다만 자신이 쓸모 없게 느껴지거나 좌충우돌이 전부인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혹 지나왔다면 일독을 권한다. 혹은 오두막에서 숨어 사는 걸 꿈꾸거나, 기성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한겨울에 강이 얼면 오리들은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는 사람이라면, 이 소설과 금세 사랑에 빠질 것이다. 어느 페이지에서든, 울지도 모른다.
주의 사항! 누군가는 ‘콜필드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미성숙한 애의 독백을, 내가 왜 들어야 하지? 시간 아까워!” 라고 말하는 이를 만난 적이 있다. 뭐, 취향 문제다. 내 경우, 지금은 20대 때처럼 ‘열렬히 감응하며’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지 않지만, 언제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불현듯 어떤 향수 같은 게 밀려온다. 그 시절, 천방지축이라 가련했던 내 모습과 함께.
박연준 시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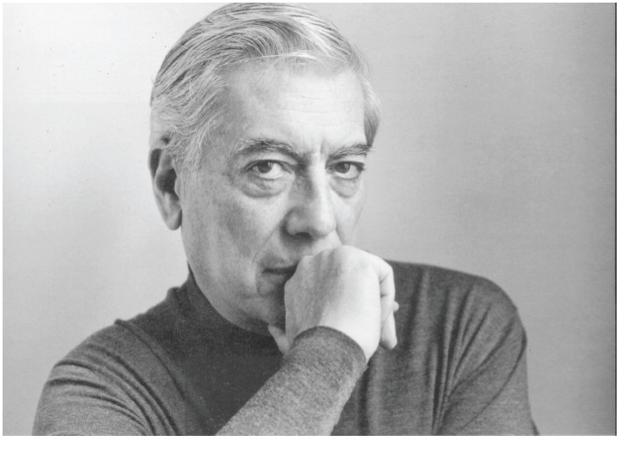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