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는 달력을 쳐다보지 않으려 노력한다. 무심코 날짜를 헤아리다가, 저 아래 묻어둔 ‘하지 말았어야 했던’, ‘한 해가 다 가도록 해내지 못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회한과 낭패감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마음의 작동방식은 흥미롭다. 누르면 튀어 오르는 고무공 같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잠들려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한숨도 못 자면 내일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초조함에 한 마리 두 마리 양이라도 세어보게 된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기억과 망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억하는 것보다 기억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면, 힘과 품을 들여 기억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잊고 싶은 일, 반드시 잊어야 하는 일은 애를 쓰면 쓸수록 한동안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 마련이다. 달력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마음속 뇌관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가 지닌 단호한 삭제의 능력이 부러울 때가 있다. ‘삭제’ 라는 지시만 내리면 끝이다. 진심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지도 않는다. 몇 달 동안 애써 번역한 원고인지 욕설과 비난이 가득한 메시지인지 상관하지도 않는다. 지우는 시간은 몇 초도 걸리지 않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세상이 지옥이 될지도 몰라.” 마음을 포맷하거나 리셋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푸념에 친구가 고개를 젓는다.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저질러도 그냥 지워버리면 괴롭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들으며 문득 2014년 겨울의 어느 날, 밤늦은 시각의 좌석 버스 뒷좌석에서 고함을 지르던 취객의 모습을 떠올린다. “세월호는 교통사고야! 세월호는 교통사고야!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였다.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은, 그 말에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사람과 나 둘 다의 기억 속에서 ‘세월호’는 쉽게 잊히지 않는 상흔이라는 사실이다.
기계와 달리 사람은 ‘너와 나’라는 형식과 상황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 망각도 홀로 애써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필요한 순간에 기억이 지워지는 편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엮어내는 현재가 과거라는 시간을 덮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다. 잊는다는 것은 몸이 겪어내는 시간의 변화다. 그래서 12월이 되면, 홀로 달력을 외면하는 소심한 저항에 실패한 너와 내가, 술잔을 부딪치고 노래를 부르며 부끄러운 과오와 말끔하지 않은 감정을 씻으려 시끌벅적 망각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아버렸다. 몰랐으면 좋았을 일들, 잊으려 노력하면 더 선명해지는 일들이 있음을. 석탄 가루 날리는 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들어가 목숨을 잃은 청년이 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곳에서 생존을 요행에 기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400일 넘는 시간 동안 철탑과 굴뚝 위 눈발 흩날리는 공중에 스스로를 가둔 채 폭력적으로 강요된 희생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창문도 없는 한 평 반의 공간에서 가까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거리에는 곧 크리스마스 캐럴이, 반짝이는 트리가, 빨강 주홍 노랑 초록 파랑 보라의 판타지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행복과 기쁨이 흥청망청 샘솟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잊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진짜로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보고 싶지 않은 것들만 말끔히 삭제한 채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상상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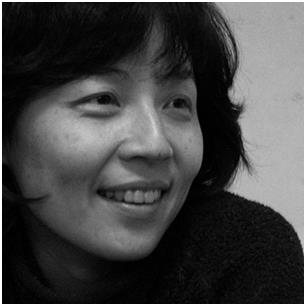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