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쯤 어느 휴대폰 회사 회장이 대중들 앞에서 직접 신제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이전엔 대개 제품개발 담당자가 언론인들을 초대해 제품 출시를 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심지어 그는 회장으로서의 격식과 위엄을 버리고 검정색 터틀넥에 청바지, 운동화를 신고 대중 앞에 섰다. 기존의 상식과 통념을 깨는 괴짜 리더십, 혁신의 아버지 스티브 잡스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면에 실리콘밸리가 있다고 말한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천국으로 IT 분야 유수의 엘리트들이 경쟁하는, 이른바 ‘세계 IT인재 블랙홀’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창업자들은 혁신 스타트업을 키워 상장시키거나 매각하는 식으로 큰 돈을 모아 더 낳은 혁신을 위해 재투자한다. 이러한 끊임 없는 ‘연쇄창업(serial entrepreneurship)’의 결과, 실리콘밸리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넷플릭스 이베이 우버 등 혁신기업, 나아가 우리 삶의 패턴을 바꿔놓고 있는 그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500 평방마일 남짓한 이곳에서 미국 전체의 14%에 달하는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는 등 혁신의 상당 부분이 창조되고 있다. 또한 포춘지가 선정한 1000대 기업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39개가 있다. 심지어 미국 내 벤처캐피털 투자의 3분의 1이 이뤄지고 이곳 근무자의 소득평균은 8만6,976달러(약 1억원)로 미국 전체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듯 매력적인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영국의 테크시티런던(Tech City London), 프랑스의 파리-사클레(Paris-Saclay) 혁신클러스터,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실리콘와디(Wadi), 러시아 스콜코보의 혁신도시(Skolkovo Innovation City), 칠레의 칠리콘밸리(Chilicon Valley), 인도의 방갈로르(Bangalore) 클러스터 등 일종의 국가 간 혁신클러스터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일류 IT기술을 보유한 우리도 예외일 순 없다. 선거 때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현실성 높은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다. 미래에셋금융이 약 1조9,000억원의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초대형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여기에 약 2,000억원을 출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필자는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가까운 미래에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한다. 하지만 ‘강남역까지 30분대에 이동 가능’, ‘초역세권 아파트단지 보유’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론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아이콘임과 동시에 실제 미국 내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창업기업의 1%만 생존하는 벤처 기업의 무덤이기에 기술혁신의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2017년 실리콘밸리 지수(Silicon Valley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 근무자 간 소득격차는 ‘고도기술-높은 임금’의 논리 아래 25년 간 꾸준히 심화했고 중산층은 점차 저소득층으로 대체됐다.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거시적 정책 방향은 이미 잡혔다. 스티브 잡스의 말을 빌어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Stay hungry, Stay foolish)”며 우리의 혁신에 대한 간절한 바램을 실현시켜주길 바란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층을 배려한 각종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 즉 미시적 정책에 대한 고민을 소홀하면 안될 것이다. 우리가 벤치마킹하려는 실리콘밸리에서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혁신을 통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면에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혹독한 양극화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백승진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정치경제학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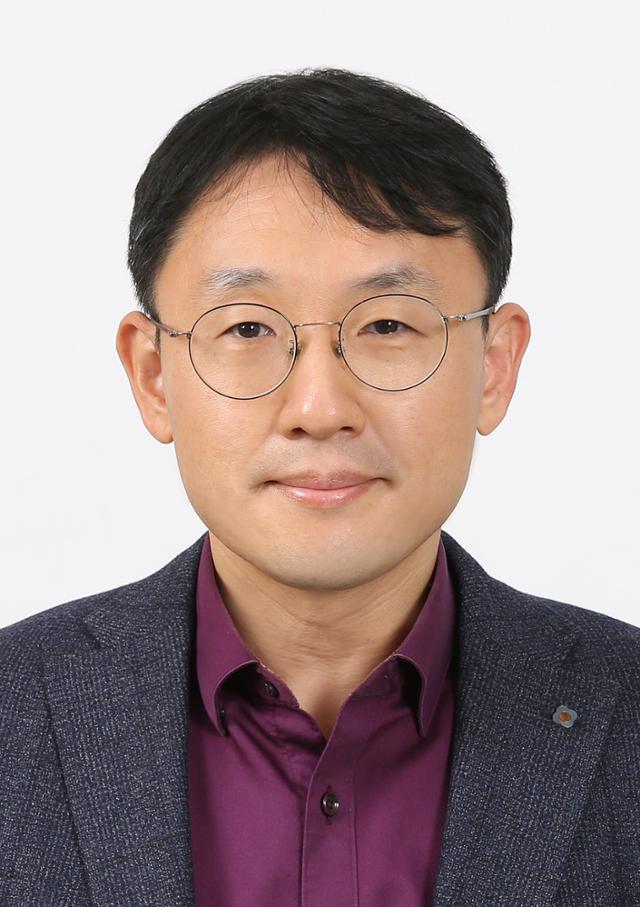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