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인생이란 지도에서 점점 희미해져, 자신의 의도하지 않는 곳에 서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사람을 좀처럼 만나지 않는다. 하루 일과와 마쳐야 할 일들이 나름대로 정교하게 짜여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만 경우,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사전정보를 캐지도 않고 안다 하더라도 무시한다. 내가 그(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사람에 대한 명성이나 소문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과 직접 만나 눈을 맞추고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생기는 확신(確信)이다. 이 확신은 그의 이력서보다 확실하다. 내가 확인한 그 사람의 심지(心志)가 관계를 지속하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이유다. 나는 그의 과거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 관심 밖이다. 원래 미래와 과거라는 시간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이것들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두 종류다. 한번 보면 충분한 사람과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사람이다. 전자의 경우, 대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치장하고 타인들이 그 치장에 부여한 이미지에 함몰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충분하지 않아 불안하다. 자기노출증 환자가 그런 것처럼, 남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한다. SNS에 돌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라고 착각한다. 내가 후자의 경우가 끌리는 이유는, 그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매번 조금씩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시시각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꽃과 같다. 그는 자신의 토양에서 끓어 올린 자양분과 하늘이 무심하게 주는 햇빛, 이슬, 비, 바람을 감사한다. 항상 유유자적하며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기에 매력이 있다. 겉 모습과 달리 내면의 모습을 강화한 건물이 있다.
나는 수년 전 콘스탄티노플(오늘날 터기 이스탄불)에서 그런 구조물을 보았다. 콘스탄티노플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천년 동안 난공불락의 도시로 명성을 누리게 된 이유가 있다. 그 안에 특별한 구조의 성벽 때문이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408~450년)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 지은 오래된 성벽 서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성벽을 건설하였다. 이 성벽의 특징은 서로 다른 크기의 성벽 두 개가 있다. 이 이중 성벽은 성을 둘러 싼 도랑인 해자를 따라 이중으로 건축되었다. 내성벽(內城壁)은 두께 5m, 높이 12m 규모다. 총 22.5m 길이로 55m마다 18~20m 육각형 혹은 팔각형 망루가 96개나 세워졌다. 내성벽은 콘스탄티노플을 천년 이상 지탱시킨 비밀무기다. 외성벽(外城壁)은 내성벽으로부터 15~20m 떨어져 바깥에 건축되었다. 두께 2m, 높이 8.5m다.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엔 그리스어로 ‘페리볼로스(perivolos)’라는 전략적인 단지가 있다. 만일 적들이 비교적 왜소한 외성벽을 보고 오판하여 콘스탄티노플을 침투하다면, 이곳의 ‘페리볼로스’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내성벽은 외성벽보다 크고 두껍고 높다. 내성(內城)은 남에게 감동적인 내가 아니라, 나에게 감동적인 내 자신을 보호하는 요새다. 이 요새에는 나의 생각, 말, 글, 그리고 행동을 조절하고 다듬는 ‘또 다른 나’가 좌정해 있다. ‘또 다른 나’는 삶의 인도하는 원칙이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원칙을 고대 그리스어로 ‘헤게모니콘(hegemonikon)’이라고 불렀다. ‘헤게모니콘’는 ‘나의 삶을 장악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내가 세상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감시카메라이며 나를 움직이는 원격조절장치다. 헤게모니콘은 매순간 나에게 숙고(熟考)를 요구한다.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숙고를 통해, 그 문제를 더 깊고, 넓고 멀리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더 나아가, 당면한 문제를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혹은 불특정 다수의 입장에서 다각도로 고민하도록 명령한다. 숙고는 내가 헤게모니콘의 동의(同意)를 받는 절차다. 이 동의를 받는 나의 언행이 나의 이미지다.
나는 그런 ‘내 자신’은 온데간데없고 나의 흉내를 낸 아바타만 존재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나의 아바타가 ‘진짜 나’라고 광고하고 세뇌시키는 사회에서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앉아 있는 나만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원칙에 귀를 기울이며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고 있는가? 나는 나인가,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나인가? 나는 온전한 내가 되기 위해 내 삶의 터전에서 뿌리를 온전히 내려 그 자양분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양에서 뿌리내리기를 헛되이 바라는가? 나는 내가 처한 환경에 감사를 표시하는 인간인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기는 오만한 인간인가? 나는 나만의 내성(內城)을 가지고 있는가?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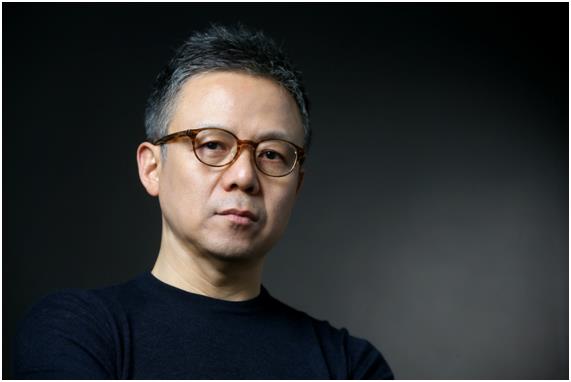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