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종교인을 가리키는 칭호인 스님, 신부님, 목사님.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존칭인 ‘님’자가 빠지면 ‘스님’한테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신부나 목사와 달리 스님은 ‘스’가 되는 것이다.
‘스’라! 칭호로 사용하기에는 퍽이나 부적절하다. 때문에 존칭을 생략하는 논문 등에서는 스님이라 할 수 없으니, 승려라고 바꿔서 표기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승려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다소 편법적이라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런 ‘스’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것일까? 불교는 붓다가 창시한 출가 수행집단에서 시작되는데, 이 수행집단에는 최소 단위가 4인 이상이어야만 한다는 인원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집단’이라는 의미의 상가(saṃgha)라고 했다.
이 상가라는 발음이 중앙아시아에서 상그(saṃgh)나 상크(saṃk)로 변화하면서, 뒷 글자가 묵음화되어 ‘상’ 발음으로만 축약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상가(saṃgha)의 두 음역어인 ‘승가(僧伽)’와 ‘승(僧)’이 중국불교 안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오늘날도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보면 짧은 표현이 선호되게 마련이다. 이런 현상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승가보다 승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독점적인 지배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승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존칭인 님이 첨가된 것이 ‘승님’이다. 이 승님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쉬운 발음으로 바뀐 것이 바로 스님인 것이다.
승가가 4인 이상의 단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므로 이를 번역한 말은 집단을 나타내는 ‘무리 중(衆)’이 된다. 즉 스님을 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된 표현인 것이다. 또 승려(僧侶)라는 표현은 음역인 ‘승’과 무리라는 의미의 ‘려’를 합성한 것으로 음역과 의역의 결합 형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중’이나 ‘승려’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 즉 승려에 대한 존칭은 스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스님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스승님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요즘에야 중국 가는 일이 짜장면 먹는 것처럼 쉽지만, 예전의 중국유학이란 목숨을 거는 일대 사건이었다. 때문에 고ㆍ중세 시대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승려들의 유학 빈도가 일반귀족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멀리는 둘째치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중국유학을 갔다 오는 양반들이 몇이나 되던가 말이다! 이렇다보니, 예전의 스님은 자연스럽게 고급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스승님이 되었던 것이다.
스님과 스승님이 통한다는 것은 조선 초기 문헌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조 때 편찬된 ‘월인석보’에는 스님을 ‘진리를 가르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중종 때의 ‘훈몽자회’에는 스님을 스승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급문화의 전달자로서, 스님이 스승님이 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다.중국에서는 오늘날까지 스님을 ‘사부(師父, 시부)’라고 부른다. 즉 ‘사부님=스님’이며, 여기에서의 ‘사(師)’ 자가 스승의 의미라는 점에서 스님을 스승의 가치로 본 것은 동일하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고급문화는 우리와 달리 실크로드를 타고 전래한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문화였지만 말이다.
중국 전통에 입각한 스승에 대한 칭호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란, ‘선생(先生)’ 즉 먼저 태어나서 더 많은 것을 아는 분이라는 의미다. 이는 중국문화에 입각한 연장자에 대한 존중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스승이란 연장자라기보다는 능력자를 가리킨다. 배울 것이 있다면 나이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불교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스승과 선생 간에는 중국과 인도문화권에 따른 서로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겠다.
자현 스님ㆍ중앙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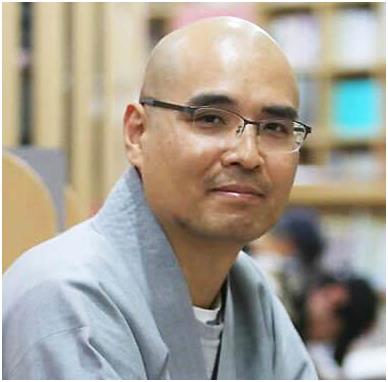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