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고 나오며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1987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해 1월에 그는 방학 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던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동네 공업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연 끝에 친구는 온종일 일하다 퇴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허름한 잠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곧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손가락에 담배가 들려 있었던가? 기억나지 않았다. 편지를 받은 날 남영동에 끌려간 대학생이 취조를 받다가 죽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 그는 친구의 편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한동안 그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신문에 난 사진 속 죽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가 아직 신입생이었던 어느 봄날, 사회과학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임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겠노라 대답했으나 그는 첫 모임에 가지 않았다. 국어 수업이 있는 강의실 근처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어학과에 다니는 한 학번 위 선배라고 했다. 그 선배와 모임에 대해 짧게 이야기를 나눴으나, 그는 결국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국어 강의실이 있는 건물에 갈 때면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도 아닌 그 선배를 우연히 마주칠까 봐 슬그머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사진 속 선배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참담했다. 나는 고작 그런 걱정이나 하고 있었구나.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2년 늦게 대학에 들어갔다. 학교에 다니려면 일주일 내내 저녁 시간마다 과외를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가 주절주절 댔던 핑계들이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늘 겁에 질려 있었다. 어린 시절 어느 정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얻어맞고 끌려 나오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세상은 그에게 어둡고 차가운 공포 그 자체였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눈앞에서 동료 학생들이 곤봉에 얻어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청재킷을 입은 사람들이 등교 길에 앞을 가로막고 도시락이 들어있는 가방을 열어 보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가방 속에 들어 있어 어디론가 끌려가는 꿈을 꾸기도 했다.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나는 여자니까, 자꾸 변명했다. 아무리 그래도 ‘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무거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신념이 강하거나 정의롭지 않았으며,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할 정도로 성실하거나 줏대 있지 않았다. 세상은 용감하거나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 변하는 것이겠지만, 그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었다. 좋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도 그저 나쁘지만 않으면 된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1987년 봄과 여름에는 이따금 거리 시위에 나갔다. 시청 앞 광장에서 엄청난 군중 사이에 숨어 청와대 앞까지 밀고 가자는 외침을 따라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12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일에 그는 구로구청에 있었다.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투표함이 발견되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구청에서 밤을 샜다. 끊임없이 소문이 돌았다. 백골단이 자정에 들어올 것이다, 한 시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한 학번 아래인 후배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말을 들으며 그는 식은땀을 흘렸다. 첫차가 다니기 시작할 무렵, 그는 전경들이 열어준 쇠창살문의 좁은 틈을 통과하여 그곳을 떠났다.
영화를 보고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그는 옛일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그러나 그 시절 내내 그는 거기에 없었다.
부희령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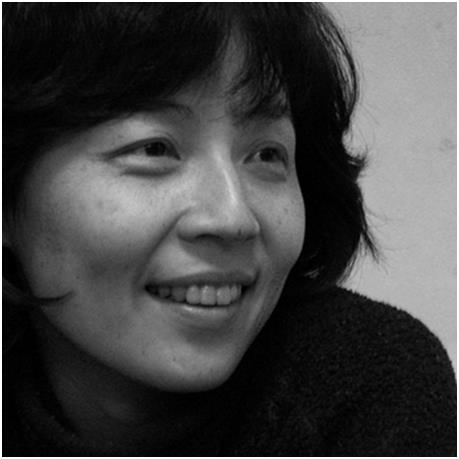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