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떤 왕이 신하들에게 “경제학을 간단한 말로 요약해보라”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열심히 연구해 한 권당 600쪽이 넘는 총 87권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바쳤다.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작성자들을 처형한 뒤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목숨 걸고 요약에 요약을 거듭한 끝에 나온 보고문은 여덟 단어로 된 한 문장. 바로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ain’t no such thing as free lunch)’였다.
모든 혜택과 이익에는 대가가 따른다. 1917년 미국 신문에 처음 등장한 이 경구를 경제학자는 물론 유명 저널리스트(월터 모로), 생태학자(배리 코모너), 공상과학소설 작가(로버트 하인라인) 등이 즐겨 인용한 이유다. 우리나라도 웬만한 분야에선 공짜 점심이 사라졌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을 이용하려면 그것을 창작한 사람(저작자)에게 걸맞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인식도 일반화되었다. 영화를 멋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불법이라는 것, 노래방에서 한 곡 부를 때마다 음원 사용료가 따라붙는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저작권자가 제 대접을 못 받는 분야가 남아 있다. 바로 뉴스저작권이다. 일반 시민, 심지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분들 중에도 뉴스는 공짜라고 여기는 경우가 꽤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최근 발간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6개국에서 지난 1년 동안 디지털 뉴스 유료 구독 경험자는 단 5%에 그쳤다. 한국의 유료 구독자는 그에도 못 미치는 4%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저작권 서비스 상품의 올해 상반기 이용현황을 보면, 민간 상장기업 전체 2,021곳 중 16%만이 재단의 저작권 상품을 이용했다. 뉴스모니터링, 스크랩 등의 서비스 사업을 벌이는 홍보대행사의 경우 뉴스저작권 상품을 이용한 회사가 전체 300여 곳 중 단 79곳(26.1%), 3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았다.
뉴스도 엄연한 저작권 보호 대상인데 왜 그럴까. 몇 가지 짐작이 가능하다. 휴대폰을 켜고 대형 포털에 들어가면 그날 뉴스가 실시간으로 주르륵 뜨는데 이게 왜 돈 받는 상품이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 포털은 언론사에 적지 않은 돈(전재료)을 주고 뉴스를 산다. 국내 이용자들의 전체 포털 검색 서비스 이용시간의 약 38%가 뉴스나 기사 검색과 관련 있다는 최근 조사결과(안민호 숙명여대 교수)가 있다. 포털은 뉴스로 이용자를 불러들인 뒤 광고 등 다른 서비스와 엮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이 때문에 언론사들은 포털이 지불하는 전재료가 턱없이 적다며 억울해한다. 어쨌든 포털의 뉴스는 공짜가 아니다.
‘뉴스는 공공재’라는 잘못된 인식도 의외로 많다. 공공재는 도로나 국ㆍ공립 공원처럼 모든 이가 별도의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다. 뉴스는 공익성이 있지만 공공재는 아니다. 뉴스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언론사들은 차례로 문 닫을 처지에 몰린다. 언론의 여론 형성 기능과 사회적 파급 효과는 크게 줄고, 결국 민주주의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아마도 언론사 입장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뉴스를 제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돈을 내겠다”는 반문일 것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보고서는 국가별 뉴스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이 36개국 중 꼴찌라고 전한다. 언론사가 뉴스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독자의 불신과 이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신뢰 하락이 대가 지불을 망설이게 했다면 언론사에도 일정한 책임은 있다.
그러나 한 손만으로 박수를 칠 수는 없다. 시민과 언론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자ㆍ언론사의 노력과 전문성이 밴 기사는 엄연한 창작물이자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상식부터 빨리 자리잡았으면 한다. 공짜 점심이 없듯 공짜 기사도 없어야 제대로 된 사회다.
노재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유통원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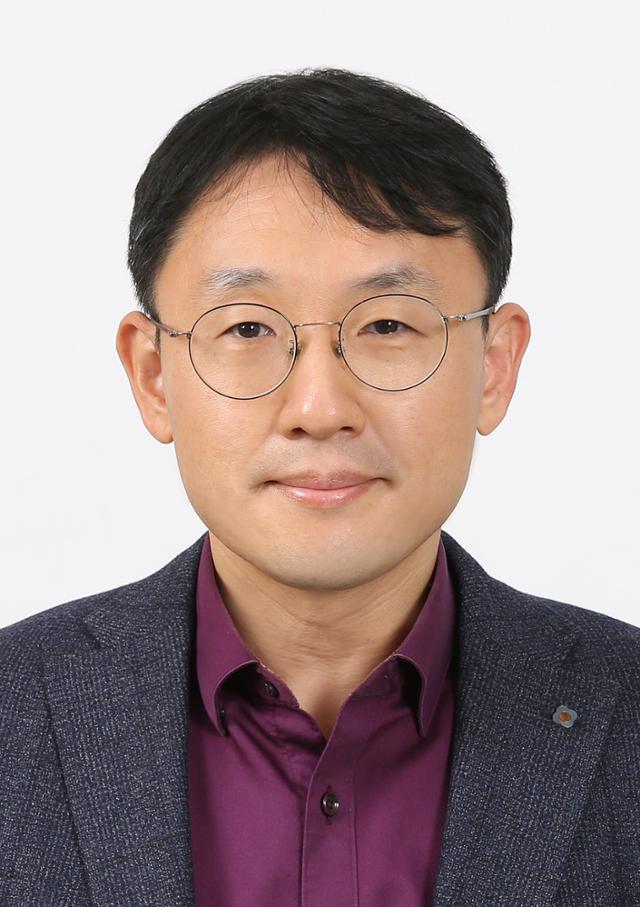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