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주대 이국종 교수가 귀순 병사를 살려냈다. 위급한 외상환자, 그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경우에는 으레 그의 이름이 거론된다. 아울러 응급외상환자가 발생하면 그에 걸맞은 전공을 이수한 의사와 의료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부족하고, 또 그런 환자를 의료진에게 데려갈 헬기가 떠야 하는데 그마저 부족하다는 얘기가 한동안 떠돌았다. 그런데도 그런 헬기가 언제 어떻게 충분히 공급될지, 국민부담이 얼마나 덜어질지,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비용에 대한 고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늘 하는 얘기가 반복될 뿐이고, 등장인물과 상황도 새로운 게 없다.
이 교수는 이번에도 같은 말을 했다. 본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의료현실을 보라고. 응급외상환자에 대응할 외상센터가 주요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됐다. 운이 좋아 위험직종에 속하지 않은 국민이더라도 언제 어떻게 사지가 잘려 나갈지 알 수 없다. 당장 손가락만 잘려 보라. 그걸 접합할 수 있는 의사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운이 좋아야만 손가락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출혈이라도 커져 보라. 희귀 혈액형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가야 충분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길이 없다. 그냥 운에 맡겨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도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것 투성이일 뿐이다.
흔히들 우리가 IT강국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얼마나 속도가 빨라진 건지 모르겠다. 의료의 최전선, 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보호막이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다. 정작 필요한 의료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빠르게 유통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메르스가 지나가니 수퍼 박테리아가 등장하고, 뒤따라 응급외상센터 부재 상황이 부각된다. 지루할 틈도 없이 문제가 속출하는데도 개선방안을 통합할 구심점도 안 보인다. 작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개선은 더딘지, 의견통합은 왜 이리 안 되는지, 마치 말을 타고 서신을 전달하던 시대 같다.
연말이어서 IT강국답게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서로 덕담을 나눌 듯하다. 그 참에 어디다 쓸 데도 없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하던 이동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좀 확인해 보자.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이 멤버십 포인트는 다 어디로 가는 돈일까. 나간 돈이 있으니 들어온 돈이니, 가짜 돈은 아니다. 그 액수는 이국종 교수 빚 청산하고, 여러 개의 외상센터를 짓고도 남을 것 같다. 이동통신사가 이 멤버십 포인트로 외상센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애초에 고객 돈이지 회사 돈은 아니다. 더불어 평소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의사를 둔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건 별로 그 멤버십 포인트 일정액을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부이력이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혜택으로 돌아오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 헌혈을 하듯, 자신의 혈액형과 같은 환자에게 자동 기부할 수 있도록 고객정보를 활용해 보라. 배는 이미 가라앉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헬기가 뜨지 않는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장연덕 칼럼니스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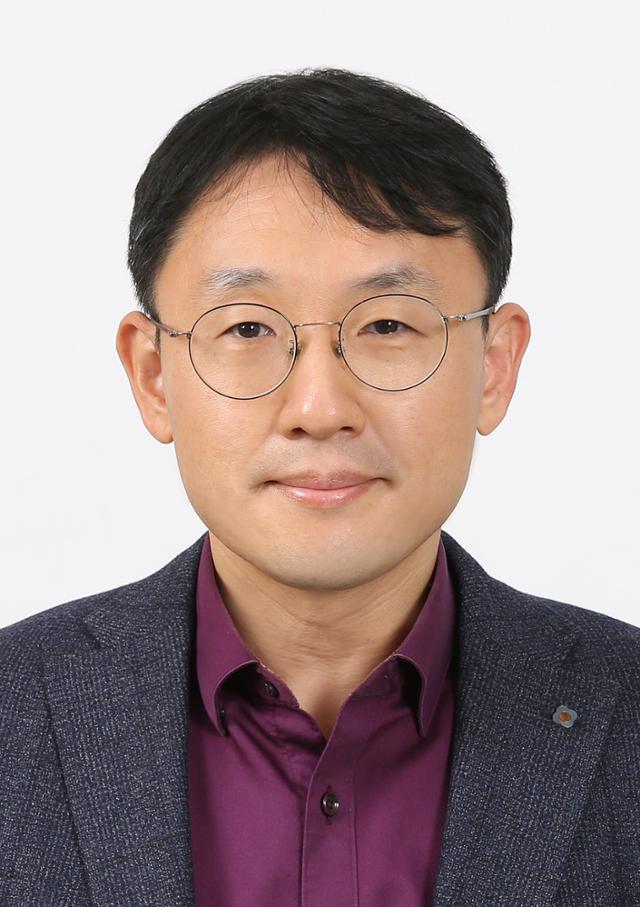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