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후의 사전 편찬자들
정철 지음
사계절 발행ㆍ356쪽ㆍ1만6,000원
사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전의 안부를 묻는 일은 얼굴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동창의 안부를 묻는 일과 비슷하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백과 서비스를 비롯해 위키백과, 네이버 지식인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물리적 형태의 사전은 급속히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웹사전 기획자 정철씨는 ‘최후의 사전 편찬자들’에서 사전과 더불어 자취를 감춘 사전 편찬자 6인을 만났다. ‘우리말큰사전’ 편찬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조재수 선생, 브리태니커 한국어판을 총괄했던 장경식 대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편찬을 맡은 도원영 선생, 금성출판사의 ‘국어대사전’ 총괄책임자 안상순 선생, 금성출판사에서 영한사전을 편찬한 김정남 선생, 일본 헤이본샤의 ‘세계대백과사전’ 편찬을 총괄한 류사와 다케시 선생이다.
모두 대중에겐 낯선 이름이다. 그 낯섦이 반갑다. 저자에 따르면 사전 편찬자들이란 출판사 대표도, 자문위원도, 실무 집필자도 아닌 편찬실 실장이다. 표제어를 정하고, 집필 지침을 만들고, 비용집행자를 설득하고, 집필자들의 글을 검토하고 통일했을 이들은 “모두의 불편함에 답하는 사람”인 동시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초의 단일어 한국어사전인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부터 해방 이후 처음 한국어를 집대성한 ‘조선말큰사전’(1947~1957), 이를 계승한 ‘우리말큰사전’(1992), 국가가 주도한 ‘표준국어대사전’(1999),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집필하는 ‘겨레말큰사전’(2019년 발간)까지, 한국에서 사전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하다. 사전 전문가 양성은커녕 사전 출간과 함께 지원이 끊기거나 조직이 해체되는 일이 부지기수였고, 국가가 개입해 표준과 비표준을 가르는 바람에 한국어 왜소화에 앞장서는 꼴이 되기도 했다. 외국어사전의 경우 일본 사전을 그대로 베껴 짜깁기하는 일은 거의 풍습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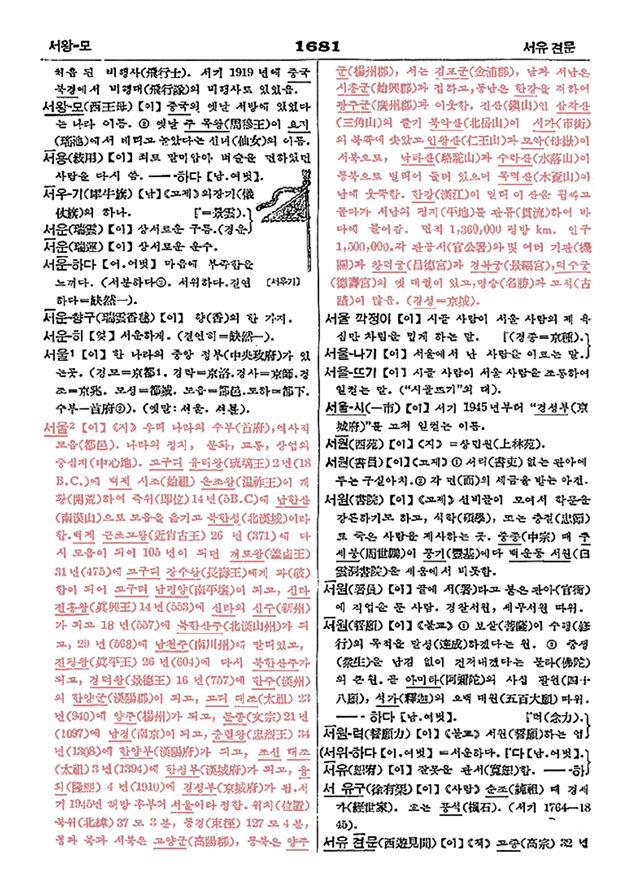
격동의 역사 중에서도 한 장면을 꼽는다면 온라인으로 빨려 들어간 사전의 마지막 뒷모습일 것이다. 두산이 네이버에 백과사전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무료 백과사전 시대가 열린 90년대 후반, 장경식 대표는 브리태니커의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고 저자인 정철씨는 네이버의 실무담당자였다.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여러 기업과 협의를 했는데, SK의 넷츠고 개발팀과 뜻이 통했어요. SK가 확보한 모바일 가입자만 해도 1,000만명이었기 때문에 향후 인터넷과 모바일, 지식 데이터를 결합한 비즈니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키백과가 출범한 것이 2001년,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가 시작된 게 2002년이다. 그 전에 브리태니커의 막강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식 포털이 나왔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나 당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1985년 동아출판사를 인수한 두산그룹은 ‘동아대백과’를 ‘두산대백과’로 바꾸고 네이버와 협약을 맺어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했다. 그리고 시장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네이버에 있었던 정철씨의 증언이 흥미롭다. “(저는) 계약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브리태니커와도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런 식의 공개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는 칼날도 안 들어갈 곳이구나 해서 더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칼날도 안 들어가는 꼿꼿함. 저자는 역설적으로 사전의 미래를 그 꼿꼿한 자세에서 본다. ‘누구나, 공짜로, 빠르게’로 대변되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에서 사전에게 남겨진 자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책임 지고 만들어 제 값 받고 파는 콘텐츠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위키미디어협회 이사인 저자는 인터뷰마다 사전의 규범성과 권위, 계몽적 자세의 위험성을 질문하면서도, 집단지성이 절대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지식의 양적 팽창이 지식의 균형을 압도”하는 시대엔 균형을 찾는 것이 약자를 향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수현 기자 soo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