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시대 진나라에 범소자란 인물이 있었다. 그의 가문은 진나라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권문세가였다. 하루는 지방장관 자리가 하나 비었다. 범소자는 이를 자기 가신으로 채우고자 했다. 이에 가신 왕생에게 누가 적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왕생은 지체 않고 장류삭이란 가신을 천거했다.
순간 범소자는 적잖이 의아해졌다. 왕생은 평소에 장류삭을 몹시 증오했기 때문이다. 하여 왕생에게 물었다. “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왕생이 답했다. “사적 원한을 공적 일에 개입시키지 않음, 좋아하지만 그의 잘못을 덮지 아니함, 미워하지만 그의 잘함을 방기하지 않음은 의로움의 근간입니다.”
춘추시대 역사를 전하는 <춘추좌전> 애공 5년(490년 BC) 조에 나오는 대화다. 의로움의 골간으로 제시된 세 가지의 원문은 순서대로 ‘사수불급공(私讎不及公)’, ‘호불폐과(好不廢過)’, ‘오불거선(惡不去善)’이다. 여기서 호오는 ‘나’의 좋아함과 미워함을 말한다. 결국 의로움의 근본이 되는 이 세 기준은 공공의 일을 처리함에 ‘나’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된다. 벌써 두 달 가까이 ‘내로남불’이니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니 하는 말들이 횡행하는 우리 현실이 절로 떠오르는 대목이다.
한편 왕생 일화에는 공과 사를 확연하게 분리해 내야 비로소 의로워지게 된다는 원리도 깃들어 있다. 비슷한 시기 진나라에는 해호란 이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모시는 조간자가 빈 관직의 적임자를 물어오자 망설이지 않고 자기 원수인 기해를 추천했다. 조간자가 범소자처럼 사뭇 의아해 했음은 당연했다. 아무튼 이 소식이 기해에게 전해졌다. 기해는 해호가 자신에 대한 원한을 풀었다고 판단하여 사례도 할 겸 해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자 해호는 활시위를 잔뜩 당긴 채 말했다. “너를 천거함은 공적 일로 그 자리를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그리한 것이다. 너를 원수로 여김은 사적 원한이다. 사적 원한 때문에 너를 군주에게 감추지 않았을 따름이다.”(<한비자>) 한마디로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얘기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해호가 이랬다저랬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과 사를 냉철하게 구분하여 공은 공대로, 사는 사대로 자기 신념에 맞춰 행했을 따름이다. 언제 어디서든 사보다는 공을 앞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태도다. 의로움은 공사의 명확한 구분 아래 공적 영역에 사심을 개입시키지 않을 때 성립되는 윤리라는 뜻이다. 곧 의로움은 사적 영역에서마저 공적 정신으로 무장해야 함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의로움을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로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의 사적 삶마저도 공적으로 꾸려가라는 요구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2,200여년 전, 당대 최고의 유가였던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욕망이 갖춰져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이를 따르되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욕망을 실현하려 애쓴다고 통찰했다. 또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하는 ‘호리(好利)’적 존재라고도 했다. 그가 인간을 탐욕스런 존재로 백안시했음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여간 해선 벗어나기 힘든 기본사양임을 깔끔하게 인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이를 기본 이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이나 교화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강조한 것이다.
다만 “하고 싶은 것과 싫어하는 것이 같으면 물자가 충분할 수가 없게 되기에 반드시 다투게”(<순자>) 되는 점이 문제였다. 그렇게 다투다 보면 사회가 근본부터 허물어질 수 있기에 그랬다. 설령 사회가 붕괴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투면 사회가 어지러워져 필연적으로 궁핍하게 된다고 경계했다.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지자고 다툰 것인데 오히려 더 큰 궁핍으로 귀결되는 어리석음의 일상화! 이에 순자가 들고 나온 것이 의로움이었다.
그는 사람이 욕망 실현과 이익 추구란 본성만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의로움도 같이 타고 났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었고,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동물처럼 인간도 기(氣)로 만들어졌고 지각을 지니고 있는 존재지만, 동물에는 없는 의로움을 타고난 덕분에 만물의 영장이 됐다는 사유다. 인간은 동물과 같은 탐리적 존재지만 동시에 의로운 존재였기에 그들과 차원을 달리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유를 인위적 도덕을 부정했던 도가계열의 철인 열자도 공유했다는 사실이다. 아니, 그는 인위적 도덕에 기초한 순자의 화법보다 한층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엄회란 인물의 입을 빌려 인간이 의로움도 없는 채 그저 먹고 살기만 한다면 닭, 개에 불과하다고 선언했다. 또한 힘이 있다는 이유로 군림하기만 한다면 이 또한 금수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인간이 닭, 개가 되는 길은 의외로 참 쉽다고 작정하고 일러준 셈이다.
김월회 서울대 중어중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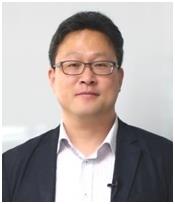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