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난민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진 상위 10개국 중 8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이 중 7개국은 최빈국이다.
필자가 속한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탄자니아 내 난민캠프가 위치한 지역에 직원이 상주하며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 4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 시위에 대한 정부 진압을 피해 42만 명이 인근국가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약 25만 명이 탄자니아 국경을 넘어 굿네이버스 사업지인 키고마 지역 내 3개 난민캠프에 정착했다.
난민으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탄자니아 정부는 난민의 캠프 밖 이동이나 경제활동을 정책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난민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캠프에서 배급하는 옥수수가루 외에는 다른 식자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굿네이버스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난민의 장기적 경제활동과 자립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및 봉제 제빵 등 난민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난민과 지역주민의 공동시장을 설립했다. 난민캠프가 장기화할수록 지역주민과 난민의 갈등이 깊어진다. 아프리카의 난민 수용국 대부분에 난민캠프가 있기 전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난민만큼 가난한 게 현실이다. 난민은 2주에 한 번 식량배급이라도 있지만, 지역주민은 그런 혜택도 없다. 그에게 난민은 자기 동네에서 유엔으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적대적 존재다. 공동시장은 그들을 경제공동체로 융합해 난민에게 새겨진 이방인 낙인과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켰다.
난민캠프에서 만난 두 자녀의 엄마 올레스틴(29세)은 1년 2개월 전, 부룬디 내전을 피해 탄자니아 은두타 캠프에 정착했다. 제 몸도 지키기 힘든 난민캠프에서 아이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녀의 삶은 상처투성이였다. 일할 수 없으니 돈이 없어 배급식량에만 의존해야 했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던 끔찍한 상황에 그녀는 너무 막막했다. 하지만 작년 말 굿네이버스 직업훈련에 참여한 뒤 그녀와 가족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다. 그녀는 직업훈련을 통해 제빵 기술을 습득했고, 오븐과 재료를 지원받아 빵을 구워 시장에 내다팔았다. 적게나마 소득이 생기니 아이들 옷을 사거나 배급식량에 없는 야채, 생선 등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올레스틴씨는 자본금이 조금 더 모이면 빵과 음료수를 파는 작은 가게도 낼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6,000만명 이상이 난민 혹은 무국적자라는 이름으로 타국을 떠돌고 있다.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난민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이제 ‘난민촌 장기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수용의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사회가 난민문제를 개인의 비극이 아닌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 또한 단순 지원을 넘어 난민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이현근 굿네이버스 탄자니아 키본도지역 난민사업 담당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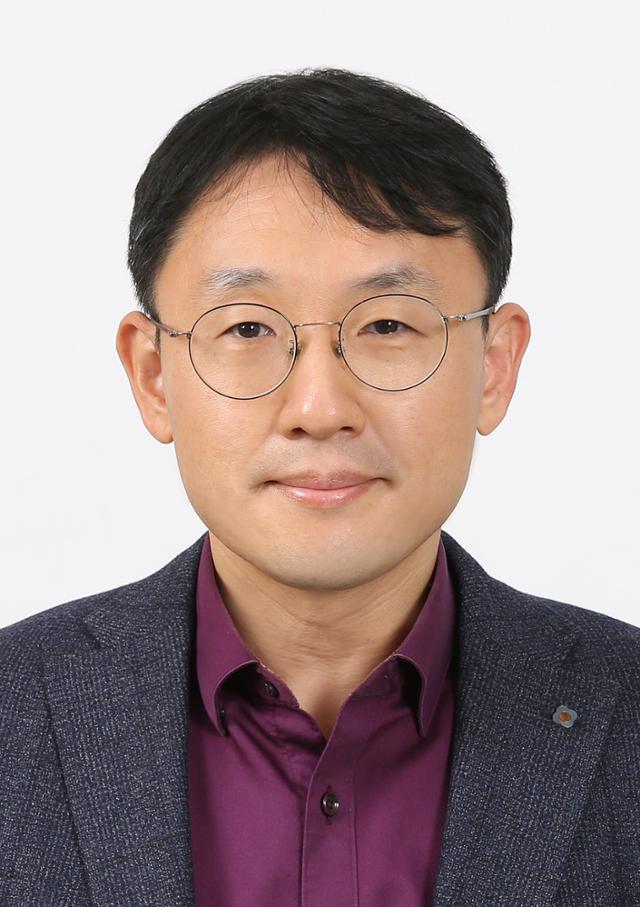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