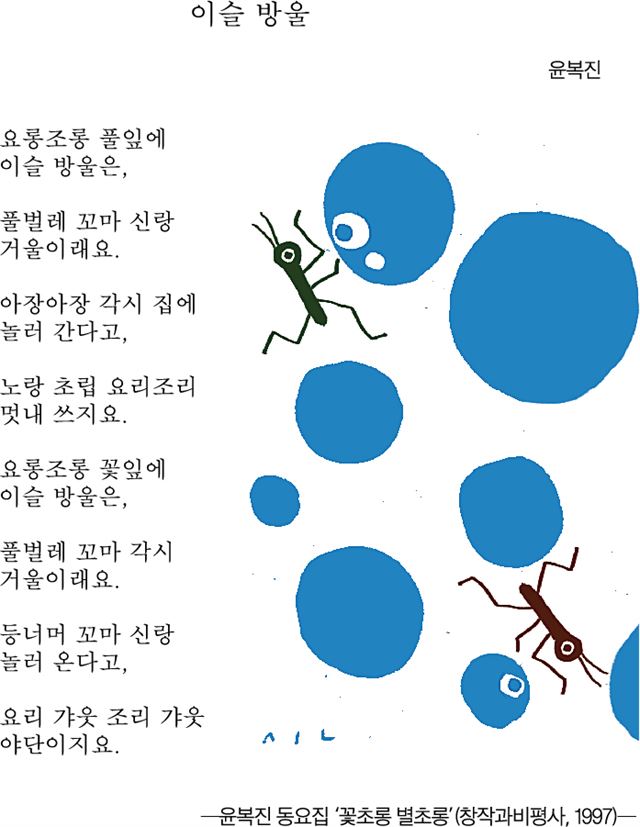
이슬이 촉촉이 내린 아침이다. 이른 아침부터 ‘풀벌레 꼬마 신랑’은 ‘아장아장’ 고 어린 걸음으로 꼬마 각시 집에 놀러 갈 생각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노랑 초립’을 한껏 멋을 내 쓰고서 풀잎에 ‘요롱조롱’ 맺힌 이슬 방울에 제 모습을 비추어 본다. ‘풀벌레 꼬마 각시’에게 멋진 신랑으로 보이고 싶어서 풀 삿갓을 요리 써 보고 조리 써 보며 마음이 한껏 설렌다.
꼬마 각시도 설레기는 마찬가지다. 둔덕 너머 사는 풀벌레 꼬마 신랑이 곧 놀러 올 텐데 얼마나 예쁘게 보일지 몰라서 “요리 갸웃 조리 갸웃” 거울을 본다. 꽃잎에 ‘요롱조롱’ 맺힌 맑은 이슬 방울이 풀벌레 꼬마 각시의 거울이다. 예쁜 것도 같고 미운 것도 같아서 이리 보고 저리 살피고, 세수도 다시 하고 머리도 매만진다.
윤복진(尹福鎭, 1907~1991)의 ‘이슬 방울’은 동요다. 읽어 보면 단박에 가락이 나오고 가락에는 흥이 실린다. 풀잎이나 꽃잎에 맺힌 이슬을 보면 하늘도 비치고 주위 풀들도 어릿어릿 비치고 풀벌레와 곤충도 비친다. 이슬을 바라보는 내 얼굴도 비친다. 그런 경험에서 상상한 것인지 윤복진은 작은 풀벌레들이 이슬 방울을 거울로 삼아 신랑과 각시로 만날 설렘에 들떠 있는 모습을 귀엽고 흥겹게 노래했다. 아이들이 풀각시로 신랑과 신부를 만들어 소꿉놀이를 하는 장면도 연상된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울려 놀 때는 항상 노래가 있어서 흥을 돋구었다. 식민지 시대에 우리 아동문학인들은 아이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노래, 흥이 담긴 노래, 우리말을 지키고 정서를 가꾸어 주는 노래를 만들기에 힘썼다. 방정환, 윤극영, 윤복진, 이원수, 윤석중 등이 지은 동요에는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전국적으로 불린 작품들도 많다. 윤복진이 남긴 동요들을 다시 따라 읽어 가노라면 그동안 잊었던 우리말, 우리 자연, 우리 아이들의 놀이, 흥, 생활 모습이 되살아난다. 정치의 계절을 겪으면서 편 가르는 혼탁한 말과 거친 말들의 홍수에 심신이 지쳤는데, 이런 때에 읽는 동시와 동요는 머리를 개운하게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새 대통령의 책상에도 맑은 언어의 동시 동요집이 놓였으면 좋겠다.
김이구 문학평론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