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장동선 지음ㆍ염정용 옮김
아르테 발행ㆍ352쪽ㆍ1만6,000원
주체와 타자 문제는 오랜 철학의 화두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체를 중심에 놓는 서양 철학의 화두라 하겠다. 프랑스 철학자들이 특유의 현학적 말장난을 섞어가며 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체의 죽음’을 선포한 게 이미 수십 년 전이다. 주체의 죽음 뒤엔? ‘타자의 도래’ ‘환대의 윤리’를 전망했다. 전망보다는 희망이 정확하겠다. 주체는 사이렌과 비슷해서 그 마법에 홀리는 건 순식간이어서다. 오죽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같은 노래 가사가 다 나오겠는가.
역시 배배 꼬아둔 프랑스 철학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쪽 동네에서도 별로 없긴 매한가지인가 보다. 미국에선 반이민 행정명령을 휘둘러대는 트럼프가 등장했고, 유럽에선 브렉시트에 극우화 물결까지 몰아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타자와 환대라는 주제를 뇌과학자가 꺼내든다면? 장동선의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는 뇌과학자가 타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먼저, 이 책은 대중들을 앞에 앉혀놓고 얘기를 건네는 강연형식으로 쓰여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바이오사이버네틱스연구소에서 사회인지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뇌과학 연구 못지 않게 과학 대중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연구 중인 과학적 주제를 대중에서 누가 쉽게 잘 설명하나 다투는, 독일 과학교육부 주관 과학 강연대회 ‘사이언스 슬램’ 우승 경력도 있다. 이 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쓰여진 책이다.
뇌과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거창하게 ‘주체와 타자’ 운운한다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타자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교양입문서로는 좋은데, 거기서 한걸음 더 박차고 나가는 데는 미진한 감이 있다. 장점이 단점이요, 단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제목에서 벌써 뇌의 타자성은 충분히 암시되어 있다.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는 제목은 결국 ‘뇌 속에 타자가 있다’란 의미다. 저자는 이를 ‘사회적 뇌’라 부른다.
어떻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머리가 좋아서다. 머리가 커서가 아니다. 전체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인간의 머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 그리 큰 편이 아니다. 다만 뇌 가운데 생각하는 능력에 관계된 뇌 부위의 비중을 따지는 대뇌화 지수로 보면 인간은 모든 동물 가운데 1위다. 보통 기준점으로 잡는 고양이를 1로 봤을 때 인간은 7.44, 돌고래는 5.31, 침팬지는 2.49, 코끼리는 1.87 등으로 대뇌화 지수가 나타난다.
인간의 대뇌화 지수는 왜 높아졌을까. 아니, 왜 인간은 ‘생각’이란 걸 하게 됐을까. 이빨, 턱, 발톱 등 딱히 내세울 게 없으니 끊임없는 협동만이 살 길이어서다. 협동의 기반은 남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지사지’였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마음의 이론’(theory of mind)이다. 우리 인간은, 아니 인간의 뇌는 “쉴 새 없이 남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고, 사소한 몸짓조차 분석”한다. 인간은 누구나 5~6세를 전후해 이 시기를 통과한다.
저자는 역지사지보다 조금 더 단계를 높여 ‘뇌의 공명’을 거론한다. 나의 뇌는 다른 사람의 뇌와 주파수를 맞추려 하고, 실제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얘기다. “강연할 때 연사의 사고모델은 열심히 귀 기울이는 청중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뇌파가 일치될 정도”다. 이 능력은 강연장처럼 서로 말하고 듣기가 준비된 동료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여러 실험을 통해 저자는 언어, 민족, 인종 등 다양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뇌와 뇌가 서로 공명하는 어떤 코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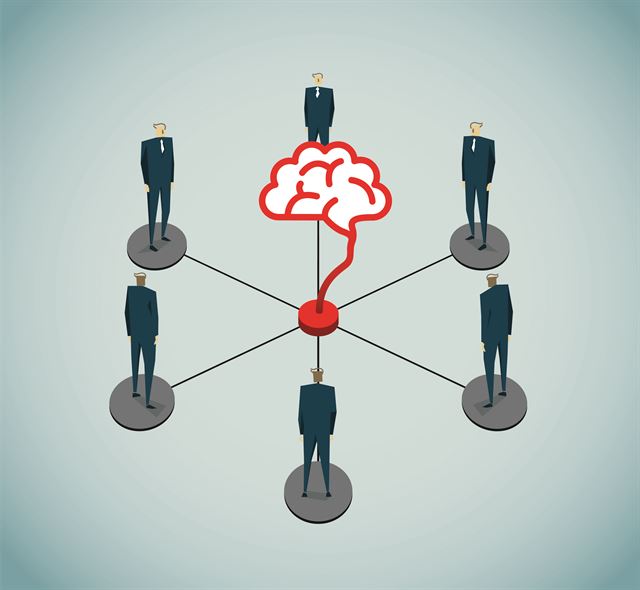
뇌의 가소성 문제도 여기에서 나온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뇌의 가소성은 대개 ‘영어조기교육은 10세 이전 아이들에게 시켜야 효과가 있다’는 ‘사교육 버전’이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가소성은 훨씬 범위가 넓다. 역지사지와 공명에서 보듯, 뇌에게 중요한 것은 주변 인물, 상황과의 교류다. 이 뿐 아니다. 본인 스스로 가진 믿음이나 의지는 물론, 근육과 몸의 움직임과도 끊임없이 교류한다. 이와 관련해 뇌과학에서 늘 거론되는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요즘 부쩍 관심 많아진 ‘보톡스’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는 책에서 직접 확인하길.
저자의 결론은 이것이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타인에 대한 환대야 말로 나를 가장 넓게, 크게 키워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사회적 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반투어로 이를 ‘우분투’(ubuntu)라 한단다. 이 기나긴 이야기를 저자는 아주 나긋나긋한 한 단어로 압축한다. “사랑.” 사랑이라 써놓고 보니 주체니 타자의 환대니 하는 말보다는 훨씬 낫다. 이래서 철학은 안 되는가 보다.
최근 뇌과학에 대한 관심은 크다. 제1요인은 아마도 알파고와 인공지능(AI) 때문일 게다. 이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자리 다 뺏기게 생겼으니 지금부터라도 빨리 창의력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교육 버전’으로만 뻗어나갈 필요는 없다. 앞서 말한 뇌의 가소성을 떠올려보자. ‘사회적 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얘기할 수록, 우린 더더욱 서로를 사랑할 준비를 갖출 수 있을 게다. 물론, 사랑이 밥은 못 먹여줄 수도 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