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 80년대 대구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 서문시장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명절 무렵 새 옷이 필요할 때면, 대구 시민 열의 아홉은 서문시장으로 갔다.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서문시장 상가 복도에 빼곡하게 들어찬 사람과 옷을 헤집으며 새 옷을 고르던 기억은 우리 세대 대구 출신 대부분의 추억이다. 처음으로 패딩 점퍼를 사고, 제 키보다 큰 옷과 새 운동화를 산 곳도, 명절 준비를 끝낸 후 따뜻한 어묵과 국수, 군것질거리를 즐기던 곳도 서문시장이었다.
‘서문시장’이란 말을 들으면 화재를 떠올리는 것 역시 대구 출신 우리 세대가 갖는 공통점이다. 1975년 11월 대화재는 어린 시절 어른들이나 또래 아이들이 자주 얘기하던 화제였다. 어린 나 역시 상가에 가득 쌓인 옷들을 떠올리며, 그곳에 불이 붙으면 정말 큰일이 날 수밖에 없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겨울철이 돌아오면, 지역 뉴스에서는 항상 서문시장의 화재 예방과 진압 준비 상황이 보도되곤 했다.
시장 안에 소방 파출소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서문시장에선 큰불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75년의 대화재 이후에도 2005년 12월에는 서문시장 2지구에서, 그리고 지난 11월 30일에는 4지구에서 큰 불이 났다. 우리 세대에게 서문시장에 큰불이 났다는 소식은 단지 그곳에 있는 옷과 옷감이 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린 시절 만난 서문시장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겨울 추위 속에서 겪게 될 곤경과 슬픔에 공감한다.
서문시장은 대구의 좋았던 시절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다. 70, 80년대 대구는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고 인근 구미시는 우리나라의 전자 산업이 시작된 곳이었다. 지금은 1개 기업의 수출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억달러 수출을 국가적으로 축하하던 그 시절, 대구는 한국의 대표적 공업 도시였다. 의류가 주로 유통되던 서문시장에는 섬유 산업의 활기가 그대로 옮겨져 왔다. 즉 어린 시절 경험한 서문시장의 활기는 여느 재래시장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도, 지역 경제가 성장하던 상황과 연결된 것이다. 하지만 섬유 산업이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다른 지역에 들어서면서 대구 경제는 침체하였다.
이 점 때문에 서문시장은 대구 사람들로 하여금 좋았던 70, 80년대를 회상하도록 하는 정치적 장치로 이용되곤 한다. TK 지역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서문시장을 방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과 대선 후보 시절, 서문시장 상인들 속에 박 대통령이 있는 사진은 단지 한 정치인의 지역 방문 사실을 알리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대구의 황금 시절과 그때의 대통령을 떠올리도록 했다. 이 점에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서문시장의 정치적 수혜자이자 채무자이다.
따라서 11월 30일 서문시장에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으며 많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린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이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섣불리 서문시장에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을 듯하다. 대구 시민들이 자신에게 준 신뢰와 연민이 참담해진 상황에서 방문을 주저할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찾아뵙는 것이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했다”라는 말과 함께 대통령은 서문시장을 찾았다. 비록 ‘인간적 도리’란 말을 썼지만, 과거 박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했던 시점의 정치적 상황들을 되새겨보면, 이번 방문이 도리 또는 의리에만 기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을 떠나는 대통령의 모습 뒤로 나타난 시민들의 침묵은 그로 인한 것이라 짐작된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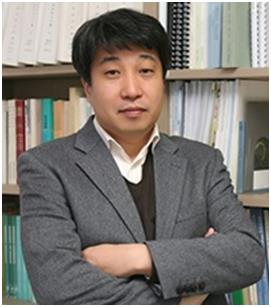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