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령이 전 세계에 떠돌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유령이. 일본, 독일부터 베트남, 태국, 이란에 이르기까지 세계는 저출산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경우 2060년 세계 최고의 노년층 부양비를 기록할 예정이다. 이에 전병욱 목사는 청년들에게 핍박과 학대, 가난을 겪게 하면 애가 막 쏟아져 나올 거라며, ‘싱글세’보다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저출산 담론은 경쟁력 저하, 미래세대 부담, 재정악화를 거쳐 국가소멸로 끝난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 역시 인구성장을 국부의 금과옥조로 여겼다. 그는 가정마다 자녀 넷을 두게끔 강제했을 뿐 아니라 피임 도구를 금지하고 불임여성과 남성에게도 금욕세를 부과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여성들의 피임과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월경 경찰’을 운용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했을까. 루마니아는 중앙 유럽에서 가장 낮은 1인당 국내총생산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 마구 늘어난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은 성매매, 막노동, 마피아에 연루되거나 심각한 청년실업에 처해 있다. 니제르와 같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는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7명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폭발은 걱정거리다. 인구성장이 경제성장이 되려면 수요를 떠받치는 인구가 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력 부족이 아니라 청년실업이며, 미래의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 자체가 사라진다고들 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2050년경에는 성인인구의 5%만으로도 산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런데 굳이 현재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해야 할까. 오히려 사이언스 지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완만한 인구감소가 삶의 질을 향상한다고 발표했다. 인구감소를 통해 청년실업 완화, 부동산 수요감소, 환경과 자원보호 등을 꾀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호응하듯 중국은 ‘한 자녀’ 정책 때 급격한 경제성장을 했고 일본과 독일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경제가 회복하거나 성장했다. 특히 일본은 저출산 여파에 올해 최저 실업률과 대졸 취업자의 완전고용을 이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향상, 재택근무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의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중이다. 유럽 인구의 30% 이상을 앗아간 흑사병 때문에 임금이 두 배 오르고 르네상스가 태동했듯이 말이다.
사실 나는 도대체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언제냐고 묻고 싶다. 세계인구가 10억이 되는 데 1,800년이 걸린 반면 30억에서 70억이 되는 데는 기껏 50년이 걸렸다. 산업혁명 이후 인구는 사채 고리 이자처럼 미친 듯 불어난 상태다. 다행히도 인류는 70억을 부양할 능력을 갖췄지만 기후변화, 종 다양성 감소, 물 부족, 토양 유실 등으로 앞으로의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 세대에 비해 5.7배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소비적 생활을 누린다. 앨런 와이즈먼의 책 ‘인구 쇼크’는 끊임없는 성장은 암세포의 교리라며, 지속 가능하고 적절한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인구는 20억명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환경주의자지만 자발적 인류 멸종운동 따위는 싫다. ‘헬조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들을 위해 세금이나마 더 내고 싶다. 하지만 암만 애써도 재생산권을 쟁취한 여성들이 더 이상 주렁주렁 애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생명이지 경제성장이나 노인부양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이제는 쓰나미처럼 닥칠 고령화 인구를 수용하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인은 무조건 부양하자는 고정관념을 넘어 건강하게 늙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건강한 노인이 적정 시간 일하며 서로를 돌보는 사회. 이미 일본과 독일은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고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이도, 노인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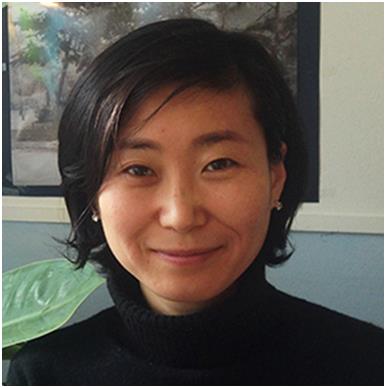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