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만 뜨면/ 애기 업고 밭에 가고/ 소풀 베고 나무하러 가고/ 새끼 꼬고 밤에는 호롱불 쓰고/ 밥 먹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 아침하고/ 사랑받을 시간이 없더라” 늙그막에야 한글을 깨친 경북 칠곡군 ‘할매 시인’들의 시집 ‘시가 뭐고?’(삶창)가 화제를 모은 뒤,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허옥순 할머니의 시 ‘사랑’입니다.
대한민국 격동의 20세기사를, ‘못 배운 시골 여성’이라는 가장 취약한 지위에서 받아넘겼어야 했던 그 세대의 할머니들에게 ‘사랑’이란 그런 거였을 겁니다. 뭔지는 대충 알겠고, 간질간질하니 궁금하기도 한데, 구경해보진 못했던 그 무엇.
그래서 할매 시인들 작품을 읽다 보면 찡하면서도 피식 웃게 됩니다. 저 할매 시인들은 사정이 나은 편인 지도 모릅니다. 끝끝내 제 속에 있는 말 한마디 남겨보지 못하고 사라져간 분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이런 목소리들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 아마 2007년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푸른역사)를 통해 ‘임상역사학’이라는 말이 알려진 이후인 듯 합니다. 푸코가 동성애자였기에 사회가 가르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예리하고 집요하게 파고 들 수 있었듯, 기억하고 기록하는 역사의 출발점은 자신의 상처에 대한 자각과 관심,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임상역사학이란, 그렇기에 푸코의 연구는 무엇보다 푸코 자신에 대해 가장 큰 위안이었을 것이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글을 깨친 할머니들이 때론 낄낄대며, 때론 훌쩍이며 ‘시’라는 걸 써보려 낑낑댈 때, 그 과정에서 가장 위로 받은 이들은 할머니 자신이겠지요. 상처가 글을 낳고, 글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겁니다.
‘호모 히스토리쿠스’(개마고원)는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이 얘기를 전면적으로 밀어부친 책입니다. 얼핏 조선사 전공자로 ‘조선문명의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저자가 왜 이런 얘길 꺼낼까 싶은데, 그 이유 또한 역사를 치유의 힘으로 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책은 최근 역사 쪽 논란을 언급합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 ‘광해군의 균형 외교’에 대한 비판, 뉴라이트의 자유민주주의 우기기에 대한 비판,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비판 등이 쭉 이어집니다.
이 비판들의 소실점은 ‘현대 민족국가 기준으로 100년 단위로 쓰는 역사는 반드시 국가의 개입, 정치의 농단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역사는 ‘증오’를 낳습니다. ‘노론 다 때려 잡아라’ ‘미국에 붙어먹으려는 놈이 매국노다’ ‘이게 다 좌파 탓이다’는 식의 이분법입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역사’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너가, 우리가 직접 써야 합니다. 같이 쓰고, 돌려 읽고,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대한 역사, 국사에 가려져 있던 비역사의 영역이 다시 역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 되어야 우리는 “탁자에 둘러 앉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호모 히스토리쿠스’란 제목은, 그게 ‘인간됨’아니냐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역사전쟁의 시대에 생각해볼 만한 화두입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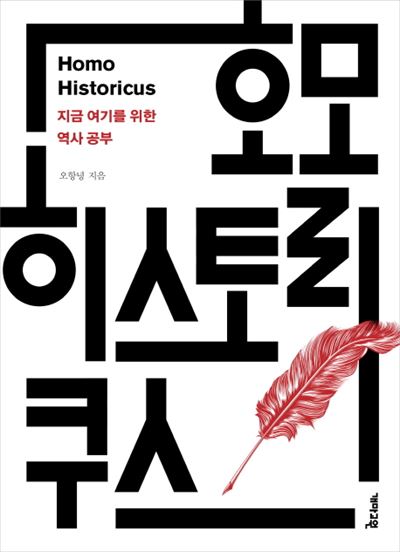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